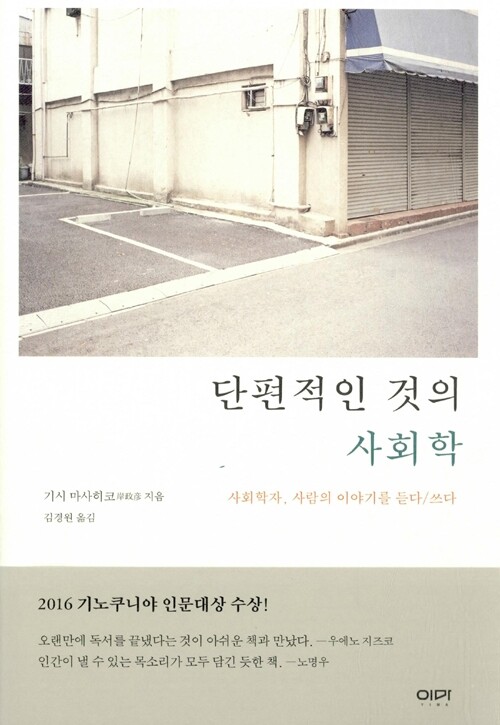
1967년생 기시 마사히코, 재즈 애호가이지만 춤추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산책을 좋아해 종종 홀로 잠수해서 심해까지 어슬렁거리는 사람. 유난히 뻐근하다 싶은 날에는 마사지숍을 찾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한 사람. 자칭 중증 인터넷 중독자. 그는 사회학자다. 공무원, 대기업 사원, 뮤지션, 노숙자, 섭식장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의 일이다. 사람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셈이다.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들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일,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만남은 일회적이고 이야기는 단편적이어서, 어떤 채록은 사회학적 분석조차 하기 어렵다. 역사적 체험과 무관한 개인사일수록 더욱 그렇다. 논문이나 보고서에 실을 수 없었던 (사회학적으로) 무의미한 이야기, 그것들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없지만 묘하게도 기억에 남는 단편소설’처럼 남아 그를 사로잡았다.
어떤 이야기든 외롭게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은 그대로 두면 이내 잊혀 사라질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다. “누구나 눈에 띄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시 마사히코는 너무 평범해서 무의미한 자료로 취급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에게 이야기는 곧 사람이라서 어떤 이야기든 외롭게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공존할 수 있다면 모든 이야기는 유의미해진다. 그는 아마 이야기들의 관계맺음을 통해 세상의 바탕을 그려내고 싶었던 듯하다.
도무지 ‘분석할 수 없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 그는 구술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름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이야기 형태로 남는다면? 어쩐지 그것은 나지막한 목소리가 되어 어느 방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을 것만 같다.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걸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 남기고 싶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저 짤막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이런 생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시 마사히코의 첫 번째 질문은 평범하기 그지없다. 길 위에서 기타를 치며 엔카(일본 가요)를 부르는 80대 노인의 대답은 이랬다. “열 살부터 취미로 하는 거야.” “길 위에서 엔카를 연주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노인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내가 환갑 나이가 되었을 때 택시를 그만두었거든. 그만두고 시작했지, 뭐.” 기시가 다시 물었다. “기타는 계속 쳤어요? 택시 시절에도?” “응, 그럼. 차에 싣고 다녔잖아. 트렁크에.”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질문은 짧고 대답은 길다. 기시는 그저 듣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 넘어 오사카로 이주한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돈 좀 모아서 도쿄나 오사카로 나오자고 마음먹던 참이었는데, 남편 될 사람하고 만나서 오사카에 나왔어요. 어디론가 나가보자는 꿈은 이루었고 하니, 여기에 남아 뭔가 이루어보자고 생각했지요. 시골 사람은 부모가 반대해서 집을 못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별다른 짓을 해보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지나치게 개성적으로 굴려고 하면, 뭔가 하기 힘든 장소니까요.” 고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과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 지금은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 생각은 없다. 그녀는 둘의 관계를 부부 비슷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두의 친구, 기시 마사히코
말하다 말고 그녀는 자주 웃었다. 기시 마사히코도 비슷한 버릇을 가졌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 웃음은 답답한 현실의 창이다. 책이나 영화처럼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출구 같아서 기시는 자주 책을 읽고 자주 웃는다. 좀더 개성적으로 살고 싶었던 그녀 또한 웃음 외에 다른 창문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어떤 창문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개성도 달라진다. 문득 궁금하다. 개성적인 인간의 반대는 무엇일까? 평범한 사람?
기시 마사히코가 스낵바(일본의 스낵바는 ‘스나쿠’라고 읽는 술집이다)에서 겪은 일이다. 여장남자가 여학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농담을 던졌다. “너희들은 좋겠다. 그냥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여자잖아.” 애초부터 그것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일이 없는 사람, 이를테면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일본인이 일본인이기 위해 다른 경험은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여성이 여성이기 위해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평범하면서도 더없이 개성적인 시간이 뒤섞인 삶을 저마다 이어가고 있다. 단편적 기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말해주진 않는다. 한 사람의 전생(全生)이 사회의 운명을 가감 없이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듣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다.
언젠가 그는 문득 올려다본 호텔 창을 통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사람을 본 적 있다. 그 순간 자신도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탄 기분을 느꼈다. 낯모르는 누군가를 그저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함께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 모두의 친구가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역시 ‘기시 마사히코’라는 이름을 기억해둬야 하지 않을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속보]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속보]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8/53_17722616530845_20260228500384.jpg)
[속보]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국힘 “장동혁 대표, 오피스텔 한 채 매물로 내놔…거래는 아직”

총 쏘는 김주애 사진 공개…김정은 소총 선물 받은 김여정

트럼프 “이란 관련 큰 결정 내려야”…“가끔은 군 활용해야” 언급도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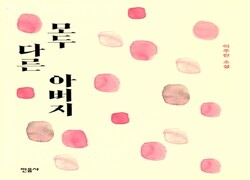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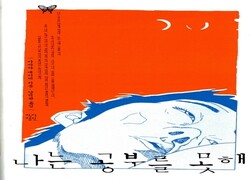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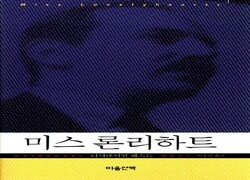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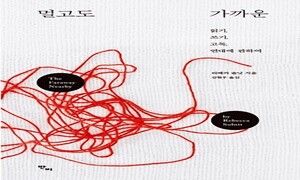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