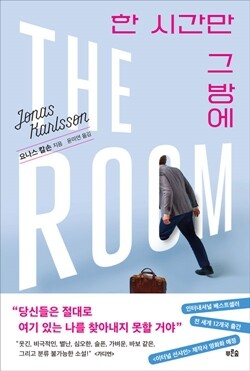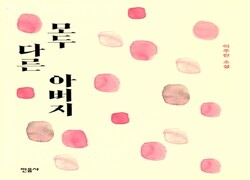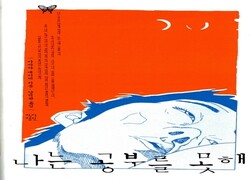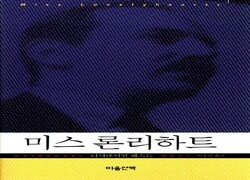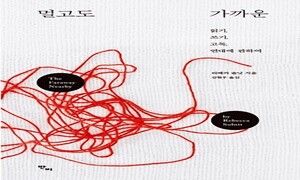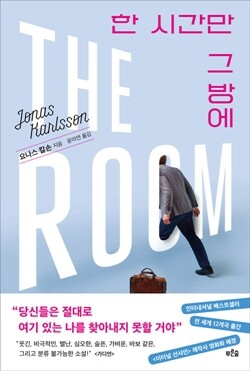
의 주인공 비에른은 사무원이다. 최근 그는 직장을 옮겼다. 그가 원한 바는 아니었다. 상사가 일종의 해결책으로 권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결과만 두고 보자면, 상사는 비에른이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이직은 좌천일 확률이 크다. 새 직장은 곧 폐쇄 조처가 내려질 거라는 소문에 휩싸인 관공서였다. 업무는 단순했고 근무환경은 열악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된 방대한 서류를 요약·정리하고, 층마다 돌아다니며 복사기에 종이를 채우는 일이 그의 주된 업무였다. 월급도 오르지 않았고 휴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개인 책상도 없어 항상 코르덴 재킷을 입고 출근하는 호칸이라는 남자와 책상을 나눠 써야 했다. 이쯤 되면 자기 처지가 걱정될 만도 한데, 비에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책상에 칸막이가 필요한 사람은 숨길 게 많다는 뜻이고, 직장에서 숨어서 할 일이란 업무와 무관한 행동일 터였다. 그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유형이라서, 누구보다 떳떳했다. 비에른은 그런 자신을 상사보다 훨씬 흡족하게 여겼다.
비에른은 평범한 사무원이었다. 동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사에게 아첨한 적 없고, 두 번 생각하기 싫어서 남이 하는 말에 무조건 “예스, 예스” 대꾸한 적도 없다. 남들 앞에 쉽사리 나서지도 않지만, 가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직급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직급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 야심만만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유망주이자 상사보다 빨리 고위 관리직에 안착할 기대주. 비에른은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죽 믿어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무실 내 동료들이 툭하면 쉬고, 딴전을 피우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느라 업무 처리가 더뎠다. 부서가 폐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그 전에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일에서 손을 놓게 했는지도 몰랐다.
비에른은 성실한 사무원이었다. 근무시간 내에 절대로 사적인 통화를 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잡담도 나누지 않았으며, 괜히 화장실을 들락거리지도 않았다. 동료들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대놓고 꺼렸으며, 상사들과 사교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일에도 꾸준히 시큰둥했다. 그런 그를 두고 주도면밀한 야심가로 정의할 순 없다. 오히려 ‘노력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문장을 당연하다고 믿는 축에 훨씬 가깝다. 그런 사람만이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믿었을 테고, 그런 사람만을 존경하며 살았을 것이다.
비에른은 성실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고, 매사 성실하게 살다간 손해 보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따윈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비에른은 홀대를 우대라 여기고, 무시를 질투라고 오인했다. 비에른 자신이 모자란 사람,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삶이 어딘가 잘못돼갈 때, 누구보다 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 내에서 혼자이기를 자처하는 비에른에겐 자기만의 방이 있다. 공용화장실 옆에 있는 그 방을 출입하는 사람은 오직 비에른뿐이다. 방은 작지만 먼지 한 톨 없다. 한복판에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펜, 다른 사무용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어 일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된 그 방에 서 있으면 어쩐지 자신마저 근사해 보일 정도였다. 동료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을 때, 실수해서 자책감이 들 때, 시급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집중력이 필요할 때, 비에른은 그 방을 찾았다. 그곳에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게 가능했다. 평생 해고될 걱정 없이, 부서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해도 자기만은 살아남을 듯한 자신감이 들었다. 즉,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서 있을 땐 뭘 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비에른이 그 방의 문을 가리키면 동료들은 그건 벽이라고 했다. 비에른이 그건 벽이 아니라 방이라고 우길수록, 동료들은 불편해했다. 벽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비에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못 견뎌했다. 결국 상사의 명령으로 찾아간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그게 존재합니까?” “저에게는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나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비에른은 이상한 사무원이 되었다. 최선을 다하면 만사가 순조로워야 하는 법인데, 모두가 그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지만 굳이 내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
아마 그 방은 비에른의 쉼 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헛것일 확률이 크다. 하지만 비에른은 거기 그런 방은 없다고, 그건 벽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대신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혹은 벽 앞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오늘부터 존재하지 않겠다는 투로 보란 듯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 계속 거기 존재할 생각임이 분명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전에 그는 평범하고 성실하고 이상하고, 뛰어난 사무원이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