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호의 를 읽은 ‘누군가’는 책 속 주인공들을 가리켜 죄다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살인, 강도,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데가 있다. 피해자 편이 아닌 피의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험에 드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 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의 이 교수의 경우고, 후자는 의 박 전도사다. 두 사람이 정말 나쁜 놈들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되물었다. 만약 이들이 너의 아버지고, 너의 친구라면, 어떤 조언을 할 거냐고. 아니 그냥 너 자신이라면, 어떡했을까? 대부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주인공의 선택과 행동이 윤리적 책무를 위배했음을 이미 알아버린 탓도 있고, 그들의 선택이 정말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도사는 어릴 때 전기 합선으로 일어난 화재로 시력을 잃었다. 11살 때 벌어진 일이다. 그날 그는 고아가 되었다. 시력을 잃기 전까지 그가 보고 익혔던 풍경들은 흐리마리 잊혔다. 개나리꽃이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하려 애쓰다보면 노란색마저 잊어버리는 식으로 모든 게 잊혔다.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 아내와 아들 예찬이의 얼굴을 모르고, 부모님의 얼굴을 모르고,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그는 이 모든 절망과 서러움과 어둠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존재’로 살았다. 그에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성경의 어둠은 은유였고, 눈뜸 역시 은유였다. 그건 다른 눈으로 보는 세계였다.
봄날이었다. 박 전도사는 신도인 최 간호사의 도움으로 각막이식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최 간호사가 그의 차례를 훨씬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최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어두운 원목실에서 숨어 있다시피 기다렸다.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죽기를, 보호자 동의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가 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술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말인즉 더 이상 매사에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기증자가 아직 살아 계시다는데, 당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좀 그래 보였어요.” 일을 마치고 늦게 찾아온 아내는 그를 서운케 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다.
의 이 교수는 지방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직 중이다. 가족과 함께 집 앞 뷔페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2학년 박수희가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이 교수는 ‘걔’가 누군지 몰랐고, 자살인가보다 했고, 장례식장 육개장을 먹기 싫어서 하던 식사를 마저 했다.
자살인 줄 알았던 박수희의 사인은 과실치사였다. 게다가 제자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 P도 섞여 있었다. 1심 재판에서 P는 금고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교수는 P가 안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건 내용은 이러했다.
평소 2학년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자, P를 포함한 3명은 위계질서를 바로잡으려 학교 앞 술집으로 2학년을 불러모았다. 그 와중에 P는 후배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음주를 강요했다. 결국 만취한 박수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교수는 박수희의 죽음을 사건이 아닌 ‘사고’라고 믿었다. 그가 아는 P는 남을 해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고,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의 꿈을 좇을 줄 알며, 처진 눈꼬리가 자신과 꼭 닮은 제자였다. 결국 그는 한 사람을 편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P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여겼지, P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당신은 말이야,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해. 알아? 그게 당신 문제라고.”
아내의 말마따나 이 교수는 자기를 좋아하는 P만 알았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P에 대해서는 몰랐다. P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는 끝내 못 보았다. 박 전도사가 최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수술실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교수 역시 P가 자신을 속이도록 내버려두었다. P가 그를 속인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속인 거였다.
아무도 죄를 짓진 않았다. 이 교수와 박 전도사는 사실상 무고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리 너그럽지 않다. 주인공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를 비겁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했으며 무언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렇게라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선 시력을 되찾을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든다.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혹 그와 내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 지독한 딜레마가 그저 그들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은 아닐까, 자꾸 나에게 묻게 된다. 나라고 아주 다른 사람일까 싶어서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야 만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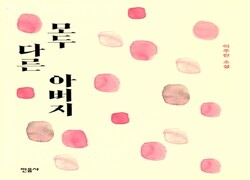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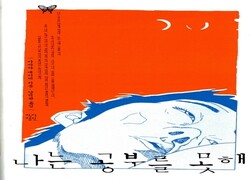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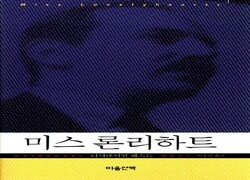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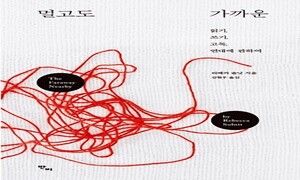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