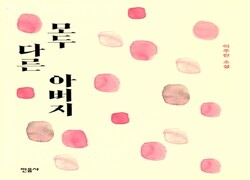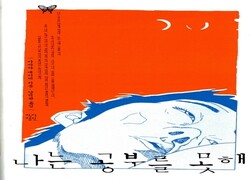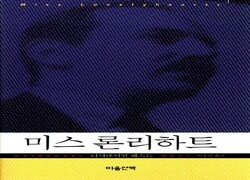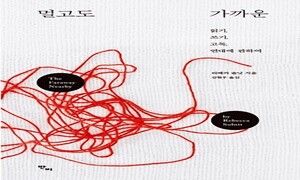김엄지의 첫 번째 소설집 에는 주인공이 김영철인 소설이 두 편 있다. ‘삼뻑의 즐거움’과 ‘영철이’이다. ‘삼뻑의 즐거움’의 영철은 16살 아들 팔광과 둘이 살고, ‘영철이’의 영철은 결혼한 지 7년 된 아내와 갈색 개 한 마리, 이렇게 셋이 산다. 심지어 갈색 개의 이름도 영철이다. 아내가 붙여준 이름인데 편의상 개영철이라 한다. 물론 영철은 단 한 번도 갈색 개를 영철로 부른 적이 없다.
무데뽀거나 무능하거나
‘삼뻑의 즐거움’의 영철은 동네에서 유명한 개자식이다. 그를 개자식이라 하는 이유는 많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들켜도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성방가와 노상방뇨의 일인자인데다 동네 길고양이를 삶아 먹기까지 한다. 툭하면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화를 낸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신앙은 화투다. 한때 ‘꾼’으로 날렸으나 5년 전 길에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잃은 뒤로는 ‘호구’가 되었다. 도박판에선 언제나 호구가 더 환영받는 법, 영철은 화투판에 종일 붙어산다. 번번이 돈을 모두 잃지만 영철에겐 ‘크게 잃을수록 크게 번다’는 믿음이 있다. 절대로 그만둘 마음이 없다. 급기야 아들이 육상대회에서 받아온 금상 트로피를 판돈 삼아 또 화투판을 찾아간다. 아마 그는 자신에게 아직 잃을 것이 남았고, 그것을 잃지 않고선 한탕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리라 확신하는지도 모르겠다. 집에는 쌀이 없고, 주머니엔 동전 하나 없으며 이제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아들 팔광뿐인데도 말이다.
‘영철이’의 영철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그는 화를 낼 줄 모른다. 말수도 적다. 아내가 묻는 말에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로 일관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물어도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한다. 그래놓고선 아내가 온종일 고심해서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아주 입맛이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밥맛마저 뚝 떨어질 정도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실직하고 돌아와, 어쩌다 잘렸느냐 물어도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 다시 복직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어도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가 전부다. 그러곤 바둑만 둔다. 하루에 10시간씩, 끈질기게.
‘세상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영철이다. 남들이 보기엔 이유가 명백한 일인데도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 웅얼웅얼 넘겨버리고 마는 영철이다. 말하자면 영철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를테면 두 사람의 삶을 앞서 견인하기에는 좀 믿음직하지 않고 하는 짓마다 못 미더워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말을 해, 모르겠다는 말 말고 말다운 말을 좀 해보라고!” 머리를 쥐어뜯고 발을 동동 구르는 쪽은 늘 아내였다.
왜 말수가 적을까. 왜 화를 내지 않을까. 왜 놀 줄 모를까. 왜 눈을 마주치지 않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뭘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같고, 닦달하고 핀잔하고 화를 내도 대꾸가 없고,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기를 갖자는 말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내는 영철과 사는 게 점점 지겨워지고 외로워졌다. 그러니 이 불행은 영철의 책임이 분명해 보였다.
“당신은 그냥 무야, 무. 차라리 진짜 무면 썰어 먹기라도 하지. 너란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 어디에 써먹느냔 말이다.”
아내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영철은 그냥 무, 차라리 진짜 무라면 댕강댕강 썰어 먹기라도 할 텐데, 진짜 무도 아니라서 당최 써먹을 데가 없는 무용하고 무능한 무. ‘삼뻑의 즐거움’의 영철도 그런 무. 그냥 무.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어디 써먹지도 못할 인간.
인생은 테트리스 같은 것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영철이 아들에게 물었을 때, 팔광은 테트리스 같은 거라고 대답했다. 없애기 위해 쌓는 거 같지만 쌓기 위해서 없애는 게임, 그게 왜 인생 같냐면 죽으면 열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철은 아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없애려고 산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일 게다. 얼마 살지도 않은 게 그래도 인생을 제대로 아는구나, 영철은 감탄하면서 충고했다.
“넌 절대 죽었다는 소리 듣지 마라.”
도박판에 끼어든 인생은 ‘죽었다’ 혹은 ‘죽는다’라는 말을 수시로 듣기 마련이다. 손안의 화투패를 한 장씩 꺼내 보일 때마다 몇 번이고 거듭 죽는 게임. 영철은 다시 물었다. “너는 찬란하다는 게 뭔 줄 아냐?” 아들은 트로피를 가리켰다. “그럼 찰나는?” 영철이 또 물었을 때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찬란과 찰나, 따지자면 영철은 찬란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찰나에 잊으려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이 미래를 담보하고 보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만사가 다 내 탓은 아니니까 찬란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행복이 뭐냐고 묻건, 불행이 뭐냐고 묻건 대답은 같다. 글쎄,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 불행에 무감한 것도 행복이고 ‘너 죽었다’라는 말에 겁먹지 않는 것도 용기다. 너란 인간을 어디에 써먹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영철처럼 일단 물어나봐야 한다.
“꼭 나를 어디에 써먹어야겠어?”
꼭 나를 어디에 써먹어서 우리가 찬란해진다면, 그 찬란한 시간들도 훗날 찰나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고 물어볼 일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