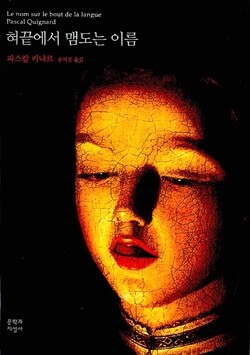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여겨왔다. 긴 세월 내려온 그 말에서 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비치는 듯해 영 마뜩지 않았던 탓이다. 더불어 그 말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 더더욱 달갑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치기 어린 시절의 오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다르게 읽는 요즘이다. 어쩐지 그 말은 사람이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거라곤 이름뿐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남겨진 이름도 언젠가는 서서히 잊힐 운명이라서 죽은 뒤 불린 날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저 문장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충고처럼 들린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지 않는다. 이름은 누군가 내게 부여해준 것이라서 살다보면 종종 궁금해질 때가 있다. 왜 아버지는 내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내 이름의 뜻을 풀어보건대, 아버지가 내게 품은 유일한 바람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었던 듯싶다. 그게 아버지가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겠지.
세 편의 소설이 실린 이 책은 파스칼 키냐르의 1993년 작품이다. 에 대한 작가의 애정은 남달랐다. 책 표지에 따르면 작가는 을 ‘나의 비밀’이라고 했다. 당신의 책을 꼭 한 권만 읽으려는 독자가 있다면 무슨 책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끝끝내 말이 되지 않았던 이름, 죽음을 물리친 이름, 너무나 흔해빠진 이름이어서 듣자마자 저절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름, 내 이름을 기억하느라 애써본 적 없듯이, 애써 기억하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름. 그런데도 끝끝내 기억나지 않는 이름,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이름의 주인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콜브륀, 그녀는 1천 년 전의 사람이다. 그녀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끝, 디브라는 마을에서 살았다. 너무 척박해서 몸 붙일 데라곤 어디에도 없는 땅, 1년 내내 풀이 무성하고, 길은 울퉁불퉁하고,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작은 마을이다. 바다가 지척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선원의 영혼을 지닌 곳. 언제나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은 곳. 도처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마을에서도 삶은 그물코처럼 촘촘히 얽혀 이어졌다.
“마음이 가라앉질 않네. 눈자위가 짓무르도록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
콜브륀은 맞은편에 사는 죈느라는 청년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콜브륀은 혼잣말을 이어나가며 짝사랑의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죈느, 곰의 옛말, 콜브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고 읊조리는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였다.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듯,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듯,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응당 그래야만 하는 존재나 진배없었다. 사랑에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오로지 죈느라는 이름뿐이었다.
죈느의 아내가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바치겠노라, 그녀의 기도를 듣고 찾아온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길 잃은 영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콜브륀이 죈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드비크 드 엘, 영주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거였다. 만약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1년 뒤 영주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위험한 내기였다. 콜브륀은 자신을 통째로 걸었으나 자신만만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 9개월이 지난 뒤, 콜브륀이 영주의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름은 생각날 듯 말 듯 그녀의 입술을 맴돌았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허사였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행복했으므로 두려움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집안일에는 아예 손을 떼어버린 채, 가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삐쩍 마른 몸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다.
다행히 죈느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알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이 번성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아마 그녀는 평생 죽음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다. 죽음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와 잠든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물을지 몰랐다. “내 이름을 기억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겠는가. 이름을 잊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끌려갈 것임을 너무 잘 아는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첫아이를 낳았을 땐 어땠을까. 여느 사람들처럼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해하며 가슴 먹먹해지는 순간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자식을 지켜줄 이름을 찾느라 전전긍긍했을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낯익다. 테이블 한 개, 초 한 자루, 실타래, 물레 하나, 콜브륀 부부의 유산 목록이다. 하나를 더하자면,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오래도록 남았다. 죽음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름을 남겼듯, 그녀 또한 자기 이름을 남겨두었다. 콜브륀, 삶의 다른 이름, 초 한 자루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전설이자 동화, 우리의 해피엔딩.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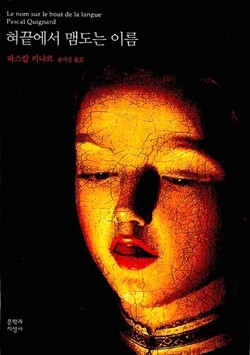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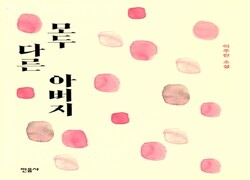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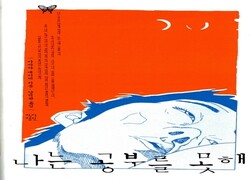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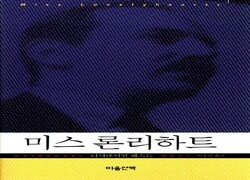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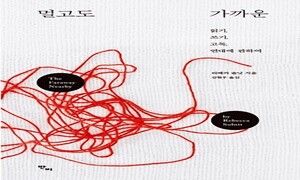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