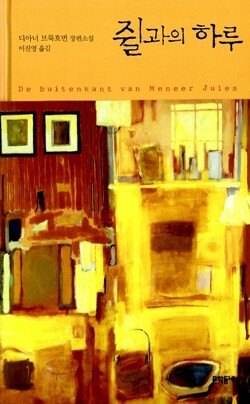
얼마 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던 8월 초였다. 한낮에 장례식장을 찾았다. 친구 가족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던지라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들의 예식에 따라 묵념을 하려다 결국 절을 올렸다. 다행히 친구는 당황하지 않는 눈치였다. 조문할 때 나는 빈소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잦은 편이다. 영정 속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경우, 특히 심했다. 친구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일을 너무 간소하게 행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내 소개는커녕 첫 인사도 없이 마지막 인사만을 건네는 건 서로의 도리를 어기는 일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친구 아버지를 뵌 적 없지만 나는 엄연히 아들의 친구로서, 그 역시 내 친구의 아버지로서 거기 사진으로 계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드님의 친구 누구입니다’라는 소개를 하고 인사를 건넨 다음 애도의 말을 전하는 게 바른 순서였다. 설령 우리 대화가 다른 사람의 귀엔 들리지 않는 침묵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말이다. 기왕이면 묵념보단 큰절이 걸맞았다.
나는 친구 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듣기로 그는 1932년생이었다. 얼추 아흔 살에 가까운 연세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근대와 산업화를 겪고, 역대 대통령의 모든 정권을 살았다. 100년에 가까운 삶이었으니 한 세기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듣기로 그의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처지였지만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고 했다. 대처는 빨랐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구급차를 타려고 요양원 밖을 나섰다. 모두가 그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요양원 정문에서 구급차로 향하던 찰나, 그의 숨이 멎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한여름의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침, 심상치 않은 고통이 찾아왔음을 느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 고통은 예감을 불러일으킨다. 아직 진짜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으나 죽음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당도했다. 아마 그가 제일 먼저 알아챘을 것이다. 그는 앉은 채로 자신을 구해주러 온 구급차를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구급차 안에서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
쏟아지는 빛 속에 앉은 채로 죽은 노인.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도리어 고요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죽음. 마치 그가 그러기를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 벨기에의 작가 디아너 브룩호번의 에서 나는 비슷한 죽음을 본 적이 있었다.
쥘이 죽은 날 눈이 내렸다. 쥘의 일과는 대개 비슷했다. 아내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커피를 내린 뒤 창문을 열어 집 안을 환기시킨 다음 식사를 하고,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문을 가져와 읽는다. 오전 10시쯤 아래층에 사는 소년과 체스를 둔다. 점심과 저녁은 아내 알리사의 몫이다. 알리사는 쥘이 환기를 위해 커튼을 걷을 때쯤 일어난다. 평소처럼 커피 향을 맡으며 알리사는 잠에서 깼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 있고, 커피머신에선 커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쥘은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이 내렸다. 알리사는 새삼 쥘에게 반했다. 5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지만 그가 눈 내리는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일상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알리사는 남편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그의 가까이 앉았다. 쥘. 알리사가 그를 불렀다.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이야기나 실컷 나누고 싶었다. 쥘! 다시 한번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쥘은 그렇게 죽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올려놓은 채, 아래층 소년과의 체스를 미룬 채.
첫인사는 짧아도 마지막 인사는 길기 마련이다. 알리사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일을 단 하루만 연기하기로 결심한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었다. 그녀에겐 쥘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다. 알리사는 지난 50년 동안 한번도 나눈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 도망치지 않은 걸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는지.
“쥘, 당신은 나라는 반쪽보다 더 나은 반쪽이었어요.”
쥘은 미소를 지은 채 죽었다. 그건 쥘이 알리사에게 남긴 유일한 유언이다. 알리사는 그가 할 일을 대신하고 그와 함께할 일을 묵묵히 혼자 해내며 하루를 보낸다. 점심을 먹고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을 위해” 건배하며 와인도 마셨다. 해가 기울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이윽고 밤이 되는 사이 쥘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져갔다. 피부가 쪼그라들고 시퍼런 멍이 드러났다. 하지만 내일이 오기 전까지 그는 진정으로 죽지 않았다. 아직 두 사람은 헤어지는 중이고 눈은 쉬이 그칠 기미가 없다.
나는 1932년에 태어나 2017년에 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막연히 상상했다. 그 또한 일종의 대화랄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술이나 먹자라는 말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다. 남은 사람들끼리의 이별은 늘 그래왔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유일한 진정이라는 듯. 그러고 보니 벌써 입추였다. 아마도 우리는 어느 가을날 웃으며 만날 것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지지율 ‘바닥’·오세훈 ‘반기’…버티던 장동혁 결국 ‘절윤’ 공식화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참상 즐기는 악당 같다”…미 전쟁부 장관 오만방자 위험 수위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이스라엘, 이란 원유저장고 공격…미국 “말도 안 돼” 강한 불만

“초가삼간 태울 건가”…대통령 ‘자제령’에도 강경파는 ‘반발’

갈등설 속 트럼프 “이란 종전,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

홍준표 “오세훈, 안 될 선거엔 안 나가…발 빼는 걸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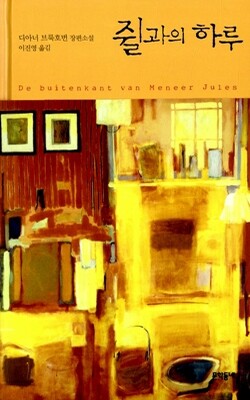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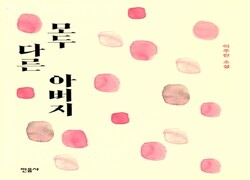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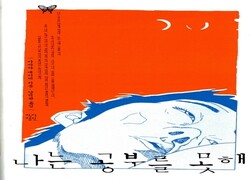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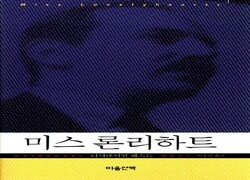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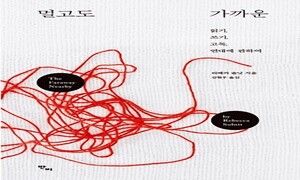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