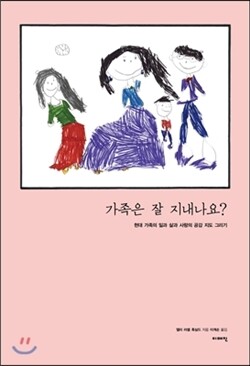
“시장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와 무작정 함께 있으려 하거나 꽃다발 같은 쓸데없는 것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 같은 증상을 보이면 사랑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는다. 사랑은 일상에 대해선 갑자기 무능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는 데는 턱없이 유능해지는 비효율적인 열정이다.
그런데 감정 표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라고 가르친다. 엄마는 아이의 생일파티를 진행하는 업체를 찾고, 연인은 꽃배달업체 단골이 되는 등 사랑은 대리물을 통해서만 표현된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과 그 선물이 전해지는 비인간적인 방법들 사이에서 약간의 모순을 감지한다. 우리는 개인적 요소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으려 애쓰지만, 그 요소를 새로운 곳에 던져놓고 만다.” 이것이 <가족은 잘 지내나요?>(앨리 러셀 혹실드 지음, 이계순 옮김, 이매진 펴냄)의 관찰이다. 생산적 삶에서 멀어진 우리의 사랑은 티파니 반지와 판도라 링 중 하나를 고를 자유만을 갖는다.
<감정노동> <시간의 구속> 등을 썼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는 심리학적 주제를 빠르게 포착해온 작가다. 독서는 프레임에 충실한 행위라서 심리학 서가에서 책을 폈을 때는 개인적 언어를 기대하고, 사회학 분야를 찾아들 때는 자신을 ‘여럿 중의 하나’로 여길 준비를 한다. 그러나 감정조차 시장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배치되면서 공적 영역에 던져진 감정을 구출하는 것은 사회학자들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 ‘마음 챙김’으로 독서를 시작했던 독자도 감정의 자본화라는 주제에 이를 것이다.
한국에선 늦게 번역됐지만 <감정노동>이 처음 쓰인 때가 1983년. 이번에 나온 책 <가족은 잘 지내나요?>는 감정노동에서 출발해 돌봄노동, 여성노동, 불공평한 분배 등 지금까지 그가 더듬어온 길을 한데 모아놓은 듯하다. 그는 서문에서 외교관의 아내로 30년 동안 예절 바른 외교의 세계에 갇혀 지낸 어머니의 삶을 알고 싶었노라고 고백한다. 그가 사회학의 가장 중심부에 감정을 두게 된 계기였을 것이다.
개인으로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언설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사회학보다는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를 찾아든 독자에게도 집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이 책의 주장이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족은 잘 지내냐고 인사하면 전세계가 화답할 것이다.” 책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지역과 계급, 인종을 넘어선 새로운 공감지도를 그리라고 권한다.
전화신청▶ 02-2013-1300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 캠페인 기간 중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한겨레21 기자들의 1:1 자소서 첨삭 외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229672236_20250113500160.jpg)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CNN “170명 희생된 이란 초등교 공습 미사일, 미국산 토마호크로 보여”

홍준표 “오세훈, 안 될 선거엔 안 나가…발 빼는 걸 보니”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갈등설 속 트럼프 “이란 종전,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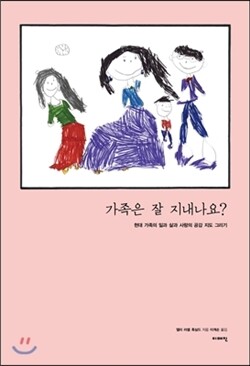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단독] 사회대개혁위 “산불 진화 체계 산림청서 소방청으로 이전해야” [단독] 사회대개혁위 “산불 진화 체계 산림청서 소방청으로 이전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391687262_202603095026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