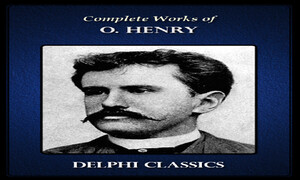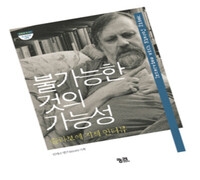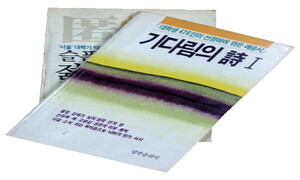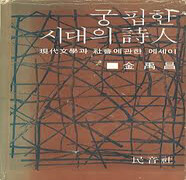백수 시절 부산 고향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전화 왔다며 툭툭 깨우셨다. “야야, 김보경 선생님 찾는다. 근데 믄 선생이냐? 니 엄마 몰래 학원 알바하나?” 그때 전화주신 분이 당시 삼인출판사 의 문부식 주간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나 20대. 하늘 같은 출판사 주간께서 나에게 극존칭이라니. 그때 전화기를 들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나를 보며 ‘서로들 저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우리 어머니 표정이라니. 나중에 뵈니 삼인출판사 분들은 인사는 다 90도에, 기본 호칭이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출판장이가 되었다. 그 뒤로 내게도 수많은 ‘선생님’이 생겼다. 그리고 배운 대로 말투는 매우 정중히, 아무리 바빠도 상황 설명은 충분히…. 그렇게 편집일을 하던 어느 날 한창 연락이 오가던 한 ‘선생님’이 이런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런데 보경씨, 저에게 감정노동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전자우편을 받은 때가 2005년이었다. 앨리 러셀 혹실드가 쓴 이라는 책이 2009년에 나왔으니, 그때만 해도 낯선 용어였다. 그 전자우편을 오래 들여다본 기억이 분명하다. 그즈음의 일이었다. 어느 자리에선가 밤새 식탁 위에 교정지를 펴놓고 일했다고 했더니, 한 분께서 “제발 그렇게 궁상맞게 부엌에서 일하지 좀 마세요”라고 호통을 치셨다. 물론 안다. 다 나를 배려하고 아껴서 한 말이라는 것을. 그러나 기분이 묘했다. 내가 뭔가 억지로 일하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원래 감정노동이란 스튜어디스, 마트 판매직 사원 등 ‘웃는 게 직업’인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개념이다. 지금 이 시대에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점점 확대돼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특히 편집자들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푸념을 못 들은 척한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감정을 싣고, 애착을 갖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 ‘기브 앤드 테이크’로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쿨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다. 단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데,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데 기회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사실 가끔 그립다. 아무리 나이 어린 저자라도 깍듯하게 대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두어 시간에 걸쳐 설명해주던 그분들이. 서울 홍익대 앞 길거리에서 그분들이 인사를 하면, 나는 아주 바닥에 절을 하던 그때 그 풍경이. 그런데 나는 요즘 왜 그런 태도를 잊고 지내는가. 인상을 쓴다고 카리스마가 생기나. 이마 주름만 생기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내란 재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6/53_17703287145844_20260205504340.jpg)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주말 ‘영하 18도’ 극한 한파…호남·제주엔 폭설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후폭풍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선고

‘조수석 날벼락’ 가해 운전자, 나흘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

빗썸, 고객 수백명에 1인당 2천억어치 비트코인 ‘오입금’

“한국 핵 농축·재처리 금지해야”…미 상원의원 4명 트럼프에 항의서한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2022240809_20260204503792.jpg)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용접 입사 첫주…현관에서 곯아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