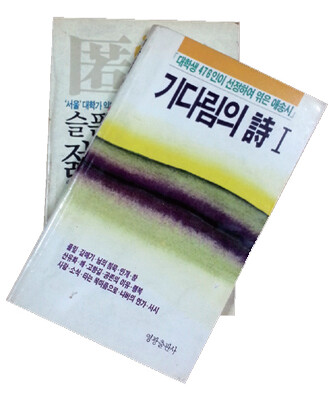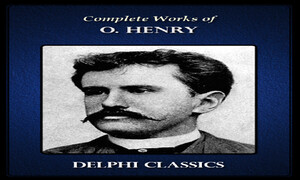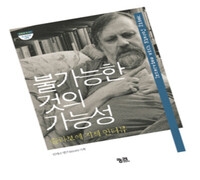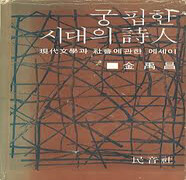1
환경미화 심사를 하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다. 우리는 남학교 못지않게 엉망인 교실을 부랴부랴 닦고 쓸고, 교실 뒷벽에는 절대 교체하지 않을 명시나 명화들을 ‘이달의 시’ 같은 제목으로 떡하니 붙여놓고 앉아 있었다. 둘러보던 한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밖으로 나가셨다. 좀 있으니 교장실에서 나를 불렀다. 나 같은 학생을 좋은 일로 불렀을 리 없다. 심각한 얼굴의 교장 선생님 옆에서 아까 그 선생님이 물었다. “그 시, 네가 붙였냐?” “네.” “그 시, 어디서 알았냐?” 뭔가 사달이 난 거다.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누군가 알려줬다. 어디 시집에서 읽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추궁은 계속될 거다. 한 방에 끝내야 한다. “저, 언어능력 문제집에서 베꼈습니다.” 순간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요즘 1994년 대학 신입생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그 94학번들이 수학능력시험 첫 세대다. 처음 도입되는 시험이니, 당시 언어능력 문제집에는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지문이 등장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철학의 개념,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글도 꽤 있었다. ‘공부하다 알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넘어간 문제의 시. ‘두 가슴을 내논’이라는 야한 구절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자연친화적 구절이 더 문제가 되었을 그 시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였다.
사실 나는 그 시를 문제집에서 보지 않았다. 어떤 책에서 알았다. 잘생긴 운동권 오빠에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대학 졸업 때까지 주변에 그런 남자는 없었다. 에서 읽었다면 문학소녀라는 폼이라도 났을 텐데, 나는 야구선수들 이름 외우기에 더 바빴다. 그런 내가 손수 산 그 책은 이었는데, 순전히 표지에 쓰인 어떤 말에 혹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학생 476인이 선정한’이라는 문구였다.
출판사에 들어오면 이런 종류의 표현을 익히게 된다. ‘○○대학 필독서’ ‘2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100대 기업 CEO들이 선정한’ ‘매혹적인 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등등. 책을 만들 때는 꼭 이런 말을 뽑아보고, 제목에 붙이고, 부제로 만들고, 큼직하게 써서 띠지로 두르라고 한다. 그러면 간혹 ‘그거 다 사기 아니에요?’라며 반항(?)하는 에디터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표현의 힘은 분명히 있다.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 ‘대학생 476인’이 있기나 했겠나. 그냥 476개의 시를 모은 것이지. 그러나 그 문구는 대학만 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나는 민족시인 신동엽을 알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책을 만들수록 느낀다. 그런 문구로 혹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책은 결국 독자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회의에 ‘오늘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을 인생의 지혜’ 같은 말을 했더니, ‘이제는 공자까지 팔아먹느냐’ ‘아무리 그래도 내일 죽고 싶지는 않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그래, 그건 좀 너무했다 싶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