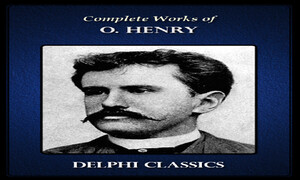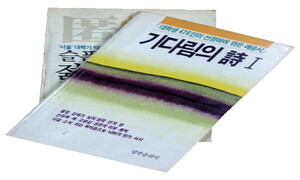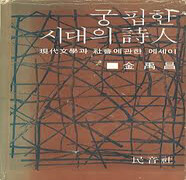1
“지제크한테 원고 청탁 해봐요.” “네? 뭐라고요? 그 지제크요?”
지금은 한국의 인디고서원에서 직접 인터뷰한 책도 나오고,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유명하지만, 10여 년 전 나에게 슬라보이 지제크라는 사람은 무슨 명품 브랜드 같은 존재였다. 멋지기는 하나 내가 접촉할 일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 주간님은 초보 에디터인 나보고 원고 청탁을 하라 그러신다. 우리 잡지를 알지도 못할 텐데, 내가 어디 교수도 아니고, 그 어려운 기획 의도를 게다가 영어로? 그나저나 우선 연락처는 어떻게 구하지? 주간님이 하세요, 주간님이!
그러나 나는 시키면 한다는 정신은 강했다. 당시 지제크가 있던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찾았다. 거기로 A4용지 2장이나 되는 장문의 영문 편지를 보냈다. 전혀 답변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일주일 뒤 전자우편함에 뭔가가 와 있다. 보낸 사람이 지제크란다. 잔뜩 긴장해 열어보니 딱 한 글자가 있었다. OK.
그 뒤로도 주간님의 ‘해외 유명 지식인 접촉’ 주문은 계속됐다. 그리고 꽤 많은 경우 ‘이 전자우편 주소를 쓰기나 하겠어?’라는 짐작은 깨졌다. 비록 거절이라고 해도 연락은 반드시 왔다. 답장이 늦을 때는 있어도 묵묵부답인 경우는 없었다.
편집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저자를 ‘잡아오는’ 일이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원고를 달라 조르고, 그러다 숱하게 거절당하면 ‘잡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한다. 게다가 상대가 유명한 분이면, 그 수많은 구애에 내가 괜히 하나를 더할 뿐이지 않은가 싶다. 지금도 저자와 연락하는 게 쉽지 않다. 성격유형 검사 같은 걸 하면 지극히 ‘샤이’하다고 나오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분명히 남겨준 것이 있다.
사진작가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피사체에게 쑥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 한 발이 머쓱해서 못 다가가는 순간, 그 장면을 놓치는 거라고. 어디 일만 그런가. 사랑도 마찬가지다. 고백해보지 않은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이름도 못 붙인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게 거절일까? 우리가 배려하고 있는 게 과연 상대의 귀찮음일까? 설령 머쓱한 상황이 닥치면 어떤가. 내가 상대를 그렇게 만든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 아닌가.
새해인사 카드에 이런 말을 많이 썼다. “생각하고 옮기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어느 순간 생각만 하고, 만나보지도, 전화를 걸지도, 전자우편을 보내지도, 심지어 알아보지도 않은 일이 많았던 것이다. 2014년에는 모든 이에게 생각하는 일에 더해 ‘옮기는 일’도 많아지기를 바란다. 덧붙여 인디고서원과 지제크가 인터뷰한 책의 제목은 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전 안 풀리자…트럼프·백악관, NYT·CNN에 화풀이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