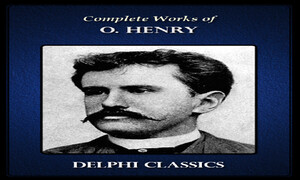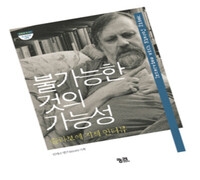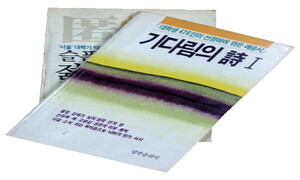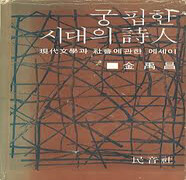1
9년 전, 서울 정동 거리. 길 한복판에서 조그마한 여성이 커다란 여행 트렁크를 다짜고짜 펼쳤다. 그리고 뭔가를 마구 찾기 시작했다. 가방 안 옷가지들이 다 드러났다. 이 무슨 풍경인가.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옆에 선 키 큰 여성은 이미 익숙한 듯 생글생글 웃고만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나에게 건네진 물건은 손수건이었다. 키 큰 여성이 말했다. “보경씨, 선물이랍니다.” 검은 천에 별자리가 하얗게 수놓아진 손수건은 일본의 한 자연사박물관에서 사온 거라 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저자에게 받은 선물이기도 했다. “우에노 지즈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의 이분은 누구?” 그녀가 또 한 번 웃었다. “저 지즈코예요.” 그녀였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조한혜정과 우에노 지즈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여성학자의 서신 교환을 담은 책을 만들 때의 일이다. 여성, 청소년, 노년, 공동체, 한-일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룬 이 책의 제작 과정은 복잡했다. 조한혜정 교수가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이를 일본어로 옮긴다. 그걸 받은 우에노 지즈코 교수는 일본어로 답장을 쓰고, 다시 한국어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담당 편집자들이 매회 원고를 검토하고 편집한다. (두 분 모두 영어가 유창한데도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다.)
2명의 저자, 2명의 번역가, 2명의 편집자, 그런데 이 6명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찌나 잘되는지 나는 1년 내내 그들 모두와 동침(?)하는 기분이었다. 이같은 긴밀함에는 일본 이와나미출판사 편집자의 덕이 컸는데, 그녀의 이름 또한 ‘지즈코’였다. 그녀와 나는 전자우편을 자주 주고받았다.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주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보니, 우리 사이의 전자우편은 양도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나중에 보니 둘이 나눈 전자우편의 분량이 거의 책 원고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의 편집자가 한-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여성 편집자가 여성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나누었던 경험은 강렬했다. 나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 우에노 지즈코 선생님은 검색하면 사진이라도 나오는데, 이 ‘지즈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던 그녀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미인이라니! 아직도 그녀의 얼굴이 생생하다.
매년 겨울 편도염이 도지면 나는 지즈코 선생님에게 받은 그 손수건을 목에 감는다. 간혹 후배들에게 자랑도 한다. 이거 내가 처음으로 저자에게 받은 선물이라고(그것도 물 건너온).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지즈코’가 생각난다. 그녀는 책이라는 게 국경과 문화와 사회를 넘어 생각을 잇게 해준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와 내가 함께 만든 책의 제목처럼. 그 책이 바로 이다. 그런데 우리 둘 사이의 전자우편은 무슨 언어로 썼을까? 영어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어에 아주 능통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