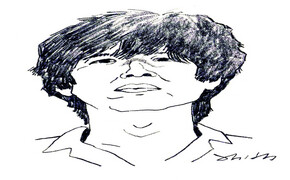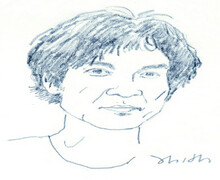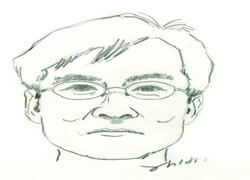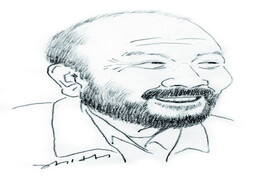차승재. 일러스트레이션 임범
1990년대 초·중반, 술집 심야영업을 금지할 때였다. 이 칼럼에 썼던 카페 주인 염기정이 자정 넘어 영업하다가 걸렸다. 경찰이 영업 허가증을 들고 갔다. 파출소로 오라고 했다. 그 직후에 차승재가 왔다. 염기정 왈, “허가증 뺏겨서 장사 못해.” 차승재가 앞장섰다. 염기정에게 라면 한 박스를 사라고 했다. 그걸 들고 둘이 함께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관에게 차승재가 말했다. “제 집사람인데요, 제가 무능해서 술 팔게 하고 있는데….” 차승재는 염기정의 남편이 아니다. 단골손님일 뿐이었다. 차승재와 경찰관 사이에 몇 마디 말이 더 오갔고 경찰관은 딱하다는 듯 허가증을 돌려줬다. 이후 심야영업 단속 나갈 때 염기정의 카페에 미리 연락해주기까지 했단다.(이상 염기정의 증언)
차승재(49)가 누구냐고? 영화 등을 제작했고, 현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이다. 이 선정하는 ‘충무로 파워 50’에서 3년 연속 1위에도 올랐다. 그렇게 잘나가고만 있으면 이 난에 쓰기 민망할 텐데, ‘다행히도’ 얼마 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영화사를 그만둬서(사실상 잘려서) 영화 제작을 못하고 있다.
앞의 일화처럼 그는 뭔가를 해결하고 추진하는 쪽이지 고뇌하고 회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거기 더해 곰 같은 체구와 달리 감성이 예민하고 이야기를 좋아한다. 딱 제작자 체질인 것이다. 어릴 때 집안이 가난했다가 형편이 폈다가 했던 모양인데, 학창 시절 그는 주먹 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문고판 소설책을 (스스로 생각해도 희한하게) 열심히 봤다고 했다(감성은 이때 생겼을 거다). 그 때문에 조숙해져서 대학 1학년 때 자식을 낳아 일찍부터 벌어먹고 살기 바빠졌다. 포장마차부터 옷장사까지 열심히 했다(추진력은 이때 생겼을 거다). 서른 살에 영화에 뛰어든 그가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기와 일치한다. 그가 영화사를 그만둔 건, 투자자의 힘 앞에 제작자의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한국 영화계의 현주소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다.
차승재의 전성기에 나는 일간지 영화 기자를 했다. 그가 제작한 영화들엔 어릴 적 서부극에서 보던 목가적인 정의감이 배어 있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정의롭고 약자의 편에 서고, 남녀 모두 의리나 신의를 지키고, 혹은 그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우직하고 낭만적인 마초스러움! 차승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 내가 조감독 한 명과 단골 카페에 갔을 때다. 따로 와 있던 차승재가 우리 테이블로 왔다. 당시 그는 충무로 파워 1위였고, 대다수 스태프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다. “이름이 뭐라고? 전엔 어떤 영화 했지? 범이가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열심히 해.” 보스답지 않나? 촌스러울 수도 있는 매너가 촌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우리 세대 마지막 마초라고 할까.
4년 전 그가 영화학과 교수 제의가 들어와 맡으려 한다고 했다. 난 말렸다. 창작하는 이에게 강단은 무덤 같다는, 거기만 가면 시인이든 감독이든 만화가든 작품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더러 “그럼 넌 왜 부장 해?”(그때 나는 문화부장이었다)라고 반격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됨을 알면서도 더 말릴 수 없었다. 1년 뒤 그가 제작한 영화의 시사회가 끝나자 “영화 어땠냐”고 물어왔다. 여느 제작자와 달리 자기 영화에 대해 “잘 써달라”는 말은커녕 “어떻게 봤냐”고 묻는 일조차 없던 그였다. 그날 저녁 술 마시면서 보니 그는 시사회장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 놀라 있었다. “나는 정말 좋았거든. 나도 이제 감각이 늙었나봐. 자꾸만 관객과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신이 없다.” 그 뒤로 달라졌다. 영화인보다 문인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자기 영화 시사회도 안 가고, 그러다가….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래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임을 나도 안다. 대다수가 관성으로 남아 있을 뿐, 오래 해서 존경받는 이도 드물다. 하지만 아쉽다. 우직하고 낭만적인 마초스러움. 솔직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고, 벗어나도 향수가 남기 마련이다. 그런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한국 사회인데, 그 정서를 반영하고 반성하는 영화가 안 먹힐 수 있을까. 할리우드 장르영화들도 오래도록 그런 정서를 이어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 없어 하는 듯하다. 몇 달 전 차승재 교수실에서 만난 유하 감독도 차승재에게 그랬다. 당신이 영화를 해야지, 그런 든든한 제작자가 있어야지, 지금 영화판이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차승재는 딴소리를 한다. 자신은 영화를 좋아한 게 아니라, 영화라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다는 둥, 아일랜드에 1년 머물면서 기네스 맥주나 실컷 먹고 싶다는 둥…. 오십을 전후해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려는 이들을 나는 부추기지만, 차승재에겐 그러기가 싫다. 나도 아직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걸까.
임범 애주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725126758_20260226501531.jpg)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총부리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이 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허위보고한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준다”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입장 정리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불륜 파묘’ 빌 게이츠 “러시아 여성 2명 만나…엡스틴 피해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