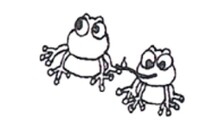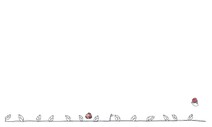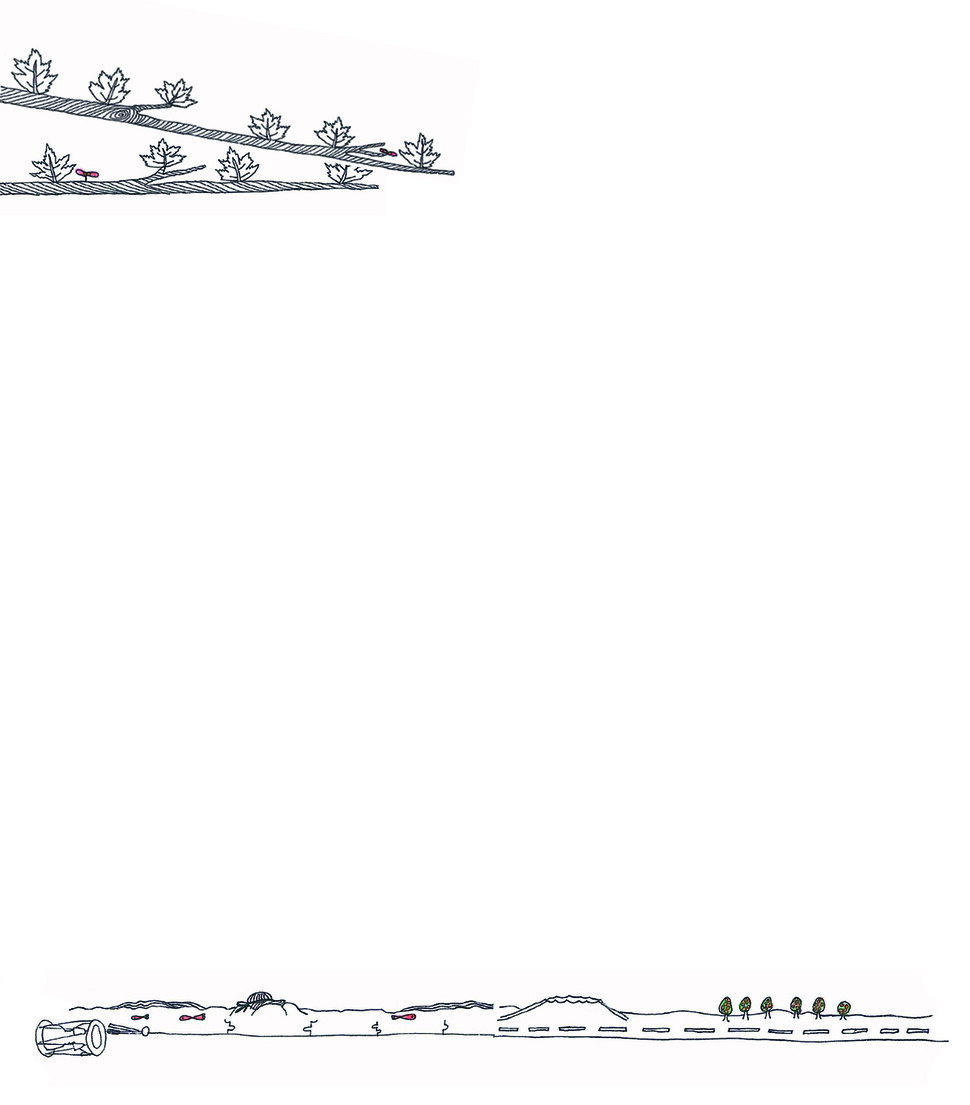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가 아팠기 때문이다. 새로운 약에 적응할 때 으레 있는 일이다.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는 건데 약 부작용이 또 다른 약을 부른다. 약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혈관 염증으로 가슴에 통증이 있건, 약 부작용으로 배가 아프건, 몸살 기운이 있건, 가끔 많이 움직인 날 근육통을 앓건 몸이 아프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르막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기분이 든다. 등산하러 다녔던 경험 때문일 거다.
9살 때 언니를 따라간 첫 산행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어린이 산악회에서 등산을 갔다. 침대에 누워만 있기에도 아까운 토요일, 공기가 축축한 새벽에 집을 나섰다. 버스에 올라탔고, 늘 준비되지 않은 기분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시작길은 언제나 가팔랐다. 숨이 점차 가빠지고 다리가 아파지면 저 앞 나무까지만 가야지, 그다음 바위까지만 가야지, 저기에서 물을 마시면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플 때 같은 생각을 한다. 15분만 버텨봐야지. 두 시간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정상에 다다르고 하산 뒤 집에 갈 것이 확실한 등산과 다르게, 아픔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게 나를 막막하게 한다.
산에 가면 오르막길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집에 오면 씻기도 귀찮은 몸에 근육통이 불청객으로 찾아올 것을 알았다. 늘 가기 싫었다. 그랬던 나를 알고 있음에도 몸이 아플 때 혹은 여름의 짙은 풀 내음을 맡거나 안개 속에 서 있을 때 문득 산길 한가운데를 걸어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나무와 흙길. 무거운 옷가지와 가방, 찐득찐득한 땀방울과 꼬집으면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던 습한 여름 공기. 귀와 볼을 따갑게 때려대던 날 선 겨울바람. 그 사이를 걸어가는 내 두 발. 그 시간을 걸어온 내 발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고 넘어졌고 주저앉았는지, 어떻게 일어났고 다시 걸어갔는지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지금 아프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병을 진단받은 뒤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욕심껏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지쳤다.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몸을 보면서 서러웠다. 1월 초부터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겨울방학을 나를 보듬으며 보냈다. 지치고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꾸준히 운동하고,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수면과 생활에 도움이 될 약을 처방받았다. 잡념을 끊어내려고 노력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불안하다’는 나에게 상담 선생님은 “최대한 쉬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했네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쉬어야겠다고 느껴서, 그렇게 했다.
아직 충분히 쉬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만하면 됐다 말하고 일어나기가 겁난다. 어젯밤에도 많이 아팠고, 그걸 회복하는 데만도 며칠이 더 필요할 것이다. 어젯밤 아프기 전, 낮에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앞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병원 앞을 걷듯 가끔 집 앞도 걷는다. 그리고 다시 가끔은 걷다가 생각한다. ‘전부 극복하고 일어나겠다’라고 다짐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몇 걸음 내딛는 건 힘들지언정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아까보다 몇 걸음 지나왔지 않은가? 외투를 여미고 주머니에 시린 손을 꽂는다. 다시 계속 걸어간다. 내가 걷는 길은 산길이 아니기에 오르막만 이어지지도 않고 흙길도 아니고 나무도 빽빽하지 않고 듬성듬성하지만 걷기에는 한결 편하다. 언젠가 다시 흙을 밟고 산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다.
신채윤 고1 학생
*‘노랑클로버’는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보복 나서는 이란 “미 항모 4발 타격”…미국 “미사일 근접 못해”

국힘, 필리버스터 백기투항…TK여론 악화로 행정통합법 처리 ‘다급’

하메네이 참석 회의 첩보 입수…거처 등에 ‘폭탄 30발’ 투하

이란 최소 200명 사망…CNN “보복으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하메네이 전권 위임받은 라리자니 “미국, 후회하게 만들겠다”

말에 ‘뼈’ 있는 홍준표…배현진 겨냥 “송파 분탕치는 정치인 정리해야”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391952718_511772339139994.jpg)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장동혁, 윤석열 껴안더니 부정선거 음모론까지”…개혁신당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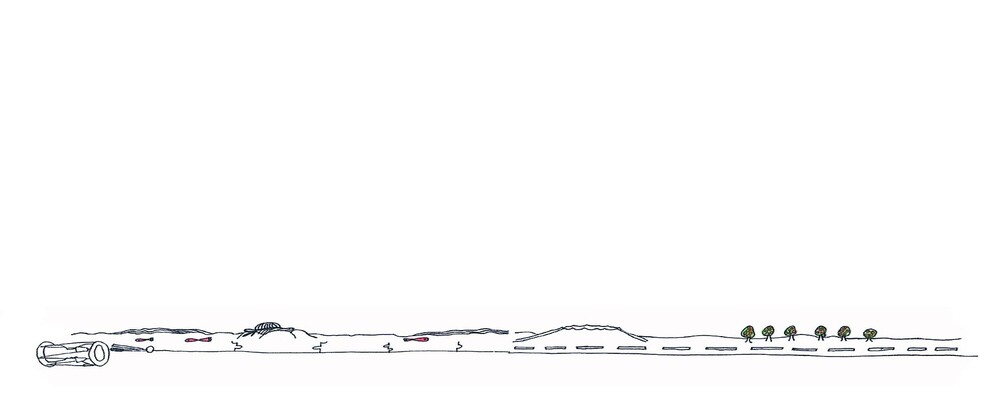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