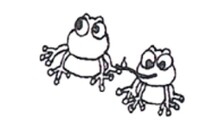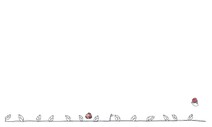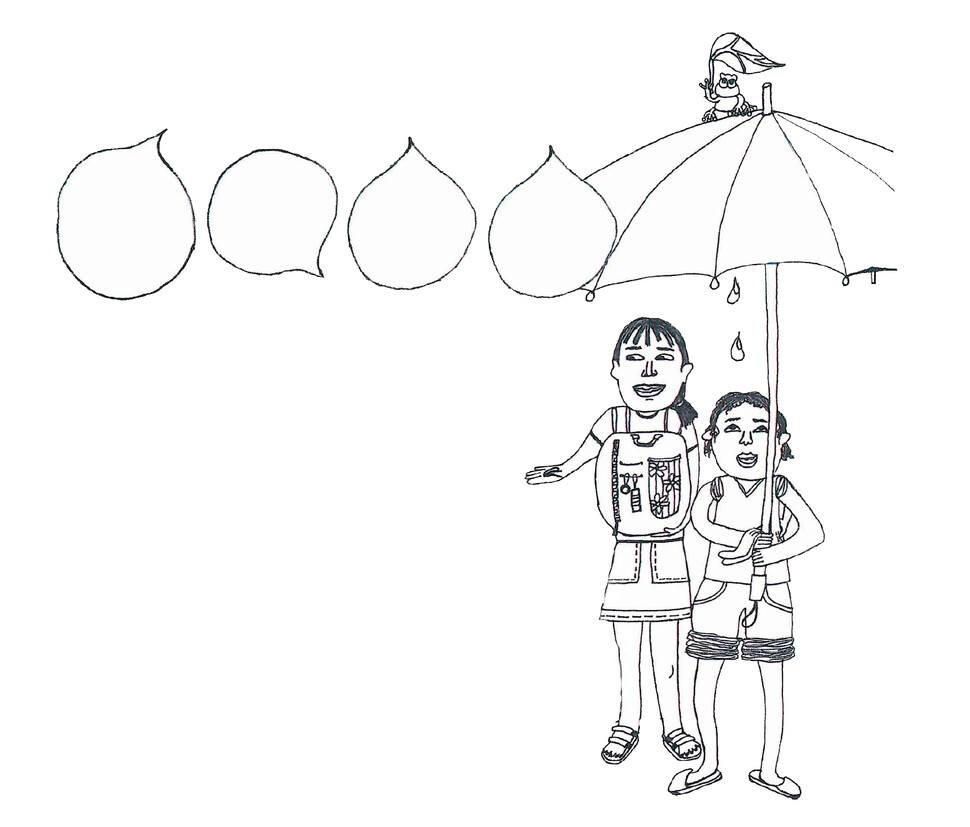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가을비임을 알 수 있는 건 싸늘한 공기와 냄새 때문이다. 지난여름에는 스콜처럼 비가 많이 내렸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곳까지 물에 잠겼다. 우리 집에도 물이 조금 샜다. 특히 내 방 책상은 창문 앞에 있는데 창문 위 천장에서 물이 새서 책상 유리 틈새로 흘러 들어가 짙고 투명한(그리고 닦기 어려운) 웅덩이를 만들어 넓게 퍼졌다.
그러잖아도 2년 전쯤 비가 많이 온 해에 물이 샌 적이 있었다. 여름이 오자마자 책상 위 모든 책을 치워뒀는데, 이때만큼 내 선견지명에 탄복한 적이 없었다. 이보다 심각한 피해를 본 곳이 많다는 것을 떠올리면 언제나 부끄러워진다. 물이 조금 새는 것에 그쳤다는 데 쉽게 안도해버린 것이 부끄럽고, 그런 일에 언제나 등 돌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나는 빗물이 내리는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지만, 나의 모든 생각을 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기에 글로 쓰는 건 이미 한 번 ‘선별된’ 말들이다. 선별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기억될 만하다’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라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글이 내 의지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최근에 입시용 글 몇 편을 썼다. 제시문을 읽고 서로 비교·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글이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정형화되고 답이 정해진 글들이다. 무슨 생각을 ‘선별’해서 쓸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만약 이런 글만을 써왔다면 나는 빗물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이런 글만을 원한다면 내가 세상사에 예민해져 있는 것은 의미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런 불안함은 새삼스럽다. 글을 쓰는 동안, 매 시험을 준비하고 정답에 나를 맞출 때마다, 반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빗물에 이미 다 젖어버린 양말처럼 더 이상 개의치 않을 만큼 익숙하다. 여상하고 평범해서, 평온하다.
2주 전쯤 정신과 상담이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어쩐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한 건 아니에요.” 동시에 평온하다고도 말했다. 특별히 많이 우울하거나, 아주 신나거나, 큰 걱정거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평온해서 불안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상태가 어쩌면 정말로 안정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원래 안정된 상태는 언제나 일정한 불안감과 불확실함을 동반한다고. 옳은 말이다. 나도 안정적 상태가 맞는지 의심되고, 안정적 상태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안정적 상태에 있어도 되나 싶고 무엇보다 안정되고 싶지 않다. 안정적으로 사는 건 어쩐지 세상사에 무뎌지는 일인 것만 같다. 나는 무뎌지고 싶지 않다.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만큼의 에너지는 없다. 내가 말하는 예민함은 친구와 나누는 대화, 머릿속을 짧게 스쳐 가는 단상,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놓치지 않고 글로 만드는 것. 내 글에 대한 회의와 마주할 때마다 무뎌지는 기분이 들어서 무서워진다.
고3으로서 존재할 때, 무엇을 어디까지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어야 할까? 무뎌지지 않으려면 어떤 글을 쓰고 생각해야 할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안정된 상태에 안주해야 할까, 아니면 안정된 상태를 끝없이 불안해해야 할까?
사실상 안정된 상태의 나는 이런 의문들로 속이 시끄러운데 눈치도 없는 비는 또다시 추적추적 내리고, 한기를 내 방에 감돌게 한다. 8월인데도 발이 시리다.
신채윤 고3 학생·<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 저자
*노랑클로버: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배신자론’ 일축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말기 암 치료 중단 이후…내 ‘마지막 주치의’는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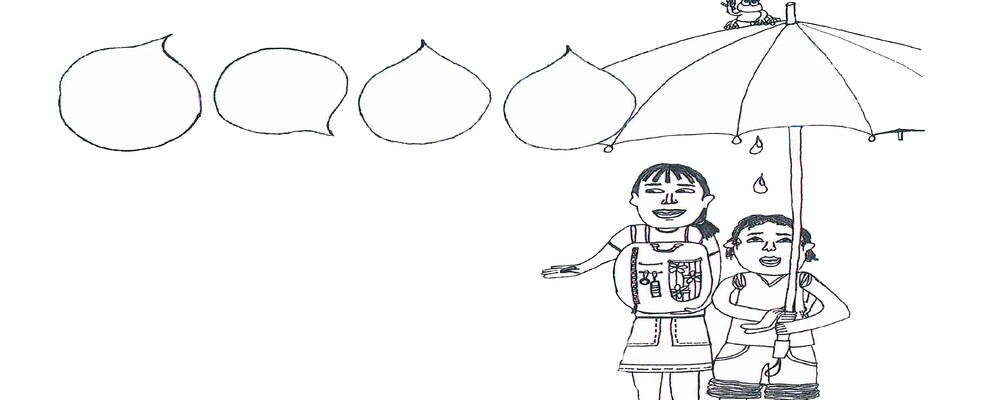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