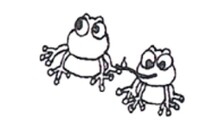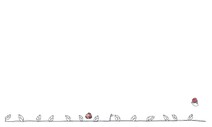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추분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금 똑같아진다는 추분에는 소나기가 우렁차게 내렸다. 그러잖아도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요즈음인데,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는 확실히 기온이 더 내려갔음을 느꼈다. 추분의 소나기는 계절의 경계를 긋는 빗줄기구나. 부쩍 공기가 상쾌해졌다. 이런 청명한 날씨에 마스크 속 내 숨결만 느끼려니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가을은 학교가 가장 예쁜 계절이다. 우리 학교는 철제 기둥 사이를 나무와 콘크리트가 메우고 있는데, 이 철제 기둥이 여름에 새로 칠한 붉은색이다. 가을의 색과 잘 어울린다. 지난 금요일에는 학교에서 짧은 회의가 끝나고 회의 전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찾아 학교를 누볐다. 운동장 주변을 한 바퀴 걷고 건물 뒤쪽 산과의 경계 부분도 구석구석 찾았다. 마침내 친구들을 학교 건물의 붉은색 테라스에서 발견했는데, 친구들은 무릎을 모아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귀 옆을 가르고 머리카락을 살랑이는 바람이 친구들 주변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즘은 수 프리도가 쓴 니체의 전기 <니체의 삶>을 도서관에서 몇 번씩 빌려가며 천천히 읽고 있다.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싶을 정도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고 게을러서이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다 핑계라고 김혜수 배우가 어느 광고에 나와서 말했는데 나는 정확히 그 핑계를 대면서 책 읽는 것을 미루고 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그너와 니체의 관계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바그너는 니체를 거의 아들처럼 아꼈고, 니체는 자신과 바그너의 생각이 이따금 갈릴 때가 있었음에도 바그너의 의견과 그의 음악을 존경하며 존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그너와 니체의 관계 중 많은 부분이 바그너의 두 번째 아내 코지마의 일기에 의존한다는 점이었다. 일기를 성실히 쓸 의지를 잃어버린 나로서는 조금 충격적이었다. 코지마는 자신이 꾼 꿈과 바그너, 니체와의 대화 중 많은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코지마는 왜 그렇게 많은 글을 썼을까? 왜 그리 자세하게 일기를 썼을까? 위대한 음악가인 남편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을까? 나는 나를 지키려 글을 쓴다고 여겼는데 날 지키려는 그 마음이 풍선처럼 터지고 둑처럼 무너지면 글 쓸 마음도 같이 사라져서, 일기를 쓰는 것조차 힘들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에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캄캄한 늪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이 잘 안 써진다는 점이 나를 힘들게 한다. 왜 글이 잘 써지지 않냐면, 내 생각이 더는 독창적이고 놀라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태기가 찾아온 것 같다. 내 마음속이 지문 같은 미로라면 나는 적어도 3년째 같은 자리를 헤매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간극을 계속 포착하고, 더 깊이 캐는 작업을 반복하다보니 그것도 괴롭다.
요즘 글을 쓸 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보이고 싶은 모습을 글에서 보여주기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솔직한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글을 써도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글이 써진다면, 생각이 충분히 깊게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오르막길을 오르는 기분으로 글을 쓴다. 그 와중에 물 두어 모금 마시고 간식 한입 먹는 것처럼 자신을 위로한다. 짙고 청명해서 가장 내면 깊숙이 들어가기 좋은 계절이다.
신채윤 고3 학생·<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 저자
*노랑클로버: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총부리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거침없는 코스피 6300 또 최고치…삼전·닉스 7%씩 올라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