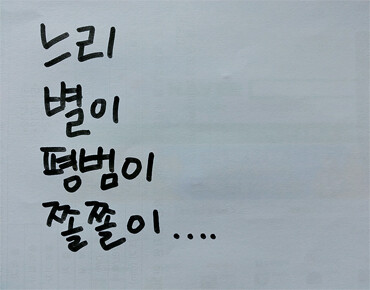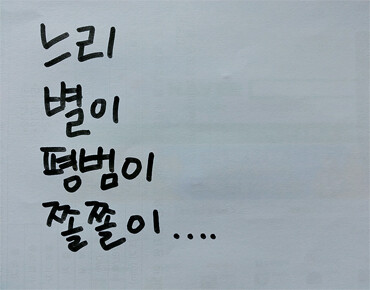
1
여섯 살짜리 준하가 묻는다. “느리, 어디 가?” “응, 작은나무 가”라고 답한다. 카페 가다 만난 꼬마 친구가 알았으니 볼일 보라는 듯 돌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뛰어간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열 살짜리 별이가 인사한다. “느리, 예쁘다.” 기분 좋게 웃기도 전에 덧붙인다. “옷이.” 그래도 물론 기분은 좋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보다 내가 불리고 싶은 별칭을 찾고 싶었다. 동구권의 붕괴, 사회주의의 몰락. 저마다 자신을 부정하며 시대에 빠르게 영합하는 변신과 변심이 안 좋아 보일 무렵이었다. 느리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늘, 항상 가슴에 별처럼 반짝이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나는 ‘느리’다.
내 남편의 별칭은 ‘평범이’다. 선배의 아이에게 “희철이 삼촌 별명 뭐로 지어줄까?” 물었더니 “글쎄, 너무 평범해서…”라는 답이 돌아온다. 망설임이 담긴 그 말이 핵심을 짚어서 바로 ‘평범이’가 되었다.
내 주위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많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함으로, 친근함으로 서로 부르는 별칭이 그럴듯해 보여 따라하는 부모가 많은 까닭이다. 또 그걸 보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이가 적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운동은 확산이다.
별칭을 불러보자. 기억하기 쉬워진다. ‘나무늘보’는 나무늘보를 닮았다. ‘코알라’는 또 진짜 코알라를 연상시킨다. 어린이집의 선생님도 그냥 ‘오솔길~’ 하고 부르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그냥 ‘스콜라~’ 하고 부른다. 많이 배웠건, 나이가 많건, 일하는 곳의 직책이 뭐건 상관없이 편하게 부르는 것에서 정말 수평의 관계가 싹튼다. 굳이 ‘님’자가 붙으면 좋겠다 싶으면 별칭에 님을 넣으면 된다. ‘빗님’ ‘사부님’ ‘훈장님’ 이렇게. ‘한울님’ ‘하느님’이란 별칭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
별칭을 지을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긴 하다. 너무 길게 짓지 말 것. 한 아빠가 고집을 부렸다. 졸졸이라고만 해선, 시냇물이라고만 해선 느낌이 살지 않으니 자기는 꼭 ‘졸졸시냇물’로 불려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졸졸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닌 ‘쫄쫄’로 불리고 있다. ‘길모’라는 한 엄마는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 진짜 내 인생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을 담아 ‘길모퉁이’라고 지었지만, 아이들이 줄여 불러 그리되었다. 별칭, 너무 길면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잘린다.
*‘레디 액션!’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소한 제안을 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액션’을 원고지 6~7장 분량으로 써서 han21@hani.co.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레디 액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국힘 ‘절윤 격돌’ 예상했지만…싱겁게 끝난 “입틀막 의총”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면 훨씬 더 높은 관세”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