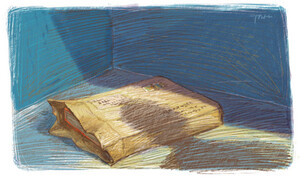지난 12월14일은 내가 혼자만의 비밀일기를 써온 지 정확히 31년이 되는 날이었다. 31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는, 미래의 내 딸을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애가 열세살이 되면 열세살의 일기를, 스무살이 되면 스무살의 일기를 읽게 해주리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다. 비록 ‘미래의 딸’에게 보인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나는 ‘진실만이 가르침을 준다’고 믿었고,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를 따로 써내는 노력까지 감수하며 그 일기의 ‘진실’을 지켜내려 애썼다. 일기장 검사라는 야만적인 행위는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으니까.
63권에 이르게 된 ‘속삭임’
또한 나는 추호라도 진실을 숨기고, 나를 미화하는 짓을 할까봐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 충동도 누르고, 글씨까지 일부러 괴발개발 엉망으로 쓰기도 했다. 과연 그 나이만이 누릴 수 있는 소녀적인 결벽성의 절정이라 할 만했다.

제목 또한 ‘속삭임’이었던 그 일기는 어느새 63권에 이르게 되었다. 그 속에는 그야말로 조숙한 문학소녀였던 열세살의 내 모습부터, 어느덧 중년 여인이 된 마흔네살의 지금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물론 실제로 일기를 쓴 날은 살아온 날의 반도 되지 못하리라. 하지만 내 삶을 기록한 것이기에 나는 쓰여 있지 않은 백지의 날들까지 다 읽어낼 수가 있다. 기실은 너무 괴롭거나 너무 행복했던 날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백지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일기를 쓸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 언제나 삶이 먼저이다. 그랬기에 일기장에 적히는 얘기들은 대개는 굵직한 삶의 줄기에서 부스러져 떨어지는 가루 같은 것들,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래도 그것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이룬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인생이란 신이 쓰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했지만 긴 시간의 일기를 함께 모아 읽어보면 그런 실감이 어찌나 강렬하게 드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 속에는 상징과 복선과 암시와 인과관계가 어떤 소설보다도 촘촘히 들어 있다. 단 그것은 짧은 날의 일기만 읽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일기는 어디까지나 장편소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장편소설을 읽는 일, 그것이야말로 일기를 오래 써온 사람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렇게 일기를 읽게 되면 내 삶의 어떤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어렴풋하게라도 알아내게 되는데 그 재미가 여간 쏠쏠하지 않다. 그것은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있는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해가는 기쁨이다.
그러니 나의 애독서 중의 애독서는 ‘나의 일기’이다. 나는 가끔씩 ‘30대’라든가 ‘여고시절’이라든가 ‘1996년에서 1999년’ 하는 식으로 범위를 정해 그것들을 읽는다. 그마저도 며칠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내 일기를 나만큼 깊이 이해하고, 나만큼 재미있게 읽을 수는 없으리라. 설사 내 딸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몸부림쳐 살아온 내 삶의 기록이기에 오직 나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책’이다.
“기억을 믿을 수 없었기에 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믿는 그 기록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흥미를 준다는 사실이다. 이사벨 아옌데가 에서 ‘그녀는 기억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일기를 썼다’고 했듯이 오래 전 일기를 읽어보면 기억이란 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를 절실히 알 수 있다. 일기장에서 만나는 오래 전의 내 모습은 너무도 낯설어서 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길목마다 기다렸다가 바통 터치를 받은 다른 여자가 교대로 삶을 살아온 것만 같다. 그랬기에 그것을 읽는 일은 때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 같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는 실제로 딸을 둘이나 낳았고, 그 딸들이 열세살이 되었을 때 내 일기의 첫 권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나이에 맞춰 일기를 보여주는 일은 포기했다. 너무나 ‘진실’하게 적어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일기는 나의 애독서로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저 열세살의 내 결심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늙어 죽기 전, 가득 쌓여 있는 그것들을 날 잡아 한꺼번에 읽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삶의 완성된 모자이크 그림을 조금은 알아채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어찌될지 나는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한치 앞을 모르는 미물의 꿈에 지나지 않겠지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배신자론’ 일축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말기 암 치료 중단 이후…내 ‘마지막 주치의’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