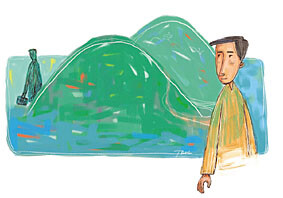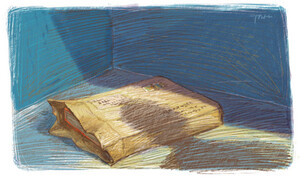산에 오르고서야 비로소 산을 내려올 수 있다. 물론 오르지 않고서도 능히 그 산의 높고 깊어 험준함을, 낮으나 그윽하여 평화로움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실로 큰 바위와 모래알처럼 다를 것이다.
산을 오르지 않고 그 산을 오르며 온몸을 적시는 땀을 흘려볼 수 있으랴. 이윽고 능선에 오르면 땀에 절은 몸과 마음까지 푸르도록 상쾌하게 씻어주는 바람을, 산과 산들이 어깨 두르고 가는 한바탕 호연지기를 어찌 맛볼 수 있으랴. 낙엽 밟는 소리를, 계곡의 시린 물소리를,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으랴. 크고 작은 나무들의 숨결들을, 꽃들을, 어진 짐승들의 동그란 눈망울들을 어찌 만날 수 있으랴.
강의를 듣느니 차라리 일기를 써라
그리하여 산을 내려와 높고 낮음의 차이를 알며 나아가 그것이 다름 아님을 알며 산을 오르기 전의 나와 산을 내려온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님을 알며 그 또한 바로 나임을 알며.
어느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할 때였다. 한 학기 강의를 맡아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나를 부르는 학생이 있었다. 집에 한번 찾아가도 되느냐고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작품을 좀 봐달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얼굴은 자못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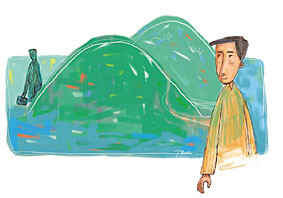
올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의 고향은 그때 내가 강의를 하던 대학과는 지역도 다른 아주 먼 곳이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 시 창작 강의를 듣기 위해 그는 고향을 떠나와 일용직 일자리를 얻고 자취를 하며 다닌다는 것이었다.
감동적이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니 이른바 전업시인이라고 자처하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일게 했다. 그가 건네는 원고뭉치를 받아들고 다음주쯤 찾아오라고 하며 집을 알려주었다.
같은 지역 사람들조차 찾아오기가 여간해선 쉽지 않은 산 속 외딴집, 그가 찾아왔다. 차를 한잔 마시며 말을 꺼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요. 혹시 이전에는 당신의 작품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냐는 말과 함께.
열심히 쓰라고만 했다고 한다. 다시 내가 물었다. 그는 고향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이런저런 월간 교양지들을 들춰보다 시를 읽고 시를 써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 청년은 띄어쓰기는 고사하고 맞춤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둘째치고 문장이 되지도 않았다. 적당히 행을 바꿔놓은 낙서, 중고등학교 백일장에 내놓아도 채 한편을 다 읽기도 전에 내려놓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신춘문예를 내겠다니 문득 짚이는 게 있었다. 집에 시집을 몇권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시집이 한권도 없단다. 아니 시집 한권도 보지 않았단다. 잘 아는 선배가 다른 사람의 시를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을 하게 되니 절대 다른 사람의 시집을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시를 왜 쓰느냐고 물었다. 그냥 시 쓰는 게 좋아서 쓴다고 한다. 다음주부터 내 수업에 나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집에 돌아가서 소를 키우고 산과 들녘을 벗삼으며 날마다 일기를 쓰는 삶을 사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도 꼭 시인이 되고 싶다면 시집을 100권 정도 읽고 나서 쓴 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 30~40권의 시집 제목들을 써주었다.
처음 시를 쓰던 마음처럼…
다음주 강의실에서 그를 보았다. 집에 내려가겠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 뒤 일년쯤 지나 신문지상에 다시 신춘문예를 알리는 지면이 나갈 늦가을, 이 땅의 문학청년들에게는 ‘신춘병’이라는 무섭고도 지독한 중독성의 병 아닌 병마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무렵 그 청년은 다시 나를 찾아와 원고를 내밀었다. 반갑기는 했으나 대뜸 시집 몇권 읽었느냐고 물었고 겨우 30권을 읽고 왔느냐는 말을 하며 돌려보냈다.
시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처음 시를 쓰던 마음처럼, 한편의 시를 쓰며 기쁨으로 차오르던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사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런 말들을 건넸을 것이다. 그 말, 그건 내가 나에게 다짐하는 말이었다.
시집 100권, 그것은 많이 보라는 것이었다. 책은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거울을 통하여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어제와 오늘을.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나를 바로 보지 않고서 어찌 갈 길을 찾아드랴. 산을 오른 자만이 산을 내려올 수 있다. 책을 읽고 책을 버린다는 것, 비로소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에 든다는 말일 게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수사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쿠바 “미 고속정 영해 진입해 4명 사살”…미국은 일단 신중 모드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