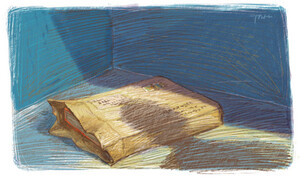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할리우드 키드’란 게 있다면, 이를테면 나는 ‘북 키드’(book kid)였다. 책 내용만이 아니라 책 자체를 사랑하는 나는 지금도 책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책은 나에게 아편이고, 니코틴이고, 카페인이다. 가방 속에 책이 들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 외출할 때마다 무슨 책을 들고 나갈까, 책들을 둘러볼 때의 내 마음은 수천 켤레의 구두를 앞에 두고 고르는 이멜다처럼 뿌듯하다.

하수구에 빠진 책벌레 어린이
눈앞에 버스가 왔어도 책이 없으면 나는 30분을 걸어가더라도 서점에 가서 반드시 책을 사온다. 친구나 애인이 아무리 늦게 나타나도 조금도 짜증이 나지 않는 건, 아니 때론 ’조금만 더 있다 오지‘ 하는 안타까움까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책 때문이다. 아이들이 멀리서도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길에 서서 책을 읽고 있는 이상한 아줌마는 엄마뿐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걸어가면서 책을 읽다가 실제로 하수구에 빠지기도 했다.
어떤 곳을 여행하든 나는 책방부터 찾았다. 그것도 구석진 곳의 먼지 쌓인 책방, 그 중에서도 가장 먼지 쌓인 구석 책장…. 내가 책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는 책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해서 만난 책들이 운명처럼 나를 흔든 경험만도 셀 수 없다. 때론 제목만으로도 내게 운명의 계시가 되었던 책들, 내 귀에 대고 직접 말할 수 없는 신이 그렇게 책을 통해 내게 계시를 내리는 거라고 믿기를 좋아하는 나.
그러니 책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인물을 만나면 나는 그 즉시 동일시 현상을 일으킨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의 ‘벨’이라는 여주인공도 그래서 내가 빠져들었던 인물이다. 장바구니를 든 채 책을 읽으며 걸어가는 벨의 모습-미모 따위는 상관없다!-에 나는 정확히 내 모습을 덧씌웠다. 어른인 내가 그 만화영화를 극장까지 가서 두번이나 보았다.
게다가 그 영화에는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 나온다. 아, 어찌 잊으랴! 그 장면만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어떤 분위기 있는 로맨틱한 애정 고백도, 어떤 농도 짙은 요란한 베드신도 그 장면만큼 나를 흥분시킨 적은 없었다. 그것은 야수가 벨에게 천장까지 책이 가득한, 사다리까지 놓여 있는 서재를 선사하는 장면이었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구애 앞에 어떻게 무릎이 꺾이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장면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책을 잔뜩 선물받는다는 물질적 의미 이상의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은 말하고 있었다. 그 거칠고 둔해 보이는 야수가, 벨의 미모에나 눈이 먼 것으로 보이는 야수가, 기실은 얼마나 섬세한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랬다. 그 깊은 이해에서 오는 애정, 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섬세한 야수의 영혼 앞에 나는 전율했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알아주는 것, 나의 본질을 헤아려주는 것, 세상에 그보다 더한 사랑의 테크닉은 없기에 내 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떨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물도 ‘지금부터 20분 동안 고르는 책을 다 사주겠다’는 로맨틱한(아니, 에로틱한가) 제안이었다. 그때 나는 9권의 책을 가슴에 가득 안고는 백화점 하나를 통째로 얻은 사람처럼 행복해했다.
날 만질 때마다 도서상품권을?
제인 캠피언의 영화 에서 여주인공이 피아노 건반 하나에 몸 한 부분을 애무하게 허락하는 장면을 보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내 손가락 하나라도 만질 때마다 도서상품권 한장씩을 내놓으라고…. 그는 “싸다 싸, 그 정도쯤이야” 해놓고는 그 뒤로 한번도 값을 치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이 모양이니, 나는 기실 사람보다 책을 더 사랑하는 냉혈한인지도 모른다. 낯선 책방에서 책을 만날 때, 나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아무리 수중의 돈이 아슬아슬해도 반드시 그 책을 사고 만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볼 사람이라도 차라리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를 철철 흘릴망정 절대 그를 붙들지 않는다.
책이 없는 천국보다 책이 있는 지옥을 택한다는 말조차 내게는 모순이다. 책이 없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지옥이니까. 아, 아무래도 나는 아귀처럼 책을 갉아먹는 책벌레나 되어 삼도천을 떠돌 것만 같다. 이제라도 이놈과 모질게 헤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정청래 “사법 3법 곧 마무리…조희대, 거취 고민할 때”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경찰 출석’ 전한길 “수갑 차고서라도 이준석 토론회 간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