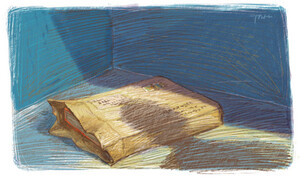Q씨! 올 11월을 나는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화관 창작실에서 보냈습니다. 창문 밖에는 황금빛으로 기품있게 물든 잎갈나무 숲이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고, 비 내리는 새벽이면 슬프디 슬픈 노루 울음소리가 들리고, 풀밭을 지나칠 때면 비단끈처럼 가느다란 어여쁜 꽃뱀이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나를 바라보곤 했지요. 그 낙원 같은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글을 쓰면서, 나는 새삼 원주와 박경리 선생과 책과 내 삶의 인연을 생각했습니다.

원주, 그리고 박경리 선생
정확히 9년 전 늦가을, 11월의 스산한 날씨 속에 원주 구석에 작은 사글세 방 하나를 얻어 원주와의 첫 인연을 맺었던 내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나만의 ‘골방’이었습니다. 늦서리 맞은 배추들이 파랗게 얼어붙은 밭이랑을 지나 골목을 돌아들면 있는 귀퉁이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첫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든 방황과 갈등은 결국 나만의 ‘골방’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을지…. 허술한 창틈으론 황소바람이 몰아쳤고, 외눈박이 가로등은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내 작은 창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내가 꺼낸 책이 바로 박경리 선생의 였습니다. 원주로 가면서 가장 먼저 챙겨넣은 책이었지요. 아무리 방값이 싸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선생이 아니었다면 원주가 나를 그만큼 끌어당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책은 맨 처음, ‘Q씨’라는 이름의 연유를 밝히기 위해 ‘아큐정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큐정전’을 동화로 고쳐쓰는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첫줄부터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지요. 빨려들 듯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번이고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겨야 했고, 죽창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그 구절들에 연방 밑줄을 그어대야만 했습니다. ‘쉰에 죽으면 앞으로 십년, 예순에 죽으면 앞으로 이십년, 누워서 손을 꼽으며 세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할 말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초조한 것입니다. 약속은 없지만 언어의 마성에 걸린 나는 허우적거려봐야겠어요. 한치를 나갈 수 있는가고. 그 가능성에 매달려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남은 시간은 지극히 촉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그랬습니다. 삶에 치여 지내면서 내 생의 남은 날들을 꼽아보느라 늘 초조했지요. 하고 싶은 말들을 가슴에만 품은 채 어느 날 가뭇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사실 어느 날의 쓰러짐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모든 것 떨치고 떠날 용기도 내지 못했겠지요. ‘앗!’ 하는 소리조차 못 낸 채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깨달음은 내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버스를 타고 선생의 댁이 있다는 단구동을 찾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빈 들판에서 꼬리를 까딱거리고 있었지요. 언덕 위로 깔끔히 정돈된 밭과 집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살 사이로 넓적한 바위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는 게 보였지요. 문득 기척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화들짝 놀라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흠모해 마지않는 분이기에 또한 만나는 일이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그 뒤로 세월은 또 여러 사연을 품은 채 말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새 선생은 를 마무리 지었고, 단구동 집을 떠나 매지리에 토지문화관을 세웠고, 나는 다시 여러 곳을 떠돌다 결국은 다시 방을 잃고 말았습니다. ‘골방’이 없어진 나는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문학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서 오직 ‘삶’만을 위해 한 몇년을 또 벅차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슴앓이처럼 통증이 밀려들면 생각했지요. ‘이번 삶은 여기까지야. 글은, 다음 삶에나 쓰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내 눈에 신문 귀퉁이의 기사가 띄었습니다. 토지문화관 창작실 무료 대여….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장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썼고, 그 여름 그곳에서 다시 글쓰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올 가을에도 또 그곳 신세를 진 것이고요.
선생의 댁은 바로 옆에 있어서 나는 내 방에서도 밭일 하는 선생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보며 담배를 무는 선생의 모습도 몰래 훔쳐보았지요. 글 쓸 방을 내줄 뿐 일절 간섭하지 않는 선생은 기실 바로 옆에 있어도 아득하게 먼 분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를 읽던 9년 전의 그 밤과 오늘은 어떤 인연의 고리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Q씨, 당신이 이 인연을 묶어준 것인가요?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초상권 침해라며 얼굴 가격”…혁신, 국힘 서명옥 윤리특위 제소 방침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