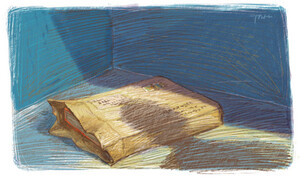제주 지역의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4년 넘게 하다가 얼마 전에 프로가 개편되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처음 그 방송을 제안받았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루치 분량이 7분가량이어서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책에 대한 느낌을 간간이 섞다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 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은 즐거움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으로 내게 다가왔다. 한마디로 밑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1년 동안은 어찌어찌 읽은 책의 기억을 되살려 방송을 해왔는데 빈약한 독서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일주일에 한권씩 읽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핑계를 둘러대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담당PD에게 전달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의 양식을 위한 책읽기가 아니라 자의 반 타의 반 어정쩡한 책읽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분량이 작은 시집이나 간단한 산문집에 손이 자주 갔다. 시집을 자주 소개하는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당PD는 아무리 시인이지만 다른 장르의 책도 좀 소개해달라고 핀잔을 준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만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가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 잘 들었다며 책 제목을 물어오는 것이 격려라면 격려가 된 셈이었다. 방송을 하면서 책읽기가 생활의 중심에 자리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방송 때문이었을까. 그 무렵 책읽기와 관련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어떠냐고 둘러대었지만, 거절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좁은 지역에 살다보면 괜히 뻐기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터라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주부독서모임이었다고 기억된다. 강연이 끝날 시간이 되면 질문이란 걸 하는데, 대개 집에 아이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데 어쩌면 좋겠냐는 내용이거나,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책을 물어본다. 두 가지 다 내겐 벅찬 질문이다.
우선 후자를 생각하면 딱히 꼬집어 얘기할 만한 책이 내겐 없다. 감동을 주는 책이란 연령에 따라,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인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이야기해달라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선물받은 생텍쥐페리의 를 말하곤 하는데 그 반응이 영 개운치 않다. ‘고작 그 정도냐’라는 분위기다. 한권을 더 들라면 나는 으레 허먼 멜빌의 을 꼽곤 한다.
그 무렵 내가 사는 집에서 한달음에 달려가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는데 바다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다. 저 수평선 어디쯤 수많은 바다새를 거느린 모비딕이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책읽기, 들들 볶을 바엔…
집에 아이가 책을 잘 안 읽는다는 질문을 받으면 염치 불구하고 되려 내가 되묻곤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아이들도 따라할걸요?” 하고 말이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칠판에 ‘책 읽지 맙시다’라고 쓰고는 주섬주섬 말을 이어갔다.
요즘은 책읽기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듯하다. 책읽기와 관련한 어린이 학원이 한 집 걸러 있고, 학교에서도 학년별 필독서니 권장도서니 하면서 들들 볶아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나는 강요된 독서로 아이들을 곤혹스럽게 할 게 아니라 책읽을 시간에 집 밖으로 뛰쳐나와 책보다 더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에 눈길을 주라고 말한다. 아파트 어귀에 있는 붕어빵 아줌마와 나누는 이야기가 책보다 훨씬 낫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구름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이 책보다 훨씬 소중하다. 바람 부는 바닷가에 서서 바다가 펼쳐놓은 책 아닌 책을 눈에 진물이 나도록 바라보라, 라고 말하며 거품을 물었던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서일까. 두 번째 강좌를 며칠 앞두고 전화가 걸려왔다. 안 와도 좋다고. 사정이 생겨서 자체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초상권 침해라며 얼굴 가격”…혁신, 국힘 서명옥 윤리특위 제소 방침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란 공습’ 전운 감도는 중동…미국,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철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