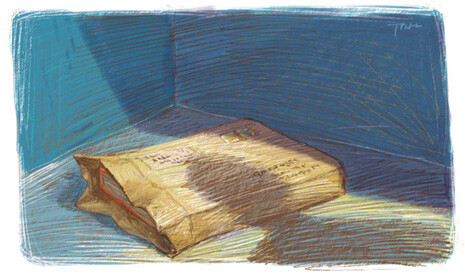이사를 자주 다녀본 사람은 안다.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물단지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은 자주 눈에 띄지 않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학교 교무실을 찾아오는 단골손님 중에 월부 책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늘 ‘병신 같은 놈’이었다
초임 교사 시절 나는 읍 소재지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무실에 월부 책장사가 들어와 기웃거리면 동료 선생님들은 으레 턱짓으로 나를 가리키곤 하였다. 그 사람들이 들고 온 봉투 속에는 주로 세계문학이나 한국문학 광고지가 대부분이어서 나를 지목했거나 아니면 아무 물정 모르는 초임이라 상대하기 귀찮은 외부 손님을 떠넘겼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의 사정이나 부탁을 딱히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몇번을 거절하다가도 끝내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면 나는 그만 꼬리를 내리고 만다. 결국 책을 구입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퇴근길에 한잔하게 되면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할 심산으로 내게 한 마디씩 건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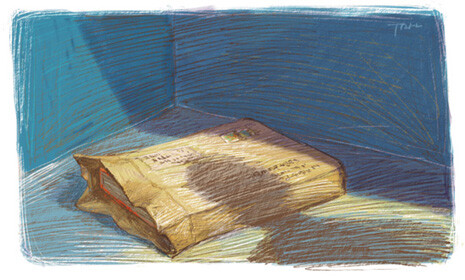
“이봐, 책을 안 사면 월부 책장사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글쎄요.”
“쫀쫀한 놈.”
“…….”
“책을 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글쎄요.”
“병신 같은 놈.”
“…….”
나는 늘 병신 같은 놈이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책만 대충 기억에 떠올려 보면 세계사상전집, 한국문화사대계, 제3한국문학전집, 사상계 영인본, 창작과비평 영인본, 1970년대 민주화운동전집, 씨의 소리 영인본 등등 몇년 사이에 나는 마치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의 그것처럼 비좁은 방 안의 벽이란 벽은 층층이 쌓아올린 책으로 금세 무너질 정도였다. 평일에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밀린 빨래를 들고 술벗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이면 그 책 덕분에 언제나 무사하게 넘어갔다. 술벗들과 어울려 코가 비틀어지게 마시고 해가 중천을 넘어서도록 잠을 자는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크게 타박하지 않으셨다. 저렇게 많은 책을 봐야 하는 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으로 늘 나를 대하곤 했으니 말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무렵 나 또한 책에 대한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빼곡히 들어선 책무더기를 볼 때마다 누군가 찾아와 봐주길 은근히 바랐고, 가끔 친구가 찾으면 마치 이름 있는 작가나 학자의 사진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책을 배경으로 얘기하기를 즐겨했으니 말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 책들의 대부분을 읽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일부분만을 읽었거나 아니면 방바닥을 뒹굴다가 손에 잡히는 책이 있으면 듬성듬성 보았을 뿐이다.
그후 결혼을 하고 방 두칸짜리 사글세 집으로 이사할 때가 되니 이 책들이 골칫거리였다. 라면상자에 담아 갖고 가긴 했으나 꽂아놓을 공간이 없어 상자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골방 한구석을 차지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빛을 본 책들이 있다면 앉은뱅이 책상다리 대용으로 쓰이는 게 고작이었다.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
요즘은 문단의 말석에 이름이 있어서인지 가끔씩 문우들이 펴낸 책을 보내주곤 한다. 대부분이 시집이지만 간혹 문학단체에서 발간한 책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관심이 가는 글은 놓치지 않고 읽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은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책장 구석에 틀어박히는 경우도 왕왕 있는 편이다. 아마 내가 보낸 책도 누군가의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책꽂이 구석에서 두툼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초라하게 앉아 있으리라.
언젠가 신경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당신의 문청 시절, 첫 시집을 내고 용기를 내어 당시 내로라 하는 선배 시인에게 책을 보내고는 우연한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 당신 이름 석자를 대며 인사를 드리니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는 얘기였다. 그 뒤로 선생님은 집으로 배달되는 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을 감춘 적이 있다. 정말이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배신자론’ 일축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말기 암 치료 중단 이후…내 ‘마지막 주치의’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