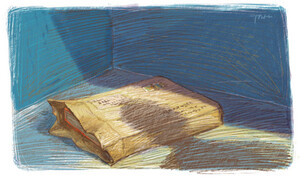악양에 있는 박남준 시인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늑장을 부린 탓일까? 구례까지 나가 버스를 타고 여수 가면 이미 제주행 비행기는 떠나고, 저만치 멀어지는 비행기의 뒷모습만 망연하게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구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티는 낼 수 없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때마침 전화가 걸려온다. 구례에서 여수 공항까지 유용주 시인이 직접 차로 데려다준단다. 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차를 갈아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고 물으니 소설 쓰는 한창훈이 조수석에 앉아서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해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전인권과 홍합, 그리고 소주 한병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스르르 눈이 감긴다. 오디오에서는 한동안 쥐어짜는 듯한 전인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낮고 느리게, 그러다가 온몸을 휘어 감는 듯한 첼로 연주소리가 들려온다.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다. 그 방면에는 워낙 문외한인지라 무슨 음악이냐고 물으면 혹시 망신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혹한 마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연주자는 누구고, 작곡자는 누구고, 어느 나라 음악이고, 하면서 말을 잇는데 나는 그냥 고개만 끄떡인다. 모르니까.
음악은 쉼 없이 계속된다. 때로는 바이올린으로 슬픔의 두레박을 건져올리는 듯한 선율이다가, 때로는 비장하게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따라온다. 집에 있는 음반이라고 해봐야 월부로 구입한 세계명곡전집이 고작이고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이라고는 윤도현이나 안치환 정도인 내 빈약함을 헤아리기라도 한 것일까?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이라고 그 음반을 건넨다. 사양하지 않고 그냥 받는다. 다시 한번 고맙고 고마울 뿐이다.
한참을 가다가 차는 예정에 없이 좌회전을 한다. 허름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차를 잠시 세우더니 한창훈이 말문을 연다. 이 건물이 소설 의 무대배경이 되었던 곳이라고. 저 건물 안에서 수십명의 아낙들이 모여 홍합 작업을 하면서 갯내음 물씬 풍기는 인생을 얘기하던 곳이라고. 건물 옆으로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식당이었다고. 하루 일이 끝나면 너나 없이 그곳으로 가서 하루의 노동을 씻어내기도 하고 울화통 터지는 얘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삿대질에 고함이 오가고 그러다가도 성님, 아우님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주를 따라주던 곳이라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자기가 묶었던 곳인데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홍합을 받아다가 하루에도 수십번 날랐다고. 띄엄띄엄 말을 이어가는 그의 눈매가 참으로 시리다.
차는 다시 큰길로 접어든다. 조수석에 앉은 그가 등을 구부려 무언가를 찾더니 가방 안에서 소주 한병을 꺼낸다. 살짝 으깨어진 귤 한 덩어리도 함께 따라나온다. 어찌 이별주가 없을 수 있겠냐며 병째로 술을 건넨다. 정말이지 고맙고 고마울 뿐이다. 그와 나 사이에 술병이 오간다. 이런 분위기에서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안다. 안주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공항 입구에 도착하니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냥 헤어지기엔 아쉬운 것이다. 잠깐 옆길로 들어가 차를 멈춘다. 술병을 챙기고 내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해안선을 따라 눈길을 준다. 바다 저 건너편으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눈에 들어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차고 시원한데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차지도 시원하지도 않다. 차에서 같이 내린 유용주 시인이 저 멀리 보이는 산, 그 아래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저기가 어머니 고향이라고. 지금도 먼 친척 되는 사람이 저기서 중국집을 하고 있다고. 잠시 그의 책 를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가끔 차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 길 끝닿은 곳에 나병 환자들이 요양하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 이 길을 오가며 흘렸을 저 바다만큼의 아픔과 눈물과 통한을 생각한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몸 안에 들어간 차고 시원한 것이 확, 하고 달아오른다. 이별을 눈치챘나 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 다시 만날 게 아니냐며 가볍게 농을 주고받는다. 탑승구 안으로 들어선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면 어릴 적 고향이었던 거문도를 보며 정중히 인사하라던 그의 말이 생각나 발 아래를 본다. 점점이 섬들이 흩어져 있다. 마음은 조급한데 어느 것이 그 섬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 김수열씨의 책에세이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다음호부터는 시인 김해자씨의 칼럼이 4주 동안 연재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할 것”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