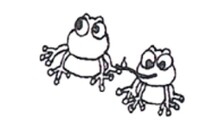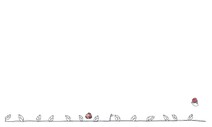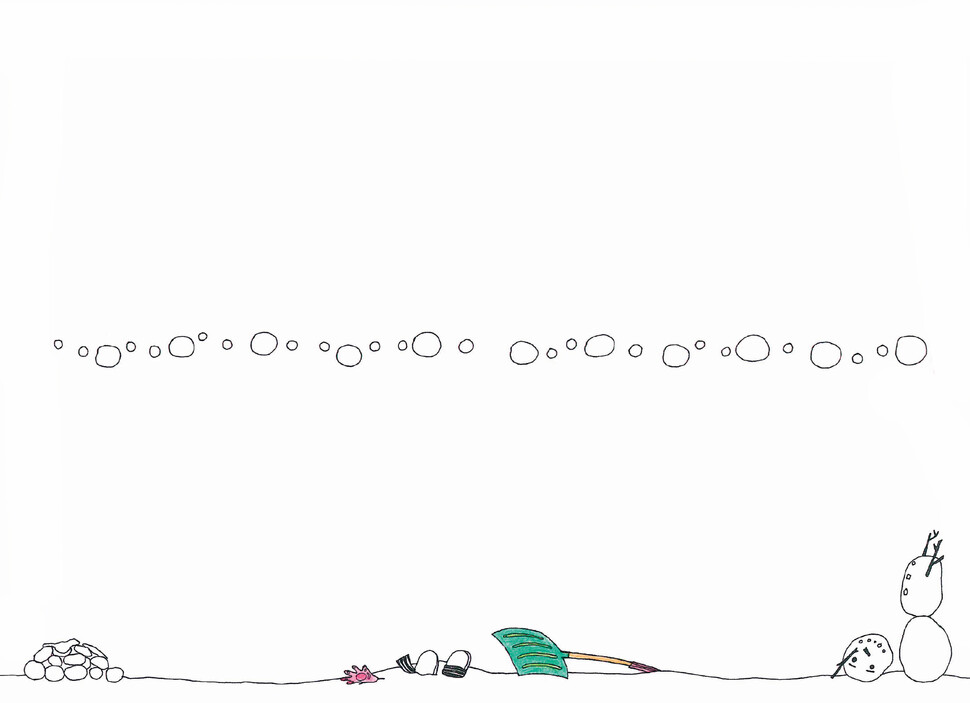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오늘은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갔다. 글쎄, 아픈 다음부터는 모든 카운트가 리셋되는 것 같다. 아프고 나서 그러긴 처음이니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아침 7시30분에 도착했다. 학교에 도착할 즈음에는 해가 떠 있었다.
이제 학교에 해가 뜨기도 전에 갈 수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병이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6주에 한 번 주사약을 맞을 때마다 같이 하는 혈액검사 결과다. 벌써 네다섯 번의 진료에서 검사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
검사 결과가 좋아질수록 의사 선생님은 한시름 놓았다는 투다. 여전히 심장이 아프거나, 손발이 저릿하거나, 이번주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은 부가적인 불편함으로 취급된다. 당장 증상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더군다나 그것이 당장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아닐 때, 의사 선생님은 냉담해지곤 한다.
그걸 탓할 생각은 없다. 하루에도 봐야 하는 환자가 수십 명인데 한 명의 사소한 불편함 하나하나에 일일이 관심을 기울이고 깊게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내가 가는 곳은 온갖 위중하고 희귀한 환자가 모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린이병원.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생각보다 없다. 서운함 같은 본능적인 차원의 문제는 내 몫이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이 마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혈액일 때가 많음을 이제 인정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위중하지 않다. 치료는 순항 중이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프다.
병원에 지금보다 더 자주 갔을 때, 주사약을 투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중 관찰이 필요했을 때, 쉽게 말해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밖에 있을 때 내가 묘하게 붕 떠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선 빠지는 수업이 많고 아프다는 것이 하나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기에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집에 와서도 그랬다. 아프기 전후로 부모님이 날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여전히 집중 관찰 대상이다. 병원에 있으면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아팠다. 모두가 고려 대상이었다. 병원에서 차라리 안정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병원이란 데는 직원을 제외하면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나는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므로 학교에서도 온전하게 있을 수 없다. 나는 어디에서도 온전하게 있을 수 없다. 그동안은 두 곳에 각각 반씩 발을 걸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두 공간 사이 어딘가에서 표류하는 것 같다.
아픈 것도 불만이고 아픈 게 나아지는 것도 불만이라니 모순적이고 비겁한 것 같다. 대체 뭘 원하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많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만족할 텐가? 지금 상황에서 만족이란 게 가능이나 한가?
답답하다. 낫는 것도 낫지 않는 것도 무엇 하나 원했던 게 아닌 듯싶다. 왜 나에게 아무도 회복까지도 아픈 과정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럽다. 모든 고통과 커다란 사건에는 언제나 회복과 재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간과하곤 한다.
신채윤 고2 학생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김경 “강선우, ‘몰아서 입금 말라’ 방법까지 알려주며 쪼개기 후원 제안”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헌법·법률 따른 판결”
![[단독] 미국, ‘한국 대미투자 1호’로 에너지 사업 요구 [단독] 미국, ‘한국 대미투자 1호’로 에너지 사업 요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2063577611_20260204503883.jpg)
[단독] 미국, ‘한국 대미투자 1호’로 에너지 사업 요구
![현무-5와 12식 지대함 미사일 [유레카] 현무-5와 12식 지대함 미사일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1902823798_20260204503163.jpg)
현무-5와 12식 지대함 미사일 [유레카]

‘파면’ 김현태 극우 본색 “전한길 선생님 감사합니다…계엄은 합법”

이 대통령 “토끼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이재용 “실적 좋아 채용에 여력”

장동혁 “선거권 16살로 낮추자”…민주 “반대하다 갑자기 왜”

장동혁, ‘한동훈계’ 솎아내기 수순?…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에 시끌

‘한동훈 제명 반대’ 배현진, 국힘 윤리위에 제소
![[단독]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 [단독]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2065519126_20260204503926.jpg)
[단독]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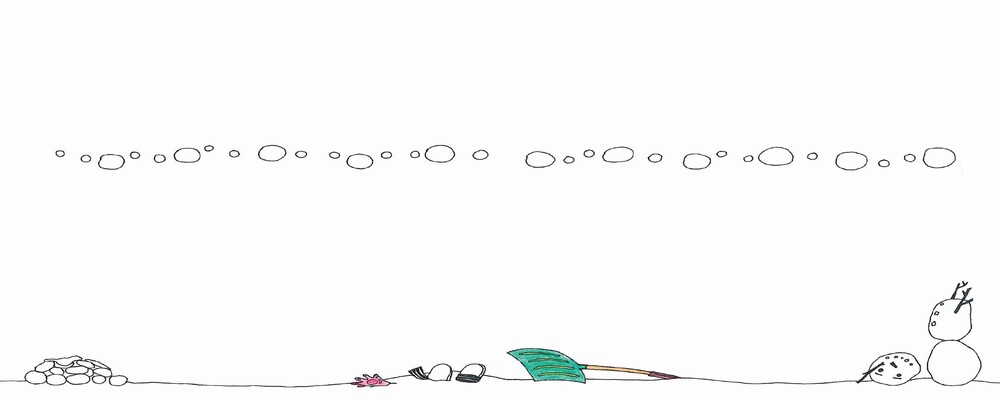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