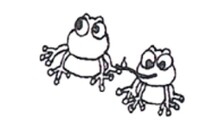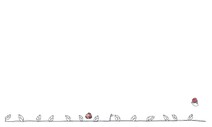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얼마 전 영어 시간에 영화 <안녕, 헤이즐>을 보는 것이 과제로 나왔다. 온라인수업 중이었다. 선생님은 영화 링크를 올려주고, 정해진 시각까지 각자 영화를 재생해서 보라고 했다. 아는 영화였다. 병을 진단받기 전에 한창 읽던 존 그린의 책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를 2014년 영화화한 작품이었다. 장르는 청소년 로맨스. 주인공 헤이즐과 어거스터스는 모두 암환자로, 암환자 모임에서 처음 만난다. 신체의 고통, 병, 나아가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내가 병을 진단받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즈음,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건강에 대해 막연하고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어렴풋이 느끼던 때였다. 책을 읽으며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헤이즐과 영화에 나오는 아픈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계속 생각한다. 우울함을 느끼고 애써 외면하고 웃음으로 승화시키지만, 결국 의식은 붙박이처럼 자신이 가진 병과 죽음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특히 부모님과 친구들) 모습을 보고, 그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며. 나 또한 다르지 않다. 병을 알게 된 이후 어떻게든 ‘내가 나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내 일상은 병 없이 설명될 수 없다. 천천히 걸어야 하는 것도, 지니고 다녀야 하는 산소캔도, 학교생활에서 벌어지는 온갖 열외 상황도, 잊을 만하면 상기시키듯 찾아오는 아픔도.
별생각 없이 영화를 보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영화를 그냥 보았는데, 부모가 울면서 헤이즐을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장면에서 나를 중환자실에 들여보내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 떠올려도 마음이 아릿하고 명치 언저리가 후벼 파이는 고통이 느껴지는 기억. 줄줄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 이 영화를 봐야 하지? 나는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지? 분명히 나와는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헤이즐처럼 병을 오래 앓지도 않았고 죽음을 가까이 느낄 만큼 위독한 상태도 아닌데.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거대한 슬픔’을 그대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해서일까? 나의 아픔을, 힘듦을 솔직하게 느끼지 않아서 벌을 받는 걸까?
30여 분 동안 헤어나올 수 없는 생각의 지옥에서 고문당하는 기분이었다. 영화를 끄는 것이 나약함에서 비롯된 현실을 회피하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피 행각처럼 느껴져서 차마 마우스를 움직여 영화를 멈추지도 못하고, 속에서 뜨거운 게 용솟음치는 감각을 느끼고만 있었다.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서 소리 높여 언니를 불렀다. 건넌방에서 TV를 보던 언니가 달려와 영화를 꺼줬다.
선생님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서 영화를 더 볼 필요는 없었다. 이후 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괴로웠는지, 왜 더는 못 보겠다고 생각한 시점에 바로 영화를 끄지 못했는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받아들이지 못할 현실도 아니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려 노력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모두 오만이었나보다.
병원 공감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이 이야기를 하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힘들어하는 것도, 힘든 것을 회피하려는 것도, 다시 바라보고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것도 모두 나라고. 새로운 말도 감동적인 위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했던 말인 것 같다. 병을 알게 된 뒤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 고통 말고 삶의 다른 부분을 보고 싶은 것도 모두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 그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신채윤 고1 학생
*‘노랑클로버’는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최후의 카드 쥔 이란…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맘대로 종전 힘들 것”

이탈리아 야구, ‘초호화 군단’ 미국 침몰시켰다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법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3천만원 과징금 취소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미, ‘이란 정권교체→군사력 약화’ 무게…종전 기준 낮춰 출구전략 찾나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