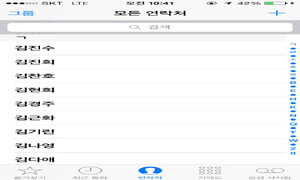2011 5. 안치웅 열사의 어머니 백옥심 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쉼터인 한울삶에서 아들의 초혼장에 쓸 수의와 영정을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3년 전 이맘때였다. 필시 인자할 것 같은 고운 얼굴의 어르신을 만났다. 달뜬 발걸음으로 동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들러, 오래전 주문해둔 듯한 무엇인가를 받아드셨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어르신은, 가져온 물건을 조심스레 펴 보였다. 수의였다. 주검도 거두지 못한 아들에게 입혀줄 수의. 주름진 눈가 위로, 굵은 눈물 줄기가 쏟아졌다. 가슴속 깊숙이 묻어두었을 통곡 소리에 사진기자 선배도, 나도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26년 전 이맘때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못했다.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의 일원이었던 그는 실종 당시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노모는 아들의 이름이나마 역사에 남기겠다며 초혼장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라는 인정을 받았기에 결심한 일이었다. 그마저도, 민주화운동 관련성 정도는 ‘50%’만 인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어르신을 만나기 몇 개월 전이었다. 당시 ‘핫’했던 우쿨렐레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다. 명랑 아이템을 찾아헤매던 시절이었다.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우쿨렐레 강좌에 가보니, 역시나 20~30대 여성들이 가득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수강생이 있었다. 40대 남성과 초등학생 여자아이였다. 알고 보니 둘은 부녀 관계. 그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여 아이 아빠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그로부터 1년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마감에 허덕이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사찰을 당했던 민간인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보였다. 2009년 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소속 대위가 집회 참여자들에게 붙잡힌다. 그의 소지품 중에는 동영상 자료도 있었는데, 민간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에는 숨진 이의 일상도 담겨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낯선 이름을 지닌 망자였으나,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집에 쌓아둔 취재수첩을 밤새워 찾았다. 우쿨렐레 강좌에서 만났던 그 아이 아빠였다. 사찰 피해 사실을 알고 난 뒤, 심적 고통이 심했다고 했다. 그가 세상을 등지고 3개월 뒤, 대법원은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민간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건 위법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왜 사찰을 당해야 했는지, 그 까닭을 국가는 여전히 알려주지 않는다.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다, 불현듯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이야기들. 사연 하나하나 책으로 엮어도 모자란 이야기들. 솜씨 없고 건조한 기사로 담아내기가 미안했던 이야기들.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의 순간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모두 다 나열하기도 힘든 대형 참사, 공권력 피해, 그리고 전쟁. 그 현장에 있던 이웃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두 차례나 ‘공천 미신청’ 오세훈…조건인 혁신 선대위 위원장 후보군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