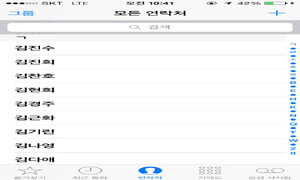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그게 과연 진실일까?”
선배가 물었다. 멍해졌다. 짐승 같던 수습기자 시절, 보고할 거리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경찰서를 헤집고 돌아다니던 밤이었다. 사람은 본디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왔다. 정부기관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안 돼요’ ‘싫어요’ 부정어를 남발했지만, 실상은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였다. 기자라는 직함을 얻게 된 2005년 겨울. 세상은 변했다. 문제적 수습에게 선배는 당부했다. “모든 걸 의심해라. 경찰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피의자를 만나 사정을 들어봐라.” 곧 의심쩍은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에 더 가까운 그것을 알기 위해, 바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수학여행 학생 전원 구조(사진).’ 세월호 참사 발생 첫날, 오보가 나왔다. 야근을 하던 중, 이러한 내용의 정부 발표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정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다. 해양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에 두루 확인을 했다면 다른 정황이 나왔을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했을까. 오보를 피할 수 있었을까. 수습 시절 키워진 의심의 촉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졌다. 정부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의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단 핑계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어느 날이었다. 누리꾼들이 올린 게시물이 많이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회의를 방청하러 갔다. 회의실엔 들어갈 수 없었다. 회의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창을 통해 회의 장면을 지켜봤다.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마이크를 거쳐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갑자기 스피커가 뚝 꺼졌다. 외부에 공개하기 민감한 내용이라며, 위원들 마음대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법률상 ‘민간독립기구’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논의 과정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감추기’는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국회에서도 일어난다. ‘중요한 안건’이 있는 국회 법안 심사소위는 비공개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조차, 회의록을 본인들이 먼저 열람한 뒤 공개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전화를 받는다. ‘밀실 행정’이라는 후진 단어는, 여전히 핫하다. 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시민더러 말조차 하지 말라는 정부다.
엑셀도 다룰 줄 모르는 정보기술(IT) 담당 기자였다. 블로거들만큼 전자제품이나 인터넷을 잘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시민들이 모든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세상. 기자로서 접하는 모든 정보를 세상에 내주는 일이라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거나, 취재를 제안하는 전자우편과 전화가 밀려들었다. 기자라는 이름이 다시금 무거워진다. AA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조희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박수현 비판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강혜경 “나경원과 오세훈 차이 좁히게 여론조사 조작” 재판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