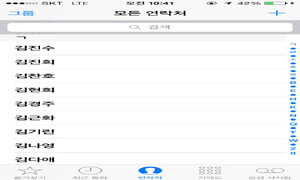한겨레 박미향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다. 너~무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대범한 결단을 종종 내린다. 대학생이 된 뒤 노느라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와.” 한밤중에 집에 오겠다고,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단 지론이었다. 외박 허용 조처는 이렇게 시행됐다. 멍석을 깔아줘도 놀 줄 모르는 자식이라는 걸 간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조신한 처자 양육의 상징 ‘통금 시간’은 우리 가족에겐 낯선 문화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는 관용어 또한 매우 낯설다. 미각에 조금씩 눈뜨던 일곱 살 무렵이었다. 친구네 집에서 를 보고 있던 기억이 난다. 늦은 점심으로 라면이 나오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면이란 음식엔,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국물도 파도 달걀도 있었다. 어머니가 제조한 라면은 수프 졸임면에 가까웠다. ‘라면 쇼크’ 이후 도시락 반찬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둔감했던 혀는 예민해졌다. 우리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니크한 반찬은 한둘이 아니었다. 반찬 투정을 늘어놓을 때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죄다 조미료 맛’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늘은 무슨 찌개를 끓일지, 모레는 무슨 반찬을 할지 너~무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손 또한 컸다. 찜통에선 카레가 제조됐다. 무심코 던진 ‘맛있다’는 말이 화근이었다. ‘왕손이 전법’의 전성기는 10년 전이었다. 거의 매일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곁들인 반찬은 상추와 김치. 여러 반찬을 식탁 위에 올리는 대신 ‘핫 아이템’ 하나로 승부했다. 요즘도 간혹 (포장 주문한) 전골 냄비만 식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가 많다. 그래도 ‘맛없으면 먹지 마!’ 강경 기조에, 반찬 투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신도 본인 요리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고3이 되자, 사먹는 반찬이 대폭 늘었다. 하이라이트는 수능 시험날이었다. 예민 지수가 한껏 높아지고, 소화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름난 가게의 전복죽이 공수됐다. 비몽사몽 잠에서 깼더니 따끈하게 데워진 죽이 눈앞에 있었다. 한 숟가락 크게 떠 입에 밀어넣었다. ‘우욱~!’ 목구멍이 턱 막혔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거대한 전복 조각들이 목에 걸려 있었다. 밖에서 사온 전복죽이 영 부실하다고 생각하셨나보다. 손수 손질한 전복을 이미 조리된 전복죽에 대거 투하해,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시었다. 한바탕 ‘토사곽란’을 벌인 뒤, 수능을 보러 갔다. 뉴스에서만 보던 ‘수험생 긴급 수송차’를 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1년 전 ‘효녀 코스프레’를 위한 모녀 여행에 나섰다, 사흘 밤 내내 잠을 설쳤다. 코 고는 소리 때문이었다. ‘우리 엄마가 코골이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너무 오랫동안 한방을 쓰지 않았던 탓이리라(이게 다, 외박 조처 때문이다). 캥거루 뱃가죽이 찢어질 정도로 무거우니, 새해엔 출가하라 성화지만. ‘찜통’ 카레라도, 오랫동안 집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AA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판사, ‘해외 골프 접대’로 500만원 벌금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이란 모지타바, 아버지의 ‘핵무기 금지 파트와’ 깨고 핵무기 가지나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문형배 “법왜곡죄, 국회 입법 존중해야…나도 고발 여러 번 당했다”

‘초등학교 폭격’ 난타 당한 트럼프…“이란에 토마호크 판 적 없는데 무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