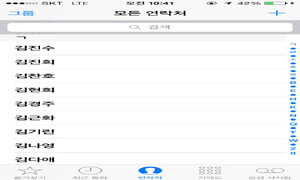청와대사진기자단
몇 주 전이었다. 절친 중 마지막 남은 싱글 H와 서울 이태원 거리를 걷고 있었다. ‘산뜻하고, 맑고, 깨끗한’ 얼굴을 지닌 청년이 주뼛주뼛 다가왔다. 무엇인가를 손에 꼭 쥐어주곤 수줍게 돌아섰다. 녀석, 부끄러워하기는. 청년이 준 건 연락처였다. 강남에서 24시간 성업 중이라는 호스트바 명함. 어느새 H도 같은 명함을 쥐고 있었다. 청년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가. 나이 들어 보였나. 할 일이 없어 보였나. 마흔 넘은 여자를 따라오는 사람은 ‘퍽치기’라더니(영화 ). 이제 연락처를 주는 남자는 호객꾼뿐이란 말인가.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청년을 쫓아가 이유를 캐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머릿속엔 늘 남들이 던진 말 한두 마디, 지나간 장면들이 부유한다. 단물이 나도록 곱씹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한다. 황금 연휴엔 우울한 세상사를 피하고 싶었다. 운전 가능한 H에게 빌붙었다. 목적지는 오직, 전북 전주였다. 왜? 이유는 없었다. 몇 주 전 ‘전주영화제 가자’던 말이 씨가 됐다. 영화표 예매? 못했다. 숙소 예약? 못했다. 연휴 둘쨋날, 전주행 기차표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고속도로엔 이미 차가 한가득이었다. 칩거가 취미이자 특기인 우리도 나왔으니, 온 국민이 다 나왔으리라.
5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전주엔 사람들이 넘쳐났다. 매의 눈을 가진 H는 영화제 티켓 교환 부스를 보자마자, 매물로 나온 영화표 두 장을 낚아챘다. 산뜻한 출발이었다. 가는 곳마다 족족 늘어선 기다란 대기줄도, 수많은 커플들도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어떻게 온 전주인가. 이대로 떠날 순 없었다. 어딘가, 하룻밤 쉴 곳이 있을 것 같았다.
운이 좋아 보게 된 영화는 ‘극’ 사실적이었다. ‘기어이 희망을 찾아내고야 만다’던 영화 소개글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나, 희망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대 위에 오른 감독은, 아직 영화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의 여행 역시 완전체가 아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빈방을 찾아 전주와 인근 익산·완주 지역 모텔에 전화를 돌리고 또 돌렸다. 빈방이 있을 거란 희망을 접기가 힘들었다.
판단이 빠른 H가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게 된 충남 계룡시엔 신축 모텔이 많았다. 전주에 대한 집착을 거두니, 새로운 동네가 눈에 들어왔다. 충남 부여로 향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북적이지 않는 도시는 평화로웠다. 삼천궁녀 전설에 대한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사소한 집착의 필요충분조건은 깨알 같은 기억력과 지속 가능한 행동력이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고, 귀찮은 일이 늘었다. 자연스레 집착 지속 기간은 줄었다. 이태원 청년의 해사했던 얼굴이 벌써 가물가물하다니.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AA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판사, ‘해외 골프 접대’로 500만원 벌금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327937719_20260310503420.jpg)
[단독]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문형배 “법왜곡죄, 국회 입법 존중해야…나도 고발 여러 번 당했다”

‘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억눌린 요구 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