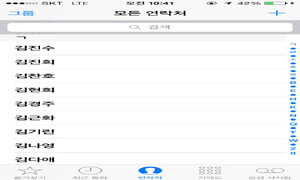한겨레 김정효
점잖던 존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잘 알아들을 순 없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난 듯했다. 기숙사로 돌아가 TV를 켜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이 나왔다. 2001년 9월11일. 영어를 배우겠다고 미국 뉴욕으로 향한 지 일주일 만에 9·11 테러가 발생했다.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위치한 맨해튼과는 1시간 거리였지만, 어쨌든 뉴욕은 뉴욕이었다.
학교에선 뉴욕을 떠나기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환불해주었다. 불과 열흘 전, 군 입대라도 할 듯 시끌시끌한 환송회를 한 터였다. 한국으로 돌아가기엔 비행기 삯이 비쌌고, 다른 지역의 새 학교를 찾기엔 영어가 짧았다. 스페인에서 온 S와 모델 뺨치는 외모의 러시아 출신 A 등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연이어 짐을 쌌다. 같은 반 학생 8명 가운데 5명이 한국인이었다. 나머지는 일본인 2명과 중국인 1명. 동아시아 3개국 사람들이 모여 미국에서 영어를 배웠다. 서울 종로의 파×× 학원 같았다.
뉴욕은 영어를 못해도 생존할 수 있는 도시였다. 어딜 가도 이민자가 많았다. 유창한 영어 대신 손짓 발짓이면 충분했다. 철은 없어도 외화 비싼 건 알았다. 한마디라도 더 배우자. 한국어만큼은 절대 쓰지 않겠노라. 긴긴 겨울밤이 찾아들었다. 누군가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금단의 열매를 들여왔다. 버터왕자 성시경이 나오던 , 유재석이 철가방을 들고 퀴즈를 내던 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였다. 한국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개그는 눈물 나도록 웃겼다. 다음회 녹화분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목놓아 기다렸다.
이듬해 봄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화 낭비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밀려들었다. 이마엔 여드름이 창궐했다. 결국 엄마 몰래 종로 파×× 학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입사를 위한 토익 점수가 만들어졌다.
“제럴드 섀튼(사진)이 한국에 왔다는 말이 있어. 확인해봐.” 섀튼은 에 게재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선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 전화를 돌렸다. 한 호텔에서 제럴드 섀튼이라는 미국인이 숙박자 명단에 있다고 했다. 호텔로 튀어갔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머릿속은 영단어로 뒤죽박죽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작 호텔엔 섀튼이 없었다. 물론 제럴드가 있긴 했다. 제럴드 S. A. 페레즈라는 사람이었다. 호텔 직원은 ‘제럴드 S’를 보고 제럴드 섀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제럴드 S. A. 페레즈는 당시 괌 관광청장이었다. 외국인을 찾을 때는 ‘풀네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직접 소통’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달한다.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지 못해 답답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 걸어 갑갑하다. 아무 준비 없이 돌아다니다 낯선 곳에서 길도 잃고 돈도 잃은 2014년 2월. 정말로, 배워야 사는구나. 반 칠순에 알았다. AA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229672236_20250113500160.jpg)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빛의 혁명, 민주적 회복력 본보기”

이정현, 오세훈에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 있어도 공천 기강 세울 것”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중동 상황 최악까지 염두”

주호영 “대구서도 국힘 꼴 보기 싫다고”…윤상현 “TK 자민련 될라”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세금 안 아까운 서울 만들겠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유해를 쓰레기 속에 방치…국가 수습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