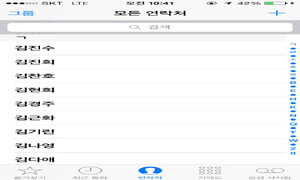1
주입식 교육을 17.5년 동안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칼럼, 너~무 부담스럽다. 중국집 배달원이 현관문 벨을 누를 때도 음식 받으러 나가기를 서로 미루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 전원 A형으로 구성된, AO도 아닌 AA형의 소심한 혈족. 지난 9월 어느 날, 이런 명을 받았다. “이름을 가려줄 테니 ‘웃긴’ 칼럼을 쓰거라.” 불면이 동반되는 소심경보 1호 발동.
인생 최대의 소심경보가 울린 건 2000년대 중반 어느 날이었다. 드라마 의 이신영처럼 삽질 삽질 개삽질을 해도 결국 ‘좝’과 짝을 찾는 데 성공한 ‘여기자’가 될 줄 알았던 시절이었다. 입사 뒤, 짐승 수(獸)자를 쓴다는 수습 생활을 앞두고 있었다. “뭐라~. 설명하기는 그렇고, 한번 해봐”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선배들 앞에서 쭈구리가 돼갔다. 경찰서에서 자고 먹으며, 사건을 취재하라는데. 언제 경찰서에 가볼 일이 있었어야 말이지. 온몸으로 부딪쳐 느끼는 삶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은 드라마와 책뿐이다.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란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 국내 최대 ㄱ문고 구석에서 찾아낸 . CBS 보도국 ‘경찰팀’이 저자였다. ‘형사계에서 당직사건 처리부를 열람하라!’ ‘강력반을 주시하라!’ ‘책상은 가급적 뒤져라!’ 책 속엔 깨알 같은 행동 지침이 있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새벽 4시, 강변북로를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영등포경찰서 앞. 유난히 낯설었던 한겨울 찬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책에서 본 대로, 형사계 입구엔 ‘형사 당직 데스크’ 자리가 있었다.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다. 밤샘 근무를 한 경찰 ‘형님’들은 무심하고 시크했다. 주뼛주뼛 명함은 돌렸지만, 말 걸기는 뻘쭘했다. 믿을 건, 사건 내용이 정리돼 있다는 ‘당직사건 처리부’뿐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아, 그거?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지. 당직사건 처리부 없어졌어~.” 그렇다. 나는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 기자였던 것이다.
형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건 하나만 알려달라고 읍소하는 요령조차 알지 못했던 신출내기 수습이기도 했다. “보고해.” 휴대전화 너머 추상같은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 말이 없었다. 60초 사이에 그렇게 다양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다. 아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초판 발행일은 1999년. 이건 뭐, 88년생들에게 ‘굴렁쇠 소년’ 소개해준 격이랄까.
당직사건 처리부 실종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습 생활 3개월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다. 인생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건만. 선 발 동동, 후 삽질은 여전히 취미이자 특기다. 훌륭한 기사, 빠른 눈치, 깍듯한 의전, 불타는 로맨스를 그저 탐하기만 해온 어느 직딩 싱글녀의 생존기. ‘필자 망나니’ 편집장 손에 잘릴지도 모를 일이니. 2주 뒤에 만나요, 제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2관왕’ 김길리, ‘설상 종목 첫 금’ 최가온 제치고 한국 선수단 MVP 올라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