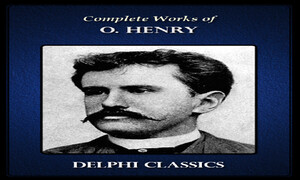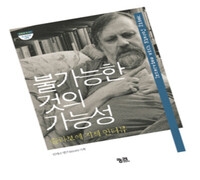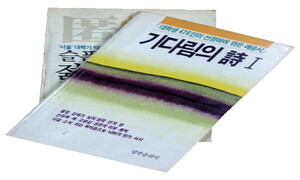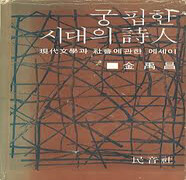1
이런 전화를 종종 받는다. “외주로 교정·교열을 보던 책이 있었는데, 출간이 엎 어졌어. 그런데 책이 나온 게 아니니 비용을 다 줄 수 없대!” 멀쩡한 출판사에서 편집장까지 지낸 베테랑 선배가 이같은 하소연을 하면, ‘어쩔…’이라는 반응밖에 안 나오지만 곧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럴 때 뭐라 하겠는가. “그러게 왜 계약서 안 썼냐고!”
일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써라. 아니면 전자우편으로라도 작업비를 먼저 확인해 라. 그 이유는 상대를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다. 악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돈이 오가는 일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황희 정승처럼 ‘너도 옳다, 쟤도 옳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계약서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이에 갑이든 을이든 얼굴 없는 주체로 올라 가면 오히려 친분보다 더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온 나라에 갑을 논쟁이 번지는 것을 보면 얼떨떨하다. 우리 사회가 ‘갑을 관계’라는 프레임에 빨리 감정이입하는 이유는, 일의 협력 관계가 주종 관 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을’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을’도 못 되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는 출판계에 들어오기 전 방송사 보조작가로 일했던 경험이 한몫한 다.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사람들과 멋지게 일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고단했 다. 새삼 ‘뭐 같은’ 조건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나는 6개 월 넘게 일하면서, 일하는 기간과 보수를 얼마 받겠 다는 걸 귀로만 듣고 덜컥 일했던 것이다. 마지막 2주 는 결국 그나마 못 받았는데 ‘왜 처리가 안 되냐’며 담당 PD가 관련 부서와 대판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나왔다. 챙겨주는 것도 달갑지 않았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을’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모 정당에서 이라는 책을 낸 걸 보며 트집을 잡고 싶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노동의 이름에는 아니 그러더니, 청년 실 업 같은 잉여의 이름에는 아니 그러더니, 웬일인가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고 이렇게 빨리 나서다니요? 을의 상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데, 그 전에 없던 상처들이 갑자기 생겨났나요?
사실 이 논쟁 앞에는 나부터 정신이 바짝 곤두선다. 출판사가 갑이 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출판계는 단군 이래 불황이 아닌 적이 없고, 이 업계가 워낙 좁으니 오죽하겠나. 그래서 을이어서 속상했던 일을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신입 에디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갑질’을 하는 누군가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다가, 윗선으 로 말이 들어가서 내 위의 상사들이 줄줄이 불려갔다. 덜덜 떨고 있는 나에게, 자 리로 돌아온 팀장님이 이랬다. “괜찮아. 다들 잘했다 그러시더라.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마라. 유들유들하게 해야지. 네 속만 상한다.” 그때 내가 이런 책을 읽었으 면 좋았을 텐데. 류동민 교수의 .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해당될 중대한 내용”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29577243_20260222502024.jpg)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노시환, 한화와 최대 ‘11년 307억원’ 계약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64410097_20260222502174.jpg)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7735175_20260222502090.jpg)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태진아 이어 이재용 ‘윤어게인 콘서트’ 퇴짜…전한길 “이재명 눈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