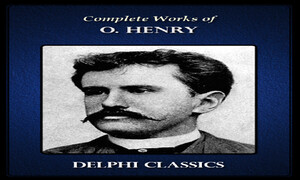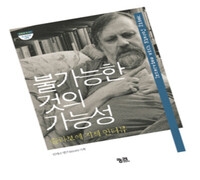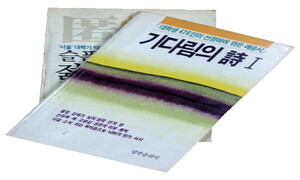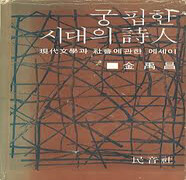당대비평
책 만드는 편집자들은 작가 스티븐 킹을 편애한다. 그가 “글쓰기는 인간의 일, 편집은 신(神)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게도 ‘신의 한 수’를 가르쳐준 분이 많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내공이라면 단연 이분이다. 민중신학자로 존경받는 한백 교회의 김진호 목사님.
한때 ‘당대’를 (여러 의미에서) 휘저었던 모 계간지에서 이분을 ‘주간님’으로 모시고 첫 출판을 시작했다. (이분의 인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린다.) 많은 것이 놀라운 분이지만, 무엇보다 연옥의 숱한 단계만큼 별난 필자들을 대할 때의 한결같음이라니.
편집자는 기본적으로 저자한테서 원고를 뺏어오는 사람이다. 받아낼 것이 있는자는 머리와 허리가 낮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기 어디 쉬운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괜히 하나.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다. 그러나 이분은 달랐다. “목사님, 아니 주간님은 어찌 그렇게 잘 참으세요?” 겸손한 대답이 돌아온다. “내가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그 눈에서 반짝이는 장난기를 알아채야 했는데….
얼마 뒤, 30여 개나 되는 글들을 한꺼번에 넘겨야 하는 마감 시즌이었다. 이 난리 통에 주간님이 원고 하나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셨다. “이 논문 어떻던가요?” (내가 맞춤법은 잘 틀려도 눈치는 빨랐다.) “논리가 다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수정을?” “그래요, 내가 메일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날, 주간님이 봐달라 뽑아오신 메일은 A4 3페이지. 수정을 부탁하는 무례함에 대한 설명만 1페이지. ‘이건 연애 편지네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마감 때는 농담도 독이다. “이대로만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 간곡함의 응답은 이렇게 왔다. 다음날 필자가 진노해 보내온 항변만 A4 4페이지. (그 시간에 원고나 고쳐주시지.) 이번에는 전화다. 30분? 1시간? 주간님이 미소를 띠며 문을 열고 나오신다. “보경씨,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대답 없이 서 있는 내게 주간님이 퇴근하시며 말씀하셨다. “잘될 거예요.” 다음날 출근하니 주간님이 필자에게 다시 보낼 ‘원고 수정 방향’이라며 내놓으신다. 이번에는 A4 7페이지. (그냥 직접 쓰시지! 오늘은 인쇄 들어가야 해요! 이미 보도자료 다 보냈어요! 왜 맨날 다른 계간지보다 우리만 출간이 늦냐고요.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산다고요!)
이후 과정은 생략하겠다. 그 계절에 우리는 항상 그랬듯 대한민국 계간지 중 가장 늦게 출간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로 편집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좋은 편집자는 직접 고치지 않는다. 저자를 끊임없이 괴롭힐 뿐, 미소띤 친절한 얼굴로. 주간님 아니 목사님, 그 가르침 덕에 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쯤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나요?
*‘김보경의 좌충우돌 에디팅’은 코믹하고 아찔한 출판사 편집자의 경험담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조희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박수현 비판

코스피 ‘역대 최대’ 폭락 -12.06%…9·11 테러보다 큰 충격파

대구서 높이 20m 천공기 사거리로 쓰러져…3명 부상

트럼프 뜻대로 안되는 ‘포스트 하메네이’…“점찍어둔 인물들 사망”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싸고 감싸니 냄새 나지요 [그림판] 싸고 감싸니 냄새 나지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3/20260303503624.jpg)
싸고 감싸니 냄새 나지요 [그림판]

법원노조 “조희대 사퇴하라…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뺏으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