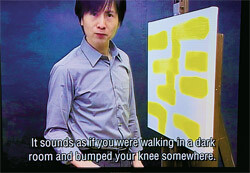뭉크, <불안>(1894)
지난여름 덴마크에서 낯선 다리 위를 친구와 걷고 있었다. 갑자기 친구의 코에서 새빨간 피가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수건도 휴지도 없던 우리는 인주처럼 땅바닥에 꾸욱 도장을 찍는 피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꺼내 닦을 수 있는 천이라고는 양말뿐이었다. 인어공주 동상을 보러 가자던 씩씩한 친구였는데 하필 다리 한가운데에서 피범벅이 되다니.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뭉크는 왜 이 사람들을 다리 위에 올려놓았을까. 1894년 에드바르 뭉크가 그린 (Anxiety, 1894)은 외계인처럼 눈동자 아래가 퀭하게 시들해진 군중의 일부를 다리 위에 데려다놓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미술품 중 하나인 (1893)를 그린 바로 이듬해 을 그렸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은 뭉크의 또 다른 작품 속의 사람들과 빼닮았다. 표정과 생김새, 옷차림은 물론 서로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향한 포즈도 같다. 뭉크는 노르웨이 오슬로시 번화가인 카를요한의 저녁 거리에 서게 했던 인물들을 쏙 빼다가 의 남자가 서 있던 ‘다리’ 위로 옮겨놓았다. 그 뒤로 주황색 하늘이 펼쳐진다.
왜 다리일까. 뭉크가 궁금했던 것은 절규의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다리 위를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이끈 어떤 ‘순간’이었다. 뭉크는 친구들과 함께 오슬로 외곽 노르드스트란의 다리를 지나던 ‘체험’을 들려준다. “나는 친구들과 걷고 있었다. 그때 해가 졌고 하늘은 갑자기 핏빛으로 물들었다. 죽을 것처럼 지친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 멈춰 섰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 너머로 구름이 불길에서 날름거리듯 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하여 걸어갔으나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자연의 절규를 느꼈다.”(
다리 위의 군중은 뒤의 이글거리는 풍광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의 배경이던 다리 끝에는 정신병원과 도살장이 있었다고 한다. ‘다리’는 뭉크가 온몸으로 경험한 가장 잔인한 장소였다. 4·11 총선 개표 방송에서 득표율에 따라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 변하는 개표 사무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껏 절규하지도 못하는 불안한 표정들이 이 그림 속 인물들을 생각나게 했다.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미 건국 250주년 축하금 내라”…트럼프 외교관들 주재국 기업 압박

이 대통령 설에도 SNS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제대로 된 세상 만드는 것”

‘사형 구형’ 윤석열, ‘운명의 19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매장과 화장 사이…육신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윤상현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민주 “과거 본인 행동부터”

김정은 부녀, ‘평양 아파트’ 준공식 참석 “휼륭한 집에서 복락 누리시길”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업무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

노모 집 찾은 ‘주택 6채’ 장동혁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