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성, <여름 실내에서>, 1930. 그림 덕수궁미술관 제공
이인성(1912~50) 탄생 100돌 기념 전시를 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눈 감은 자화상이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했을 그가 눈을 꼭 감은 채로 자신을 그려넣은 건, 언제가 팀 버튼의 만화책에서 본 눈알을 물가에 잠시 빼놓고 쉴 시간을 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종일관 어두운 담색 기운의 전시장에서 화사한 색감과 밝은 빛을 발하던 수채화 (1934)였다. 실외와 완벽하게 차단된 일종의 소규모 유토피아 같은 실내가 그림 안에 펼쳐져 있었다.
작가는 대구 화단을 떠나 일본 유학 시절 이 그림을 그렸다. 당시 일본 화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에서 유입된 수채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실내를 그리는 데 몰두했다. 도 비 오는 밖이 아닌 실내를 그렸고, 창문에 반사된 외부의 근사한 풍경은 작가의 상상으로 그려넣었다. 실외의 빛을 한껏 받아 붉게 빛나는 실내엔 탁자와 의자, 녹색 식물과 소품이 놓여 있다. 하늘거리는 레이스 탁자보와 의자에 놓인 쿠션, 빛에 반사된 식물들은 프랑스 파리의 마티스와 보나르가 솜씨를 뽐내며 그렸던 대상들이다. 조선의 공기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 이국적인 색채 감각은 “1930년대 조선 향토색을 그림에 그려넣겠다”고 장담했던 이인성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인성은 빛으로 가득한 실내에서 어떤 실외를 보았을까. 그에게 실내는 예찬의 대상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공기가 아닌, 작업 도구와 그림이 쌓여 있는 실내는 그에게 보고 싶은 세계로 직구를 던질 수 있는 허락된 자유의 공간이었던 것 같다. 1935년 대구로 돌아온 작가는 장인이 운영하던 병원 3층에 자기만의 아틀리에를 갖게 됐고, 이 실내 풍경 또한 놓치지 않았다. 대구 아틀리에를 그린 (1935)는 와 유사한 색감과 구도를 보인다. 3층 작업실에선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작가는 눈 감고 몽상하듯 평화로운 외부 풍경을 상상해 그렸다.
작가에게 실내 작업실은 무척 귀한 공간이었다. 1950년 2월 이인성이 쓴 수필 엔 그의 내부 공간인 작업실을 그리는 마음이 절절하다. “나의 생명인 화실을 버리고 서울에 와서 강짠지와 동탯국을 먹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이다. 흰 벽을 보지 못하니 마음이 괴롭고 자유를 빼앗긴 자와 같다.” 작가는 외부와 차단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벽을 끝없이 바랐다. 2012년 8월 새로 지은 흉물스러운 서울시청과 쌍용차 분향소를 ‘외부’로 둔 덕수궁미술관의 이인성 전시는 26일이면 폐막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훈장 거부’ 전직 교사, 이 대통령 훈장 받고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082363583_20260302500278.jpg)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김정은 이란 공습에도 시멘트공장 공개 방문…“투쟁공적은 영웅적”

싱가포르 ‘이재명·김혜경 난초’로 환영…이 대통령 “정말로 영광”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그냥 한동훈’ 무소속 출마하나…최악 시나리오는 보수 분열→민주당 당선

나이 들어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란 최소 200명 사망…CNN “보복으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트럼프 “이란 새 지도부 요청으로 대화할 것”...군사·외교 투트랙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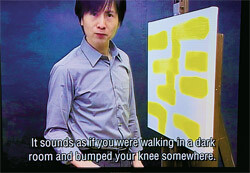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2031912989_20260227501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