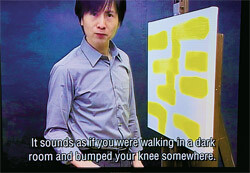관훈갤러리 제공
택시 안에서 눈이 잠깐 마주치면 질문이 잽처럼 날아온다. 누가 될 것 같나요? 낯선 이들과 요즘처럼 짧고 굵은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다. 질문에 이미 굳은살 박인 답이 담긴 경우도 있지만 정말 투명한 눈으로 이 난항을 함께 풀어보자는 제스처도 간혹 느낀다. 누구나 많은 질문을 품고 살겠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근래처럼 이렇게 많은 질문의 소용돌이 속에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을까. 질문과 여론조사가 막대그래프를 그리는 사이 로켓이 발사됐고 위험천만 충돌할 뻔했던 소행성은 지구를 비껴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누가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았을까.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질문의 시대를 살았다. 베를린에서 자라는 식물이 왜 남아메리카에서는 자라지 않을까 궁금했던 어린 훔볼트는 자라 기후와 지리, 식물분포 등에 관한 의문을 세련된 형태로 다듬으며 당시(1802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지던 페루의 침보라소 화산에도 올랐다. 의문투성이였던 제 삶을 회고할 무렵 그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질문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알고 끌어안고 싶은 바람을 어쩌란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인 주재환의 개인전이 열리는 관훈갤러리(12월25일까지) 전시장은 질문의 장소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현실과 연결된 작가의 질문은 주위를 끌어안기보다는 주위를 벗어나 주변 상하좌우를 돌아보게 한다. 작가의 질문 펀치는 웃음기를 띤 사약처럼 섬뜩하다. ‘사약을 마실 자 100인을 선정한다면?’ ‘전세계에 이런 시장이 100명이 있다면’처럼 실제 의문형 문장이 담긴 작업을 비롯해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을 비닐봉지, 신문지, 스티커 같은 자질구레한 일상 재료를 통해 불확실하고도 알 수 없는 오브제로 형상화한다.
어린 시절에는 ‘나는 왜 나일까’라는 물음이 흔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질문을 던지는 일은 ‘상황’과 ‘기질’에 기인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빗대보면 주재환 작가는 질문의 상황과 기질을 서로 ‘크로스’시키며 해답 없는 질문들을 향해 질주한다. 신문과 책 등을 통해 작가가 발굴한 현실의 암울한 ‘상황’들은 천진한 물음표의 껍질을 빌려 가벼운 기질의 공중으로 부유한다. 작가의 호기심은 끝없이 다른 몸을 갈아입으며 편집된다. 그는 작가노트에 “이것들의 생김새는 들쑥날쑥하지만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내가 겪어온 잡다한 정신타격을 제거하는 소염제”라고 적었다. ‘나는 안다’는 확신의 풍요 속에서 물음표는 가난하지만 고귀하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