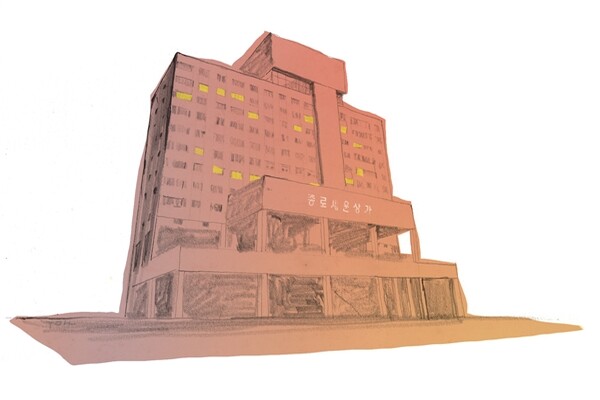서울에서 태어난 내 또래의 남자들에게 세운상가는 그저 전자상가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세운상가의 데크를 걸어가노라면 어딘가에서 낯선 아저씨들이 불쑥 나타나 우리 중 가장 돈 많아 보이는 친구를 상가의 어두운 미로 속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얼마 있다 불법 음반과 비디오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우리에게 세운상가는 사춘기의 설렘이 스며든 가상공간이었다. 음침한 토끼굴의 끝에 욕망의 보고를 숨긴 원더랜드였다. 오죽하면 유하 시인은 이라는 시집을 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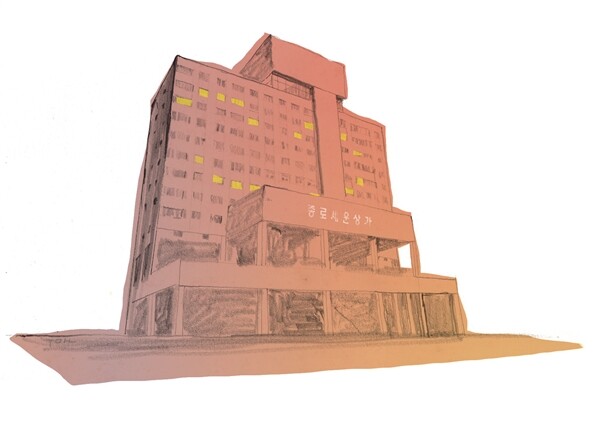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세운상가는 몰락의 분위기가 완연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상가 벽면은 흉터처럼 벌어져 남루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많은 점포들은 폐점했고 데크의 크고 작은 가건물들에는 철거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최첨단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속절없이 늙고, 대책 없이 패배해버린 신화 속 거인의 초라한 여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다.
어느 날 친구가 영상 작업을 하겠다며 나에게 촬영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물었다. 작업의 콘셉트는 서울 거리에서 요가하기였다. 현대 도시를 무대로 삼아 요가를 하면서 낯선 시공간을 만들고 체험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몰락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친구의 요가 자세를 떠올리며 세운상가가 어떻겠냐고 답했다.
친구의 촬영에 동참하면서 나는 세운상가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 몰락의 이미지 속에서 몰락을 살아내는 장본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친구는 맘에 드는 점포가 있으면 무작정 안에 들어가 물었다. “여기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나는 그때마다 그 안의 사람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쾌한 얼굴로 우리를 쫓아내면 어쩌나 싶어 내심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기꺼이 촬영을 허락했다. 친구가 점포 안팎에서 난해한 요가 자세를 취하거나, 망연히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심지어 기계를 기웃거리고 만지작거릴 때조차 개의치 않았다.
어떤 아저씨는 친구의 고난도 요가 자세를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꽤 오랜 시간 촬영을 한 공업소의 주인 아주머니는 애썼다며 우리에게 요구르트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들은 웃으며 농을 건네기도 했다. “우리는 모델료 안 줘?” 차가운 기계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노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고 따뜻했다.
나는 최근 만난 어느 오래된 카페의 주인이 떠올랐다. 그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젊은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의 부상으로 손님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젖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나는 너무 지쳤어요.”
세운상가 사람들의 에너지는 조금 달랐다. 그들 또한 온라인 시장의 부상으로 매출이 줄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거래해온 단골들, 그들의 꼼꼼한 손기술과 농익은 노하우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성공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능력과 수완이 좋으면 얼마간의 성취와 자존감을 보장해주는 시장, 이른바 소량생산 소량소비의 시장이 있었다. 극심한 경쟁이 없기에 그들은 옆 점포의 사람들과 기계와 인생에 대해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 심지어 난생처음 보는 이방인 예술가를 환대할 여유도 있었다.
세운상가는 욕망에 들뜬 사춘기를 지나 초라하지만 풍모 있는 말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늙는다면 세운상가의 사람들처럼 나이 들고 싶다. 서서히 몰락해가는 작은 산업의 늙은 장인들처럼 노년을 살고 싶다. 문제는 과연 그런 말년을 허락해줄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냐이리라.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253337001_20260304503536.jpg)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