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이쪽을 밟으면 살고 저쪽을 밟으면 죽는 곳이 있다. 지옥이 아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2023년 한 해 산재 사망자는 2016명. 그중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수는 356명이다. 이곳에선 하루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는다. “350여 명이면 참사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 죽음에 이름 붙이지 않는다.
작은 기록팀(싸람)에 함께하고 있다. 기록자도 몇 안 된다. 모임 규모만큼이나 취재하는 대상도 작다. 사람들 발길도, 언론사 카메라도 잘 오지 않는 ‘작은 싸움’을 기록하고자 모였다. 싸람 기록자들은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함께할 작은 곳을 찾는다. 2025년 나는 흔한 죽음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죽음이 흔할 정도로 빈번하다면 참혹함의 크기를 잴 수 없을 텐데, 작기만 한 죽음이 있다. “그런 죽음 있잖아요. 공사장 사고 같은.”
특별한 것 없어 눈길이 머물지 않는 죽음. 그곳에는 아까운 죽음도, 내 일 같은 죽음도 없다. 그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뿐이다. 기록을 마음먹은 건 문혜연씨를 알게 된 후다. 법원 앞에서 자신만 한 손팻말을 들고 선 그를 보았다.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다.
얼마나 ‘작은’ 사건인지 기사를 찾기도 힘들었다. 한 시민단체(노동건강연대)가 그해 일어난 산재사고를 정리해놓은 글에서 그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요약된 죽음은 이러했다.
‘2024년 1월22일 사고/ 서울시 마포구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이는 434명. 2018년엔 390명, 2023년엔 356명. 사고 사망이 줄었다고 했다. 이 숫자로는 그해 건설 현장의 규모(대비 사망률)나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없다만, 그래도 수가 줄었다니 안도했다. 너무 쉬운 안도였다. 열 명이건 천 명이건 세상을 떠난 이는 그 사람, 단 한 명이다.
“저에겐 피켓을 드는 일이 아버지를 애도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겐 남겨진 사람이 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안전모 하나면 가능했다. 사고 직후, 인우종합건설은 안전모를 지급했다는 거짓 서명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 사실은 법정에서도 밝혀진다. 건설사의 잘못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유족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건설사에 부과되는 몇백만원짜리 벌금, 집행유예 수준의 적은 형량. 이것이 지금껏 ‘흔한’ 죽음의 결론이었다. 선고 재판을 앞두고 혜연씨는 휴직했다. 경기 수원에서 서울까지 1인시위를 하러 온다.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아니어도 세상은 달라질 거니까요. 그렇지만 사법부에 ‘우리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 고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알리고 싶어 1인시위를 하고 있어요.”
선고를 기다리며 나 또한 그를 애도한다. 내 방식대로. 생일 축하를 건네듯이.
“사람들이 매년 생일을 축하하는 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잘 까먹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기억해줘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라는 눈빛으로.”(‘밤 그네’, 하명희)
삶이 소중하다는 걸 옆에서 기억해줘야 한다. 흔한 죽음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이 사람들에게 닿을 때면 법원 앞에 문혜연씨는 없다. 건설노동자 문유식의 산재 사망에 관한 선고 재판은 2025년 1월23일에 열렸다. 판결 소식을 들은 사람은 드물 테다. 흔한 소식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흔한 죽음은 없는데도. 내가 알고 또 알지 못하는 모든 죽음을 애도한다.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 CCTV에 ‘찰칵’…성추행 의혹도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권 강탈”…당내선 ‘선거 포기했나’

‘트럼프 관세’ 90%, 돌고돌아 결국 미국인이 냈다

앞뒤 다 비워…윤석열 ‘황제 접견’, 재구속 이후 278차례

“죄 많은 제게…” 구치소 김건희, 손편지로 지지자에게 답장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제발 정부가 나서달라”

국힘 윤리위, 친한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단독] ‘직무배제’ 강동길 해군총장, 내란 때 “계엄 상황실 구성” 지시 [단독] ‘직무배제’ 강동길 해군총장, 내란 때 “계엄 상황실 구성” 지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3/53_17709651726347_20260213501917.jpg)
[단독] ‘직무배제’ 강동길 해군총장, 내란 때 “계엄 상황실 구성” 지시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박근혜 오른팔’ 이정현,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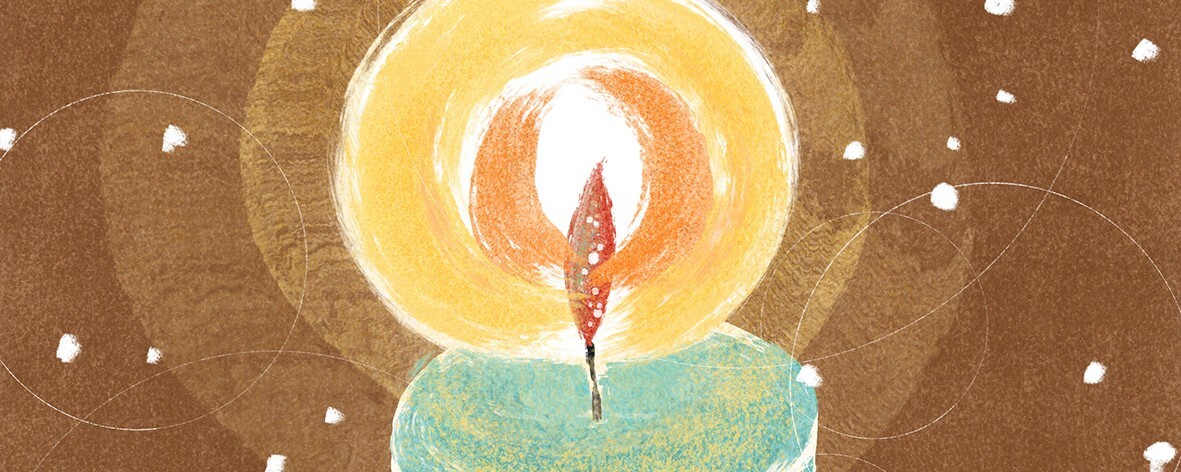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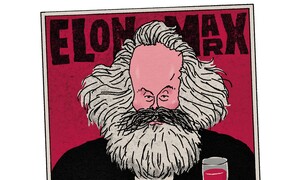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767345627_202602125028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