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시각장애자국제협력협회’(ICA)를 이끄는 한인 시각장애인 김치헌(67)씨를 케냐에서 만난 건 우연이었다. 지난 7월21일 케냐 나이로비로 출장 갔을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김씨도 묵고 있었다.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는 ‘일본인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인사하고 보니 남성은 22살 때 일본으로 유학 간 한국인이고, 여성은 그와 동행한 협회 직원이었다. 아프리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가르쳐온 김씨는 18년간 나이로비를 20여 차례 방문했다. 이번에는 치료원을 개설하려고 나이로비를 찾았다.
“자욱한 하얀 김을 토하는 증기기관차, 새벽녘에 가족과 역을 향해 걸었다. 열차에 오르자 부모님이 창문으로 아이스캔디를 사주셨다. 네모난 판을 어깨에 멘 장수는 거스름돈을 꺼내 건넸다.” 1950년 4살이던 김치헌씨는 목포역에서 기차를 탔던 장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날 광주의 집으로 돌아와 그는 고열을 앓았다. 천연두였다. 40일간 투병 끝에 시력을 잃었다.

“유학은 당신 같은 고졸 맹인이 가는 게 아니다”
국립 서울맹인학교를 졸업하기 한 해 전인 1967년, 김씨는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시각장애인의 자립률이 가장 높은 일본을 가보자. 무언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훌쩍 떠나는 걸 좋아하는 그의 성격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당시는 시각장애인이 비자를 받아 일본을 간다는 게 예삿일이 아니었다. ‘국가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심신장애인은 비자를 각하할 수 있다’고 일본 출입국관리령에 적혀 있던 시절이다. 일본 대사관의 반응도 싸늘했다. “일본 유학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연구를 위해 가는 거지, 당신처럼 고졸에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김씨를 초청하겠다는 재일동포 손순오씨 부부를 만났고, 1968년 4월 일본 땅을 밟았다. 지바현립맹학교에 입학해 일본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뜸질로 병을 고치는 사람) 면허를 취득한 뒤 그는 1971년 치료원을 열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다. 두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며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져리게 느꼈다고 김씨는 말했다.
“아이는 자주 그림책을 가져와 내 손을 잡고 동물이 있는 곳을 짚으며 물었다. ‘아빠, 이게 뭐야?’ 내게는 평평한 종이일 뿐이었다. 대답할 수 없는 한심한 아버지, 정말 괴로웠다. 아이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손을 그림책 위에 놓으며 질문한 거였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정을 꾸리고 안마사로 일하면서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시각장애인은 보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눈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와코대학에서 공부하며 김씨는 ‘아시아 맹인 실태’를 조사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각장애인과 무릎을 맞댔다.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많은 사람이 물었다.
은혜 갚을 차례가 왔음을 김씨는 직감했다. “A씨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A씨에게 갚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도 충분히 A씨에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닐까.” 그가 터득한 ‘보은론’을 실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인재들이 길을 못 찾자 다시…
우선 사회복지법인 ‘국제시각장애자원호협회’(ICB)를 설립해 장학제도를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학 안내는 물론이고, 일본에 도착한 뒤 3∼6개월간 언어·문화 등을 가르치고 안마·침 기술을 전수했다. 안마와 침을 교육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료하다. “시각장애인은 촉각이 민감해 안마와 침을 배우기에 적합하다. 또 소자본으로 개업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안마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안마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고맙다’는 말만 해야 했던 시각장애인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안마사와 침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ICB는 2001년까지 시각장애인 50명을 초청했다. 네팔,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수단, 케냐 등 13개국을 직접 찾아가 면접하고 뽑은 인재들이었다.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지도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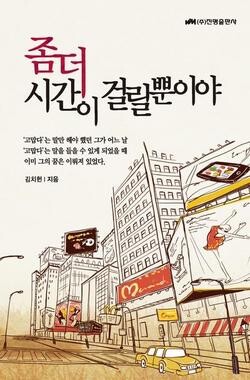
시각장애인 김치헌의 ‘좀더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하지만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했다. 안마치료가 낯설고 전문 치료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 치료원을 세우고 안마·침 기술 강습회를 현지에서 열려고 김씨는 2001년 아이카를 새로 창립했다.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일본에서 4년간 유학한 시각장애인 2명이 치료원을 운영했고, 그 뒤 이들은 개업해 자립하는 데 성공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일본 안마사 자격증을 딴 케냐인 필리고나 아촐라도 1999년 도움을 요청했다. “케냐에는 유럽식 오일마사지가 있지만 일본식 안마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로비에서 안마 시연회를 열어주세요.” 김씨는 그해 10월과 2002년 11월 일본 대사관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안마·침 시연회를 열었다.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자이카)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2004년 자이카의 민간기술협력사업으로 선정돼 케냐의 시각장애인 10명을 교육하게 됐다.
케냐 각지에서 몰려든 지원자 가운데 고졸 출신의 20∼26살 남성 2명과 여성 8명을 뽑았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참석할 정도로 수강생들은 열성적이었다. 밤늦게까지 복습과 예습을 거듭하고, 일본어까지 눈에 띄게 늘었다. 그 전에는 일이 없어 집에서 그저 놀기만 했던 이들이다.
혼자 어디든 가는 자신감을 위해
교육이 끝난 뒤 모두 자립했다. 베아트리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나이로비에서 500km나 떨어진 지방에서 참여한 순박한 여성이었다. 교육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니와 함께 나이로비 생활을 시작했다. “안마를 해서 돈을 벌게 돼, 그 돈으로 휴대전화를 샀어요. 지금은 버스를 갈아타고 어디든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김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것, 그리고 혼자 어디든지 갈 만큼 자신감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지향하던 자립이다.” 아프리카 시각장애인의 미래, 자신감을 지원하려고 김씨는 오늘도 길 없는 길을 열고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75명 폭사에 “이란 소행”…증거는 제시 안해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말 바꾼 트럼프 “쿠르드 ‘이란 들어갈 의지'…나는 거절”

인천 빌라촌 쓰레기 봉투서 ‘5만원권 5백장’…주인 오리무중




![[만인보]강용주의 독감예방접종](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resize/2012/1116/135296586745_201211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