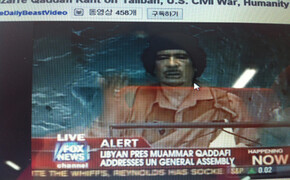바코드는 사물의 문신 같은 걸까, 아니면 지도? 며칠 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너의 바코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 궁금해졌어. 몸에 바코드가 있고 그걸 인식하면 너의 비밀, 속마음 뭐 이런 게 나올까 싶은 거야. 바코드가 궁금한 미래를 알려준다면 내가 지난주처럼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 텐데.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바코드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어. 그 뒤 습관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사물의 바코드를 들이대고 찍어. 희한하지. 그러면 그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야. 사진을 찍듯이 홈쇼핑 화면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호기심이 다른 세계로 연동되는 거야. 지난 일요일에는 하루에 내가 몇 개의 바코드 이미지를 만날까 손가락으로 세어볼 작정으로 나갔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어. 급기야 나는 바둑무늬 바코드로 디자인된 간판까지 보았어. 2차원 바코드 디자인으로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였어. 버스 창에 붙은 광고는 물론이고 슈퍼마켓에서 보내온 전단지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어.

바코드
우리의 관심사는 길잃기 놀이나 숨바꼭질이었지만 바코드의 세계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없어. 바코드는 사물이나 건물 등이 지금 여기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해. 바코드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정보·시공간이 일목요연하게 눈앞에 나타나.
처음에는 사각형의 격자무늬 바코드가 꽤나 신기해 보였어. 코드 기호를 스마트폰이 읽어주는 건데도 바코드 인식기나 알던 신호를 마치 내가 읽는 것 같았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된 것 같은 기분은 물론 아주 잠깐 왔다가 가버렸어. 그렇게 질문과 답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무엇인가를 ‘찍고’ ‘스캔하는’ 게 쉬우니까 이상해.
요즘 바코드는 쉽고 정보가 풍성하다는 게 장점이래. 그런데 갑자기 바코드 디자인이 외계인의 장난스러운 복수는 아닐까 싶어. 쉽기는커녕 육안으론 아무도 읽을 수가 없잖아. 영화 에서 마법사의 실수로 시간여행을 온 프랑스 기사 고드프루아가 서울 종로 거리의 바코드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199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QR 코드는 얌전해 보이는 격자무늬지만 가만히 보면 미지의 주파수를 보내는 전자파 같아. 기껏해야 20자리 정도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던 기존의 길쭉한 바코드에 비해 야심찬 건 맞아. 숫자 7천여 개, 문자 2천 여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색깔도 흑백이 아니라 빨강·파랑·형광 멋대로 바꿀 수 있다니까.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는 평평한 바둑판일 뿐이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그걸 읽을 수 있다니 우리 뇌가 경쟁에서 진 건 분명하잖아.
공포영화 에서 본 섬뜩한 숫자 ‘666’이 생각나기도 해. 사물들만 번호와 기호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도 때때로 참 많은 번호를 매기며 살아가. 번호로 매겨지기도 하고.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적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28쪽엔 이렇게 쓰여 있어. “수감자들에게는 모두 번호가 있었고, 그들은 번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조희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박수현 비판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하룻밤 공습에 1조원…트럼프는 “전쟁 영원히” 외치지만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