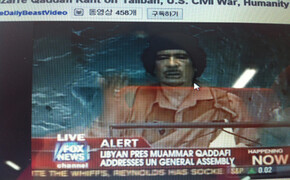신호등
기차 옆자리에 앉은 까만 피부의 할머니가 묻는다. “나 광명에서 내리는데 우리 딸이 13호차 문 앞으로 나와 있기로 했어. 나 어디로 나가면 되지?” 할머니는 객실 앞문과 뒷문 중에서 어디로 나가 있으면 될지 꼭~ 문 하나를 알려달라고 하신다. ‘아, 모르겠다.’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최근 내가 좋아한 아름다운 노래들에 닮은 점이 있단 걸 떠올려본다. 노래 가사에 ‘몰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거나 ‘모르겠네’라는 혼돈의 상태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다. 흥얼거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재밌는 건 이 ‘모르겠는’ 심정이 울적한 단조가 아닌 경쾌한 장조풍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중현과 엽전들’이 부른 에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웃으면 웃었지. 울으면 울었지. 왔으면 왔지. 갔으면 갔지. 나는 몰라. 알 게 뭐야”라고 할 때 나는 어딘가 위로받는다. 모르는 게 아직, 어쩌면 영영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무섭다.
모르는 것도 상황 나름이다. 연두색 보따리를 든 할머니는 13호차 객실 어느 방향으로 내리셨든지 간에 딸과 만날 확률 100%였을 거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이처럼 별 탈 없는 ‘잘 모르겠는’ 일만 있다면 세상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 서울 야경은 신석기시대 민무늬토기처럼 밋밋한 물결무늬가 무채색 위에 잔잔하게 드러나는 정도였을 거다. 마음껏 가고 싶은 방향대로 우리가 돌진해도 된다면, 거리에 지금처럼 수많은 신호등이 꺼졌다 커졌다 깜박이며 신호를 보낼 필요도 없을 테니 말이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바탕 논쟁을 일으킨 ‘삼색 신호등’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건 서울 광화문에서 운전자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이다. 노래방 스타일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면 ‘몰라’라는 가사에 이 삼색 신호등과 운전자들의 뚱한 표정을 넣고 싶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거나 잠시 멈추는 운전자들에게 한 달간 시범 운영한 삼색 신호등은 ‘혼돈’의 아이콘이자 정보를 ‘혼란시키는’ 그래픽이다.
1933년 디자이너 헨리 벡이 만든 런던 지하철 노선도를 출발로 교통 시스템에 적용된 정보 그래픽은 색깔과 점·선·면으로 말하는 세계다. 느낌표·물음표는 우주에 날려버리고, 마치 백남준이 한 TV 광고에서 ‘창조 창조’ 말했던 것처럼 ‘확신 확신 확신’을 알려주는 게 교통정보 그래픽의 임무이자 특성이었다. 물론 국제표준에 맞춰 삼색 신호등을 거리에 뿌린 경찰청 쪽은 “좌회전 차량은 화살표 삼색 신호등에 따라 빨강색 화살표에서는 멈추고, 초록색 화살표에서는 좌회전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삼색 신호등이 왜 좋은지 알리려고 무던히 애썼다. 그럼에도 시범 중인 삼색 신호등이 운전자들에게 헷갈림을 주는 건 빨간색과 화살표의 만남 때문이다.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과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니, 운전자들은 가야 할지(화살표) 멈춰야 할지(빨간색) ‘몰라’의 세상에 노크한다.
‘몰라’의 세계는 낯설고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통신호 체계에서 이러면 많이 곤란하다. 질주 본능을 잠재우기엔 빨간색의 효력이 힘이 많이 떨어진 걸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신호등 사탕’이 보고 싶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