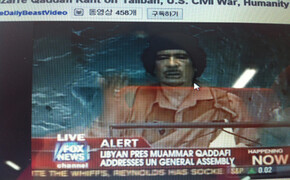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세상에 이럴 수가’ 감탄사를 절로 자아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 종이꽃을 만드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별말씀 없이도 꽃으로 이룬 자신만의 웅대한 별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카메라가 따라간 할머니의 집 곳곳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수천 개의 꽃바구니가 있었다. 모두 종이로 만든, 꽃잎 시들지 않는 조화였다. 색깔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 멋을 뽐내는 팔색조 디자인에선 생기가 넘쳤다. 안방과 거실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선반에도 종이꽃이 만발했다.

왜 꽃일까? 때마다 플래카드를 바꿔 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의 문구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 “별안간 꽃이 사고 싶다. 꽃을 안 사면 무엇을 산단 말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세종대왕 동상 너머로 불현듯 보게 된 하늘색 플래카드에서 주인공은 단연 꽃이다. 우리 집 앞 꽃집 주인도 플래카드를 보았는지 이 문구를 꽃집 앞에 적어놓았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제 몸을 새롭게 피워내는 꽃은 지지부진한 생활에 헐벗은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한다. 마치 모든 죄를 알면서도 망각하는 삼한시대의 ‘소도’처럼, 꽃 앞에서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우리는 잿빛 눈을 씻는다. 곤충학자 앙리 파브르는 에서 “꽃은 우아하고 고귀하게 자신의 겉모습을 바꾼 채 오직 단 한 가지 일- 씨앗을 만들어 퍼뜨리는 미래를 위한 일만 한다”고 적었다. “화려한 색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솔직히 말해 하나의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할 일을 마치면 떨어지거나 시들어버린다”라는 말의 뉘앙스에서는 왠지 모를 고독함과 처연함이 느껴진다.
정말 미치도록 화려한 꽃바구니를 보고 생의 활력이 아닌 죽음의 기운을 느끼는 건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뿐일까. 셰익스피어의 에 등장하는 여인 오필리아를 그린 그림에서도 그녀의 새하얀 얼굴 옆을 채우는 것은 꽃이요, 세상의 무수히 많은 미친 여자들의 머리에는 커다란 꽃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혀 있다. ‘영원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몸으로 보여주는 꽃. 스스로 단 꽃이든 누군가가 ‘헌화’한 꽃이든 꽃은 여기에서 저기로 전달되기 힘든 사람의 마음, 어제와 내일이 늘 같은 상태로 지속되기 힘든 시간의 불가항력을 보여준다.
가끔 거리에서 차에 실려가는 거대한 조화들을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가늠할 수 있다. 꽃은 흥겨운 파티뿐 아니라 죽음의 장례식장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호들갑스러운 기쁨의 대명사인가 하면, 무채색으로 슬픔을 묵직하게 대변하기도 한다. 한 여교수는 꽃다발로 때린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내던진 것이었다 항변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선사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한다. 봄 기분을 내려고 종로를 지나다 가판대에서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샀는데, 자세히 보니 꽃 위에 금가루 반짝이가 듬성듬성 뿌려져 있었다. “금가루가 있으니까 더 빛나고 좋지 않아요?” 꽃집 주인의 말처럼 꽃들은 더 봄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다. 느닷없이 찾아온 봄꽃처럼 바다 건너 슬픔에도 봄은 애써 오고 있다.
현시원 독립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추가모집 불응…“‘절윤’ 조짐 없어”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경찰 ‘1호 수사’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10분 빨랐다면 100명 살아남았을 것”…이태원 생존자의 애끓는 증언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2979610791_20260312500697.jpg)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