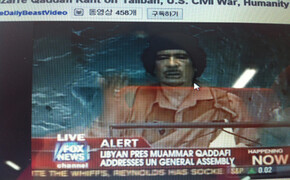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에 반응하는 디자인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 분야에서 수상한 ‘전자 무덤’(e-Tomb)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힌트를 던진다. 중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무덤은 이름하여 ‘전자 무덤’. 범용직렬버스(USB) 형태의 가상 무덤이다. 제품의 실제 제작이 아닌 반발자국 앞선 독특한 발상에 포인트를 두는 ‘콘셉트 디자인’ 분야 수상작답게 전자 무덤은 이승을 떠난 한 인물의 온라인 생활을 추도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죽음과 추모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21세기 정보사회에 박자를 맞추는 새 무덤의 설계로 이어졌다.

‘전자무덤’은 살아 있을 때 품고 다녔던 USB의 네모반듯한 형태를 닮았다. 태양열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안에는 망자가 살았을 때 남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의 글과 같은 온라인의 행적들이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로 저장된다. 휴대전화 같은 기기와 전자무덤을 접속해 무덤의 푸른 전자파가 만화처럼 지지직 작동되면 우리는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다운로드해 떠난 자를 기억할 수 있다. 온라인에 아직 남아 있는 망자의 아이디 계정을 따라 마치 순례하듯이, 떠난 자가 남긴 말과 이미지들의 폴더를 들춰본다. 좁은 땅속으로 망자를 꼭꼭 숨겨놓는 시커먼 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무덤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은 하얀 무덤이다.
동그랗거나 평평한 동서양 무덤의 형태마저 변형시키는 무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전자 무덤은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21세기 키드들의 생활방식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차가운 비석과 오래된 묘비 대신, 전자 무덤은 미래의 기억을 예견한다. 보르헤스가 소설 ‘기억의 왕 푸네스’에서 예상하듯 엄청난 기억의 자질은 어쩌면 아무것도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기야 코앞에 쥐어지는 정보의 묶음보다는 내 맘대로 엮어볼 수 있는 생생한 기억의 재구성이야말로 누군가를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 아니겠는가.
디자이너들이 상상한 전자 무덤처럼 무덤 속에 싸이월드의 다정한 말투나 트위터에서 재잘거리듯 끊임없이 쌓이는 문장들이 함께 담기면 어떨까. 그건 좀 싫다. 홈쇼핑의 상조회사 광고에서 죽음이 하얀색·까만색이 적절하게 섞인 ‘친절한 서비스’로 디자인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전자 무덤’에 담긴 망자의 콘텐츠를 바라보는 것도 친절해서 너무도 불편한 죽음에 관한 서비스다.
화가들도 죽음에 대해 상상한다. 이를테면 지옥을 형상화한 그림인 ‘지옥도’가 있다. 얼굴에 뿔이 달리고 파란 피가 흐르는 기기묘묘한 지옥도를 지칠 만큼 많이 보았지만 이런 지옥도 중에서 화가 오윤의 (1980)이 생각난다. 이 그림 속에서 지옥은 죽어서 당도하는 먼 곳이 아닌 코카콜라 같은 미국 제품이 난무하는 소비로 점철된 도시의 변화하는 순간 그 자체다. 어떤 무덤에 어떤 죽음을 담아야 하나, 무릎팍 도사도 답을 모를 질문이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한국 포함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660011987_20260313500923.jpg)
이 대통령 지지율 66% 최고 기록…민주 47% 국힘 20%, 격차 커져 [갤럽]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