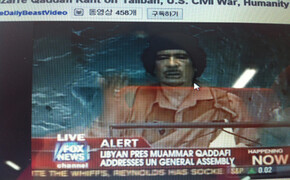피아노
갑자기 피아노를 치고 싶어질 때가 있다. 타다닥 글을 쓸 때 느껴지는 리듬감처럼 무엇인가 두드리고 싶다면 피아노만큼 좋은 기구는 없다. 부엌의 그릇을 두드릴 수도 있고, 목욕탕 대야를 뒤집어놓고 두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손가락을 뾰족하게 한 다음 피아노를 탕탕탕 움직이면 기분이 깨알처럼 즐거워진다. 기교를 부리기 위해 바쳐진 시간.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정재형이 정형돈을 위해 피아노를 치던 순간은 올여름 가장 웃기고 짜릿한 순간이었다.
피아노는 악기인 동시에 가정용 가구다. 어떤 가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선 서양식 공간의 방법론을 익히는 그런 가구였을 것이다. 머리를 흔들며 연주하는 사물놀이 악기도 아니고, 일명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곡조를 맞추는 좌식용 악기도 아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 피아노 다루는 법을 말해준다. 단조의 음악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옷과 표정으로 소녀들은 건반을 친다. 얼굴에 복숭아를 문 듯이 통통한 분홍 빛깔을 머금은 아이의 피아노 연주는 비 오는 날씨와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거실에 피아노가 놓인 ‘집’은 평화롭고 안락한 이미지의 ‘실내’가 되곤 했다. 피아노는 다정함을 드러내는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안락한 거실의 꽃이던 피아노는 이제 거리에 있다. 거리의 악사들이 들고 나와 연주하는 건 아니고, 뭐랄까 피아노는 용달 위에서 달린다. 요즘엔 피아노 구입의 90%가 중고시장에서 움직인다. 나 또한 아끼던 피아노를 몇 해 전 중고시장에 팔았다. 큰맘 먹고 거실을 지키게 했던 피아노는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에서 찬송가를 반주할 것이라는 기약 없는 단서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밧줄에 꽁꽁 매인 채 용달차 위에 실려가던 피아노의 뒷모습은 어찌나 덩치 큰 외톨이 같아 보이던지. 어른이 되면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작가 백남준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인가 보다. ‘중고 피아노 팝니다’ 간판을 볼 때마다 나의 옛 피아노를 찾아가겠노라 다짐하지만 기약뿐이다. 나의 ‘새들피아노학원’도 기억 속에 색이 바래는 중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왜 피아노학원에 다녀야 했나? 1980년대 초반생에게 피아노학원은 교양 있는 어른이 되려면 꼭 익혀야 할 생활의 태도 같은 것이었다. 바이엘 상·하와 체르니 30번을 배우려면 벌집 구조처럼 한칸 한칸이 나뉜 피아노학원 방에 들어가 미끄러지는 손가락과 싸워야 했다. 엉망진창인 실력으로 피아노를 상대하며 가끔 집에서도 나름의 연주를 펼쳤다. 비올라, 리코더, 거문고 등과 비교해 집 안 거실에 놓을 수 있는 ‘가구’이기도 했기에 가족은 피아노를 원했던 게 아닐까.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말이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 (1960)에도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는 근대화 시기 서구 교양의 상징을 연기한다. 피아노 울리는 집에서 가족은 오래된 과거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내일의 취향과 매력의 계보를 만나려 한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피아노는 엄청난 비극의 회오리가 치는 장으로 거듭난다. 사실 나도 집 안에서 평화로운 음악을 제대로 연주해본 기억은 별로 없다. 쾅쾅쾅 쳐대던 피아노는 가정의 대화를 방해하는, 평화를 위장한 새로운 배경음악(BGM)이던 것 같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