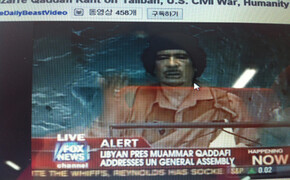현시원 제공
아이스크림은 신기루였다. 가지고 놀다가 입안에서 사라지는 장난감이었다. 1983년 출시된 미니어처 상어 모양의 ‘죠스바’가 아니었다면 상어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내 뇌 속에 남아 있진 않을 거다. 자두색 ‘스크류바’가 없었다면, 툭 잘라먹는 ‘쌍쌍바’가 없었다면 취향과 거리가 먼 희한한 형태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아이스크림의 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늘도 세상 고민을 잔뜩 짊어진 표정으로 ‘쭈쭈바’를 먹고 있는 어린이를 보았으니까. 이 여름 탄력을 잃은 것은 ‘아이스크림 냉동고’라고 나는 말하겠다. 빙과류의 반짝거리는 포장지는 요란한 모습 그대로지만 냉동고는 생기를 잃은 모습이다. 독특한 풍미와 디자인의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는 요즘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냉동고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냉동고의 문은 열쇠로 굳게 잠긴 경우가 많다. 서른한 가지 맛이 잘 배치된 냉동고는 익숙하지만 이 맛 저 맛 마구 뒤섞인 계통 없는 냉동고 안은 낯설다. 시선을 끄는 건 냉동고의 빙과류가 아니라 ‘50% 할인’이라는 문구다. 헐값에 빙과류를 판매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숨통을 트고자 하는 작은 가게들의 고육지책이라고 한다.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업체 영업소에서 판매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빙과류 전성기였던 1990년대에는 냉동고 보급률이 판매율과 직결됐던 까닭에 영업소에서는 목 좋은 슈퍼마켓에 자사 이름이 박힌 냉동고를 보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1994년 27살의 한 청년은 경쟁업체의 냉동고만 잘 보이는 데 배치한 슈퍼를 찾아가 냉동고를 부숴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참을 길 없는,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던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지금은 과거에서 날아온 까만 ‘관’처럼 슈퍼 앞을 지킨다. L제과의 한 아이스크림 보급소는 “아이스크림을 팔아주는 슈퍼에는 지금도 무상으로 냉동고를 보급한다. 개인적 용도로 쓴다? 그러면 가로 150cm, 폭 70cm의 냉동고를 중고로 30만원에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때 냉동고는 미래에서 날아온 신제품이었다. 1968년 말 냉장고의 국내 보급률은 1.5%에 머물렀고 ‘아이스박스와 얼음냉장고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법’이 신문에 소개되던 시절이었다. 1979년 화가 천경자는 에 기고한 ‘투명인간과 비행접시’라는 글에서 “눈부신 흰 냉장고의 모터 도는 소리는 금시 내게 감전될 것 같아” “무언지 인간 상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야릇한 공포”를 느꼈다고 썼다(단행본 에서 발췌). 하기야 지금도 냉동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충남 서산엔 ‘모든 얼음은 이글루’라는 이름의 아이스박스용 얼음 판매업체가 있다. 얼음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가게 이름은 무척이나 시적이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겨울에만 문을 여는 이글루 모양의 얼음 호텔이 인기를 끈다. 그런데 냉장고는 왜 하얀색 사각형 모양일까. 효용성 때문이겠지만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다듬어놓은 백색 사각형의 얼음 이미지가 한몫하는 것 같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