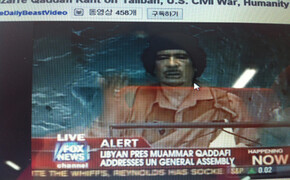현시원 제공
과일이 거리로 나오는 계절이다.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차창 밖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과일 행상이 부쩍 늘었다. 더위가 한껏 매서워지면 이제 국도와 고속도로에도 과일가게가 나타날 것이다. 폭포가 내리치는 바위 위에 앉거나 묵언 수행하는 것 외에도 내가 모르는 정신수양의 묘안이 허다하겠지만, 과일을 보며 3분 정도 명상하는 것도 꽤 괜찮은 정신 다듬기 방법이 아닐까 싶다. 자연이 낳은 과일 형태는 미완성 도형들처럼 재미나고 색상도 풍부하다. 빨간 사과부터 초록과 검정 줄무늬의 수박까지 형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과일 모양새가 가져다주는 평온함이 찾아온다. 색과 형태의 힘이다. 어딘가 이상한 별 모양의 과일이 있을 것 같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피어난다.
거리에 놓인 과일에 시선이 가는 건 과일 행상의 ‘천막’ 때문이다. 높고 낮은 빌딩들 사이에서도 과일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는 컬러풀한 천막 말이다. 과일 행상의 천막은 존재 자체가 ‘간판’이다. 어떤 글씨도 그림도 없지만 천막만으로 이곳이 과일 파는 장소임을 말한다. 글과 그림을 기반으로 한 든든한 디자인 없이도 천막은 천막이고, 그 아래에는 과일이 담겨 있다. 천막은 이동하는 가게의 공간과 보호 영역을 설정한다. 보통 2~3m 사이즈인 과일 행상 천막은 대부분 붉은색이거나 노란색이다. 아님 두 색상이 주거니 받거니 커플처럼 섞여 있다. 강렬한 원색으로 화려하게 시선을 잡아끌려는 속셈이라기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해보려는 이유다. 30년 베테랑의 한 천막 가게 사장님은 “과일 천막은 뭐니뭐니 해도 붉은색이죠. 과일을 아주 예쁘게 보이게 해주니까요”라고 빨간 천막을 권하는 까닭을 밝힌다. 과일이 맛 좋아 보인다는 뜻이다. “과일 가게 리어카가 어디로 이동하든 어디에서도 과일들이 비를 안 맞게 보호하는 튼튼한 재질”의 천막을 2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이틀 정도면 완성해낸다.
‘빨간색 천막’이 진리는 아니다. 어떤 과일을 주로 담느냐에 따라 다른 색상을 시도하는 과일 행상 주인도 만날 수 있다. 노란 참외를 파는 한 사장님은 노란 천막으로 이번 여름을 시작했다. 과일을 땡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설치한 천막이지만 이 노란색은 참외를 담은 노란 봉지와도 한통속이다. 천막에 어떤 무늬도 새기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참외의 ‘맛’을 상상하게끔 돕는다.
원색의 과일 천막은 개화기 시절 가게 간판과 닮았다. 동화적이지만 낯설지 않다. 조풍래 선생이 쓴 에 따르면 1920년대 냉면집에서는 국수를 상징하는 끈 테이프를 간판에 내다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1930년대 서울 종로2가 찻집 ‘멕시코’에서는 찻주전자를 간판에 내걸었고, 그 큰길 건너편 치과에서는 모형 잇몸을 만들어 걸었다.
노랗고 빨간 형형색색의 과일 맛을 떠올리게 하는 과일 행상 천막은 간판이 없어도 색과 형태만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척 하면 척’이다. 물론 리어카 안에 담길 과일도 과일 나름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확산으로 독일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지 1호로 대접받는 오이에 대한 뉴스에서 채소와 과일은 의심의 사물이다. 그래도 나는 천막에서 파는 과일이 참 예뻐 보인다.
독립 큐레이터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