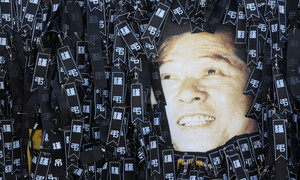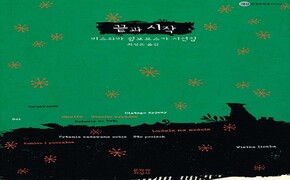초짜 평론가가 를 읽고 신경림 시인에게 드리는 편지
▣ 신형철 문학평론가
선생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첫인사를 지면으로 드려 송구합니다. ‘선생님’이라 말하고 나니 감히 제가 문학사로 걸어 들어가는 듯 무람합니다. 1956년에 등단하셨고 그동안 열 권의 시집을 내셨으니 실로 선생님은 현대시의 역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아직 철들 날이 아득한 철부지라 인사를 드리는 일조차 용기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 경박한 펜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출간하신 를 읽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쉬움에 대해 먼저 말하겠습니다. 표제작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에서 선생님은 이번 생을 차분히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시집 끝에 실려 있는 산문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제가 읽고 싶었던 것은 원로시인의 회고와 정리가 아니라 현역 시인의 포부와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은 곳곳에서 그 무언가를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괴벽인지 모르나 시인의 반성에 흔들려본 적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반성은 서정의 버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인들은 혹시 가벼운 죄를 반성하면서 진정 무거운 죄는 영영 봉인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합니다. 제가 읽고 싶었던 것은 선생님의 반성이 아니라 호된 꾸지람이었기에 또한 서운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감상이 수습돼 있는 시들도 유심히 읽었습니다. 건방진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바느질 자국을 찾기 어려운 대가(大家)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시들에서도 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세계화의 아픈 현장을 노래한 시들은 선과 악이 자명하여 긴장이 없었고, 타국의 사람들은 물 흐르듯 1인칭의 내면으로 흡수되고 있어 실감으로 육박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괴벽인지 모르나 저는 시인의 여행에 예민하게 구는 편입니다. 저는 가끔 여행이란 서정의 알리바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3부의 시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개미떼를 짓밟으며 노는 장면을 보고 쓰신 시의 후반부가 이러합니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개미가 되어 거대한 존재한테 짓이겨지는./ 내가 사는 도시가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큰 건물들이 종이집처럼 맥없이 주저앉는./ 나와 내 이웃들이 흔들리는 골목을 고래의 뱃속에서처럼 서로 부딪치고 박치기를 하며 우왕좌왕하는./ 우리가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의 존재와도 우리의 생각과도 우리의 증오와도 우리의 사랑과도 그 밖의 우리의 아무것과도 상관이 없는 그 거대한 존재를 향해, 오오 주여, 용서하소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천년을 만년을 그렇게 울부짖기만 하는.//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 때문에 용서하는지도 모르면서.”(‘용서’에서)
이 시에 휘청했습니다. 이런 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70, 80년대를 혼신으로 감당해오신 우리 시대의 어른들께서 왜 신과 대화하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유물론이 왜 형이상학으로 깊어지지 않는지, 변혁론이 왜 구원에 대한 사유로 급진화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가, 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세계의 현재를 합리화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그것과 투쟁하는 형이상학입니다. 천지만물에 범재하는 자비의 신을 ‘느끼는’ 시가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방관하는 신과 ‘싸우는’ 시를 기다렸습니다. ‘신적인 것’과 대결하면서 ‘시적인 것’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용한 시에서 그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인들은 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과 대화하기보다는 신을 모독하려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신과의 대화는 우리 시대 큰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참혹에 눈물을 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엉망인 세계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때 ‘투쟁하는 형이상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준엄하게 신을 기소(起訴)하는 법정에 한국시는 거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다음 작업을 떨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경외하는 이가 실은 더 끈질긴 법이니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내란 재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YS 아들’ 김현철 “수구 변질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
![‘부동산 오적’ 오늘도 억까중, 이재명 말한 ‘마귀’ 실체는? [논썰] ‘부동산 오적’ 오늘도 억까중, 이재명 말한 ‘마귀’ 실체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7/53_17704220098585_20260206503103.jpg)
‘부동산 오적’ 오늘도 억까중, 이재명 말한 ‘마귀’ 실체는? [논썰]

용접 입사 첫주…현관에서 곯아떨어졌다

패션 도시와 산과 눈 어우러진 겨울올림픽 개막…한국, 차준환 앞세워 22번째 입장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6/53_17703287145844_20260205504340.jpg)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후폭풍

‘타짜’ 장동혁의 승부수 통했나…“직 걸라”에 쏙 들어간 사퇴 요구

이하상, 구금되고도 못 끊는 아무말 “이진관은 내란범…식사거부 투쟁”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