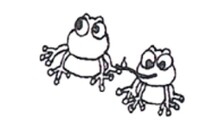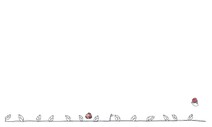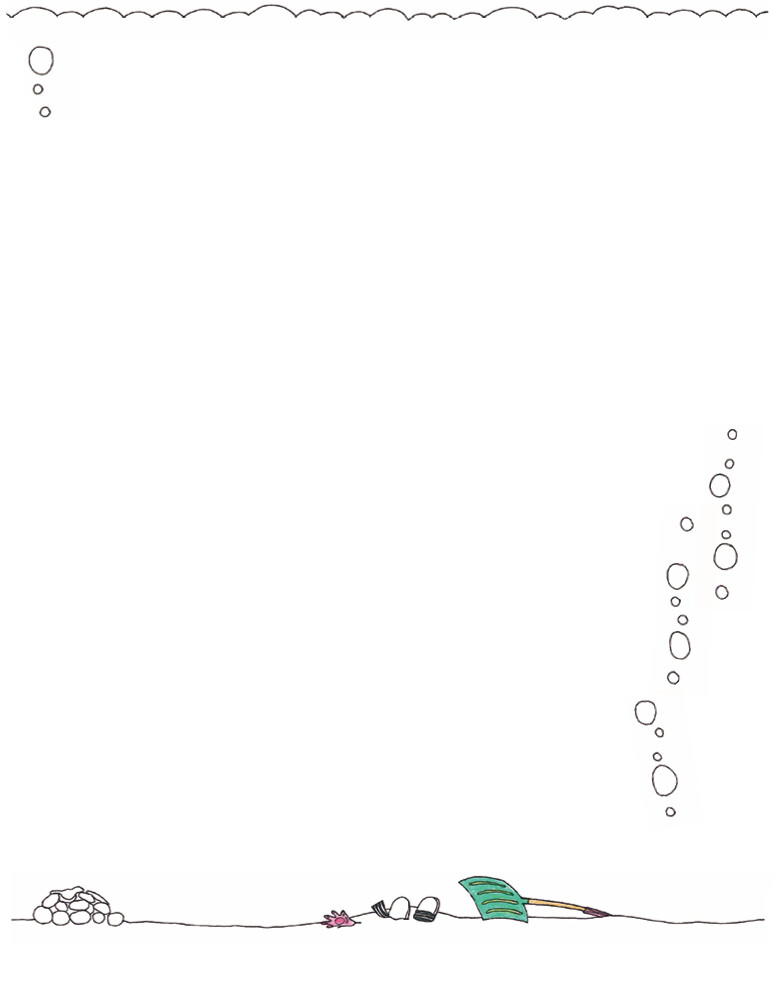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지난 3월27일에는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외할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부터 자주 다녀 익숙한 방에 누워 불을 껐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도시에 있는 우리 집은 밤중에 불을 꺼도 바깥에서 아직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가까이 있어 완전히 어둡지 않다. 처음에는 깜깜한 듯해도 조금만 있으면 어둠이 눈에 익어서 침대와 옷장의 윤곽은 물론 옆에 앉은 사람의 표정까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둠을 모르고 자랐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외갓집에서 잘 때의 밤은 다르다. 아주 약한 빛이 훨씬 멀리 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까지 한참 걸리고 적응하고 나서도 대강의 형태만 보일 뿐 이다.
빛이 차단됐다고 생각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어둠은 오히려 깊고 긴 사색을 몰고 오는 것 같다. 아무것도 식별되지 않는 어둠 속에, 그간 내가 얼마나 시각 정보를 맹신했는지 생각한다. 손을 쭉 뻗으면 오른쪽에 차갑고 단단한 나무 벽이, 왼쪽에는 엄마가 길게 누워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누웠는데도 어쩐지 손을 뻗을 때 주저하게 된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이 싫다. 그 차갑고 축축한 고요가 싫은 것은 아니다. 친절한 어둠이 내려앉아 사위가 조용해지는 것은 오히려 반갑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빛과 눈에 의지했는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힌다. 그렇다면 하얀 어둠은 어떨까?
이전에 병원에 갔을 때 안압이 너무 올라가서, 안압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한 달 안에 시신경이 모두 죽어 눈이 멀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나는 눈이 먼 나를 생각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그것의 전제로 내가 사랑하는, 지금 보이는 세계를 잃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 그때를 상상하려고 애썼다.
2주쯤 전 서점에 갔다. 문구류를 진열해놓은 곳과 도서를 진열해놓은 곳의 밝기가 약간 달랐다. 문구류가 진열된 곳이 조금 더 밝았다. 책이 꽂힌 서가 사이로 가면 괜찮은데 인형과 편지지와 필통이 즐비한 곳으로 가면 시야가 불편했다. 어떻게 형언해도 정확하지 않을 듯한 거슬림이었다. 눈앞이 반짝거린다고 해야 하나, 뿌옇게 보인다고 해야 하나, 글씨가 보였다가 다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할 겸 다시 안과를 찾았다. 백내장 초기라고 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했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 그랬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마음의 아주아주 구석진 부분이 비틀리듯 죄어드는 기분. 나는 이 감정을 알았다. 이건 ‘두려움’이었다. 내가 졸아드는 듯한 이 느낌. 나는 겁먹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통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이미 이 고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실례이고 상처일까봐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받아들임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두려운 와중에도 다시 상상한다. 어떻게 생활할지, 수술하게 될지 안 해도 될지. 그리고 그때 보일 세상은 어떨지. 하얗게 눈이 멀어서 백내장이라고 했다. 눈이 하얗게 멀면 흰 눈이 쌓인 것 같을까? 어쩌면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름다울 것이라고 상상해도 될까? 불편하더라도 그 틈새에서 내가 볼 것이 있을 거다.
신채윤 고2 학생
*‘노랑클로버’는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10분 빨랐다면 100명 살아남았을 것”…이태원 생존자의 애끓는 증언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2979610791_20260312500697.jpg)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김어준, 경찰에 고발돼…“정성호 법무 명예훼손”

장동혁 “지방선거 전 징계 논의 중단”…오세훈 인적 쇄신 요구는 외면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이란, 종전 조건으로 ‘불가침 조약·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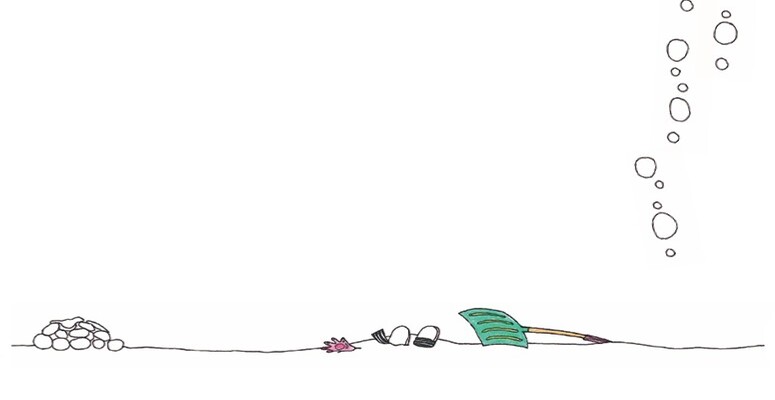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