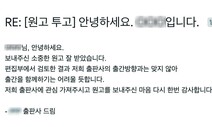알라딘 제공
2014년 10월 첫째주, 온라인서점 알라딘의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자리했다. 이 책은 같은 시기 예스24에서도 4위에 올랐으니 눈에 띄는 결과는 아니다. 그렇다면 21위에 오른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나 23위 <장서의 괴로움>, 26위 프란츠 카프카의 <꿈>은 어떤가. 같은 시기 다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 책들의 공통점은 바로 ‘알라딘 굿즈’다.
이전부터 이런저런 책 관련 혹은 책 요소를 활용한 굿즈를 꾸준히 만들었고 직전에도 ‘책에 허용된 또 다른 쓰임’이라며 책 표지를 담아 냄비받침을 선보였으니, 앞선 책들의 표지를 담은 ‘책베개’의 등장은 예상된 일이었다. 다만 굿즈가 화제를 모으며 책베개에 표지가 담긴 책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은 예상 밖, 기대 이상의 상황이었다.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서점의 굿즈가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던 장면이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알라딘에서는 “책을 샀더니 굿즈가 왔다”, 아니 “굿즈를 샀더니 책이 왔다”를 홍보 문구로 사용한다(매번 쓰면서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헷갈려 잘못 쓰곤 한다). 매월 1일 선보이던 새 굿즈는 한 달에 두 번을 거쳐 매주 한 번으로 바뀌었다. 봄이면 피크닉 매트, 여름이면 선풍기, 가을이면 담요, 겨울이면 보온병을 전하며 일상과 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굿즈. 서점에서 왜 이런 물건을 만드는지에 더해 아직도 더 만들 게 남아 있을까, 라는 물음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베스트셀러가 예상되는 책의 경우 같은 책이지만 서점별로 다른 굿즈를 선보여 독자의 손길을 망설이게 한다. 출간 초기 굿즈를 안 줄 때 책을 샀던 독자에게 실망을 전하며, 무엇보다 매해 반복되는 머그컵이나 북엔드(세워둔 책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물건)는 뜯지 않은 상자째 쌓여가 인생무상의 성찰로 이끌기도 한다. 도대체 굿즈가 무언이관데.
그렇다. 도대체 굿즈가 뭐라고. 한동안 출판사와 서점 사이에서 푸념 섞인 자조로 떠돌던 물음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굿즈는 도서 홍보의 일상이 되었다. 책 읽을 때도 재미난 이미지나 흥미로운 대목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앞서 이 부분을 재료로 어떤 굿즈를 만들지를 떠올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불필요한 물건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기후위기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인류의 사명은 친환경 소재를 이유로 잊히기 일쑤다(굿즈 생산 총량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다).
그렇게(?) 굿즈가 사라진다 해도 잊지 못할 기억이 여럿이다. 태양계 행성을 마그넷(자석)으로 만든 굿즈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 해서 추가 제작해 납품했고, 한때 여름마다 화제를 모은 삼성경제연구소(SERI) 발표 ‘CEO가 휴가철에 읽을 책’에 대응해 구성한 ‘Sorry CEO 추천도서’ 굿즈로 만든 노동자 키링(열쇠 보관 고리)은 민주노총에서 신입 노조원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며 제작을 문의했다. (“회사가 도발하면 노동자는 단결이다”와 “회사가 불법이면 노동자는 투쟁이다”를 앞뒤로 새긴 키링은 지금도 내 가방 속에 있다.) 굿즈는 책보다 앞에 올 수 없으며 여전히 “굿즈는 거들 뿐”이라 믿지만, 어쩐지 굿즈가 책의 세계를 넓혀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물론 어떤 굿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일이겠다.
박태근 인터넷서점 알라딘 도서팀장
*‘책의 일-인터넷서점’ 편에서는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 연구원이자 인터넷서점 엠디(MD)인 박태근씨가 네 편의 글을 보냅니다.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보복 나서는 이란 “미 항모 4발 타격”…미국 “미사일 근접 못해”

국힘, 필리버스터 백기투항…TK여론 악화로 행정통합법 처리 ‘다급’

하메네이 참석 회의 첩보 입수…거처 등에 ‘폭탄 30발’ 투하

이란 최소 200명 사망…CNN “보복으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하메네이 전권 위임받은 라리자니 “미국, 후회하게 만들겠다”

말에 ‘뼈’ 있는 홍준표…배현진 겨냥 “송파 분탕치는 정치인 정리해야”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391952718_511772339139994.jpg)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장동혁, 윤석열 껴안더니 부정선거 음모론까지”…개혁신당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