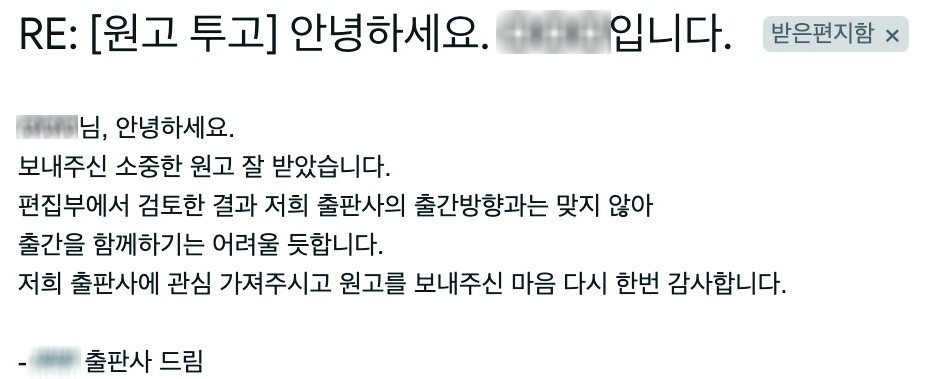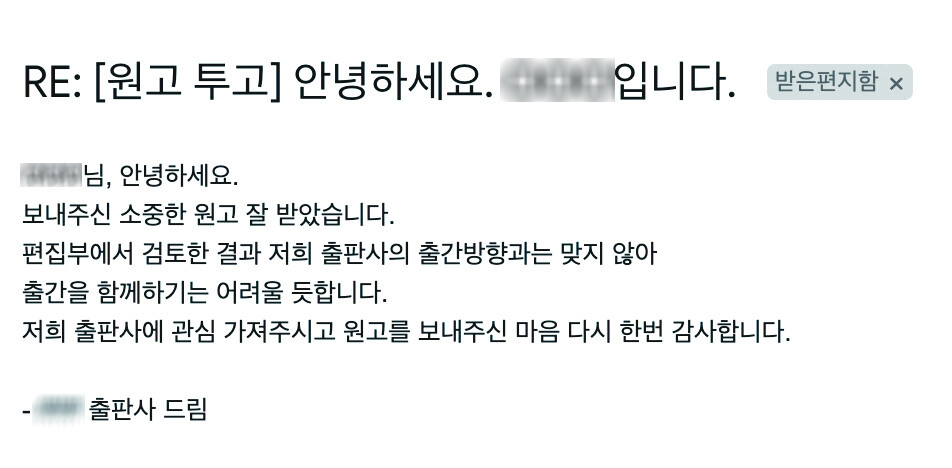
출판 편집자가 원고 투고자에게 보낸 전자우편 답신.
“무슨 일을 하세요?(팀)/ 출판사에서 원고 보는 일을 해요.(메리)/ 말도 안 돼! 돈을 받으며 책을 읽는 거예요?!(팀)/ 네, 맞아요. 원고를 읽는 게 직업이죠.(메리)/ 정말 멋지네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숨 쉬는 일을 해요. 돈 받고 숨을 쉽니다.’(팀)”(영화 <어바웃타임>)
두 사람은 첫 데이트에서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리는 투고를 검토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팀은 숨만 쉬고도 돈을 버는 멋진 직업을 어떻게 구했냐며 지독한 유머를 쏟아낸다. 스크린으로 손을 뻗어 팀의 멱살을 잡을 뻔했다. 어이, 말씀이 좀 심하시네. 원고를 읽는 게 ‘일’이 되면 ‘일’이라고.
원고를 읽는 게 일인 편집자의 메일함에는 매일 아침 원고가 도착해 있다. 읽어야 할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진행하는 책의 원고와 투고. 출판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투고가 메일함을 채운다. 대부분 생애 첫 책을 출간하려는 예비작가의 것이다.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인 <소설> 속 주인공도 매일 아침 ‘누군가의 꿈을 담은’ 투고와 마주한다. 우편으로 투고를 받는 이 출판사에는 엄청난 양의 원고가 쌓이는데 선택되지 못한 원고는 반송되거나 매일 밤 지하실의 수거함에 비워진다. 소설 속 편집자 말에 따르면 900편의 투고 중 단 한 편만 책으로 발간되는 게 일반적인 통계라고. 나는 어땠나 가늠해보니 19년 차인 현재까지 두 건쯤인 듯하다. 왜 이렇게 소설에서도, 현실에서도 투고가 출간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걸까?
출간 결정을 위해선 여러 기준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고의 역량, 상업적 가치는 기본. 담당 편집자와 출판사의 출간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출간할 종수가 유한한 편집자와 출판사의 일정과도 맞아야 하며 출판사가 준비 중인 타이틀과 겹치면 안 된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안타깝게도 투고 중에는 출판하기에 부족한 원고가 많은 편이다. 글쓴이에게는 분명 특별한 글이지만, 상업출판 기준에서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편집자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눈에 띄는 원고를 만날 확률이 경험상 적었던 투고 검토는 과외 업무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담당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려면 고유의 특별함이 잘 드러나는 원고와 기획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길게 이유를 열거한 것은, 이 과정이 원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출간’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니 부디 투고 뒤 반려 메일을 받고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획과 원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시기, 인연, 운 모든 게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투고로 책은 계속 출간되고,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 해도 편집자들은 매번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메일함을 확인한다. <소설> 속 편집자처럼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를 다이아몬드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확실한 것은 편집자와 출판사는 늘 새로운 이야기와 작가를 찾는다는 사실. 그러니 예비작가님들, 계속 써주세요.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 다이아몬드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름대로 소중한 원고를 (…) 보낸 모든 무명의 작가들에게 정당한 출판의 기회를 주겠다고 맹세한 나는 멋진 원고를 발견하리라는 기대 속에 책상 오른쪽 바닥에 있는 상자에서 한 꾸러미씩 들어올렸다.”(제임스 미치너, <소설>)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소개합니다. 직업군별로 4회분 원고를 보냅니다. 3주 간격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